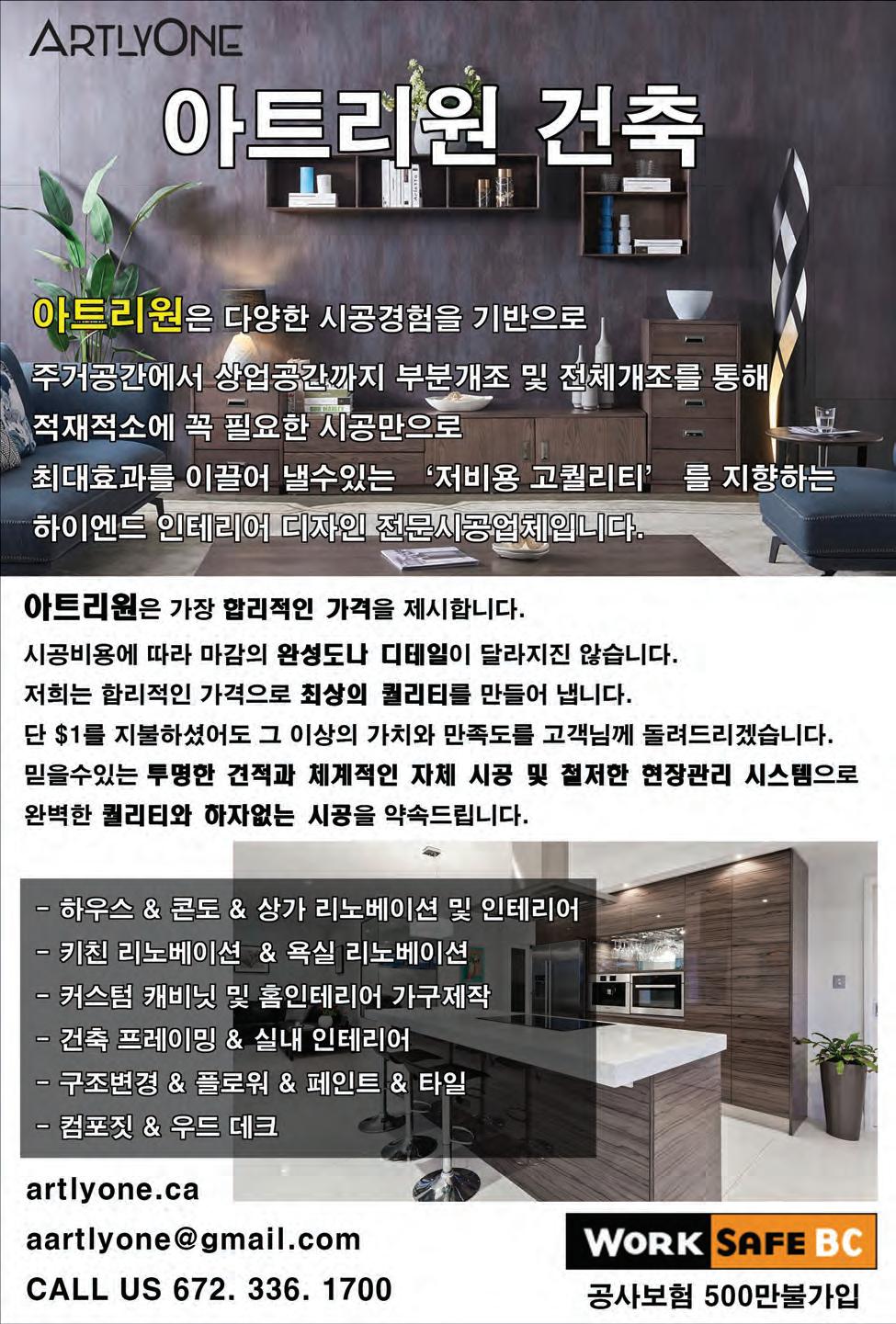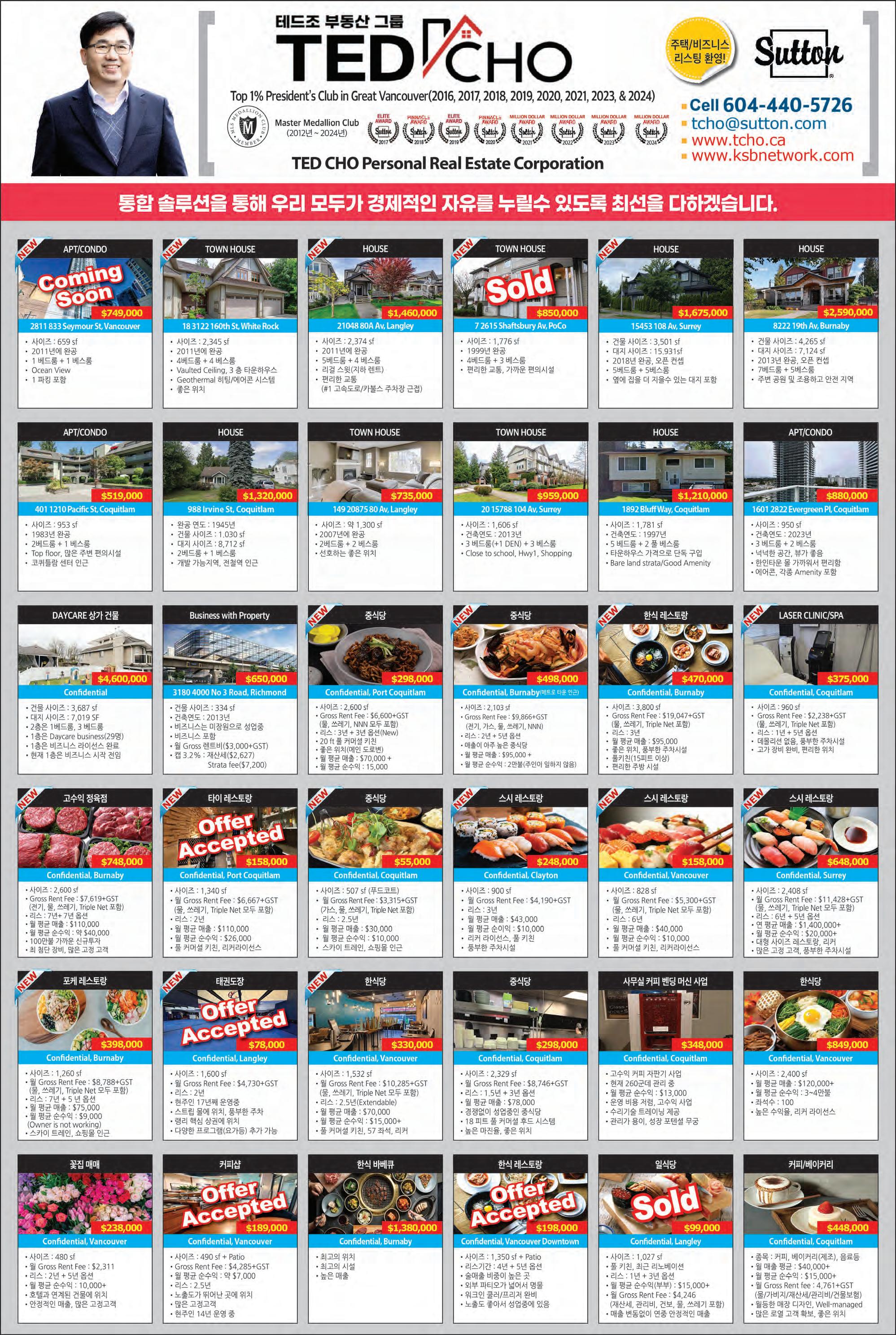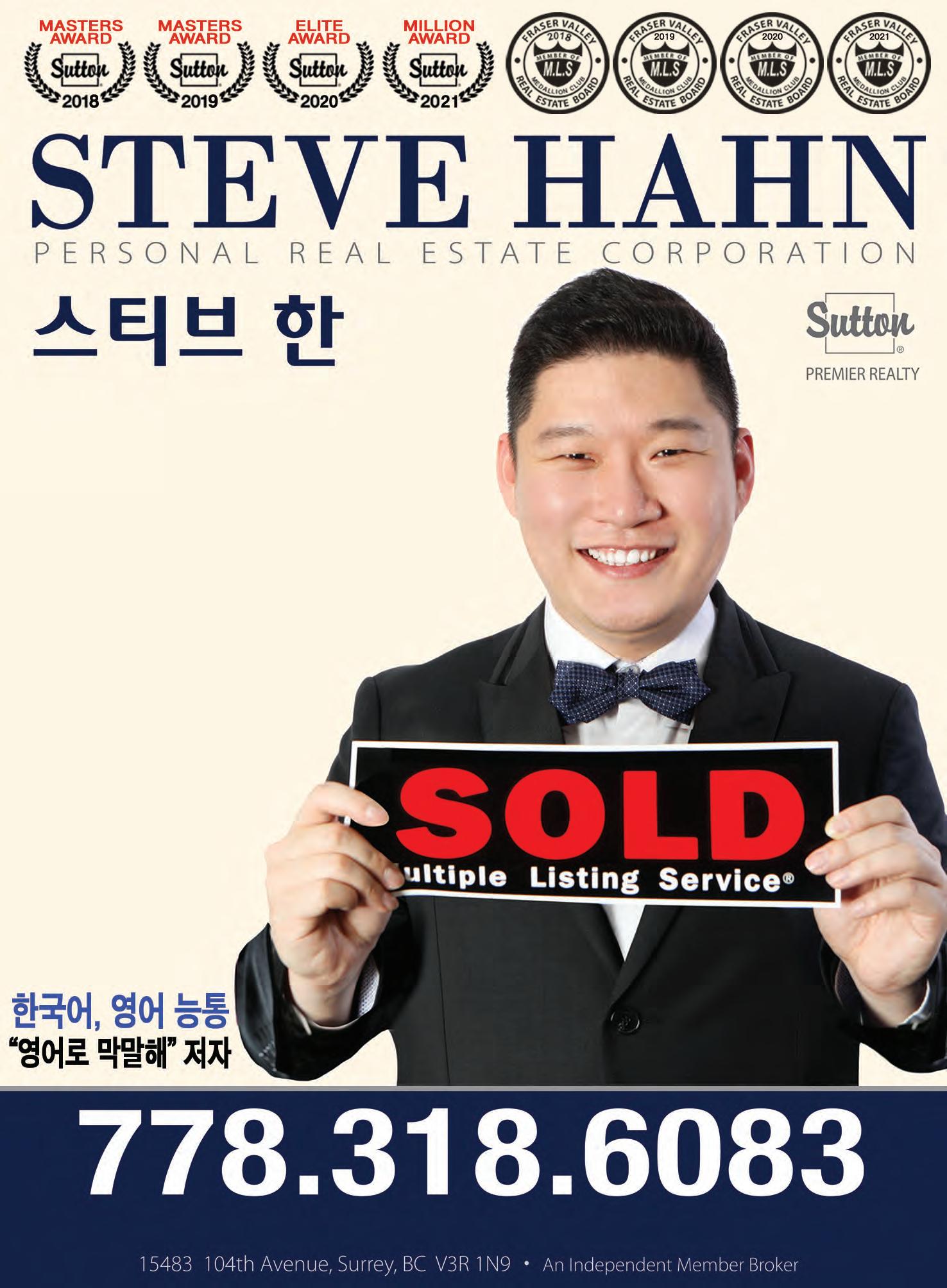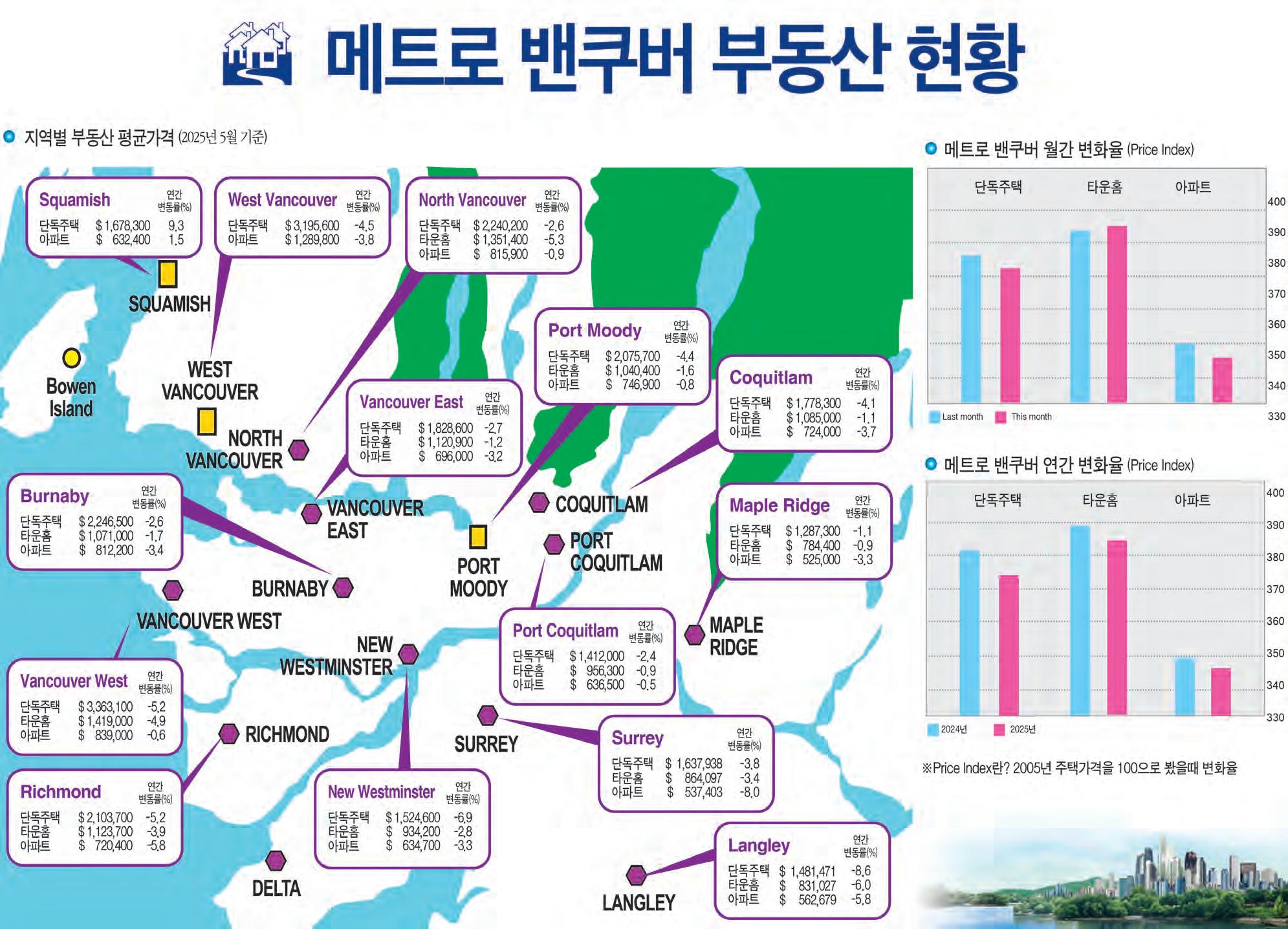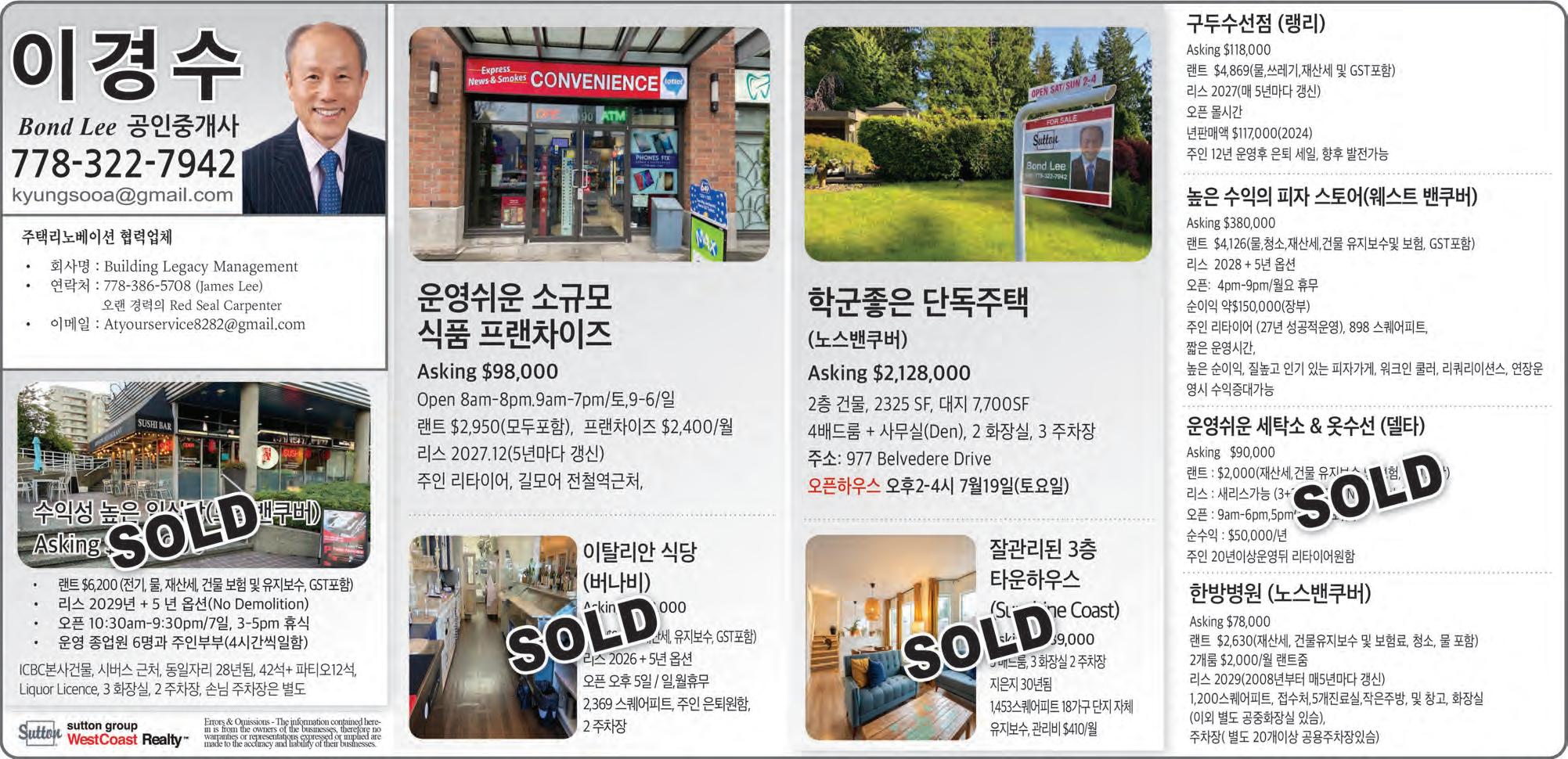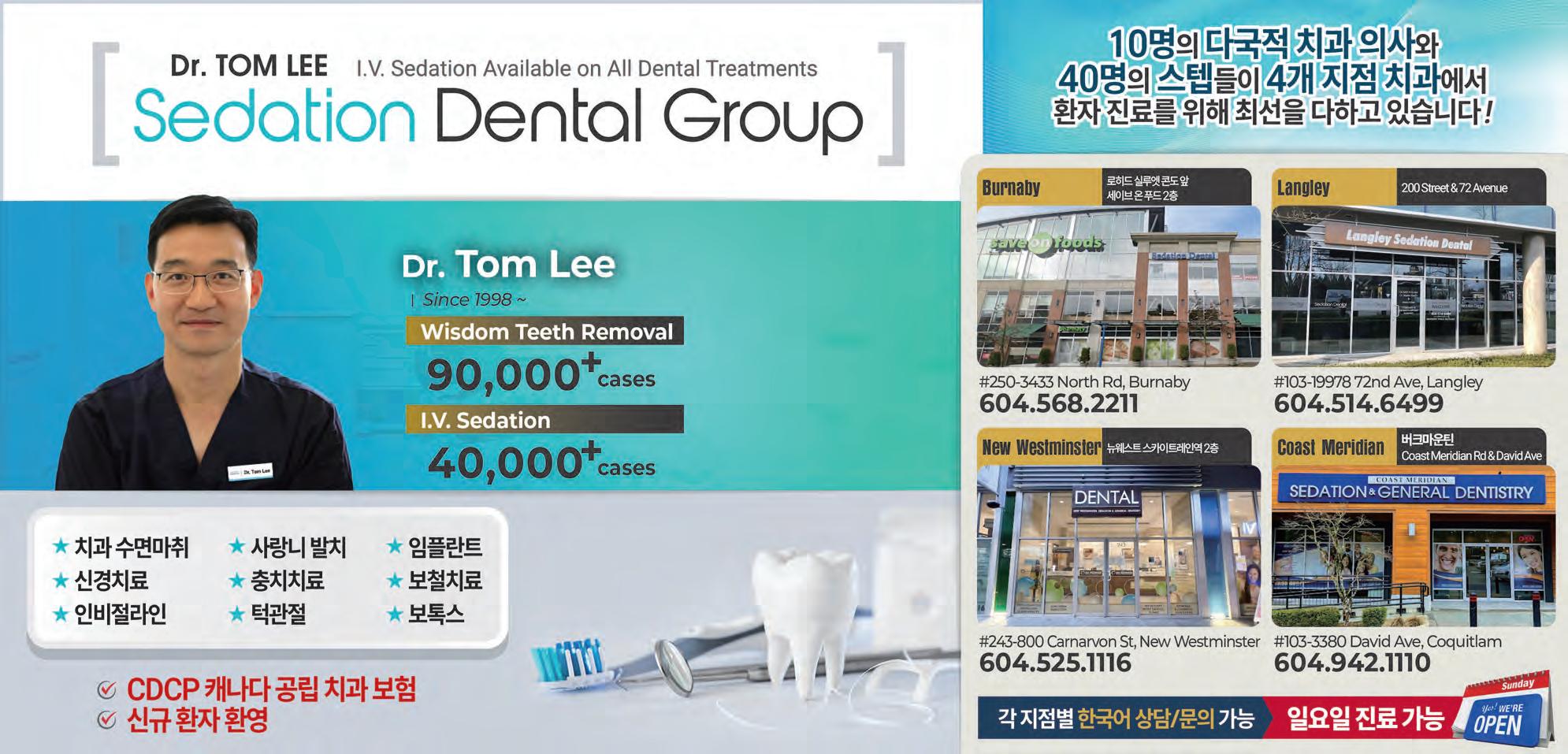



여행은 언제나 기대와 설렘, 낯섦과 불
안이 함께하는 여정이다. 페루의 쿠스코
에서 한국에서 오는 일행을 만나기 위해
하루 먼저 출발한 나는, 여유롭게 호텔에
체크인하고 시내를 둘러보며 그들을 기다
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여행은 종종 아무
런 예고 없이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다.
밴쿠버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지연되며
계획은 엇나가기 시작했다. 로스앤젤레스
에서 리마로 가는 연결편을 놓칠 위기에,
탑승 안내 직원은 일정을 변경해 주며 LA
에서 하룻밤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그리
고 수화물은 LA에서 찾아 다시 부치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LA 수화물 창구에서 아
무리 기다려도 짐은 나오지 않았다. 한 직
원은 그것이 이미 리마행 LATAM 항공편
으로 넘어갔다며 제3터미널로 가보라 했
다. 그러나 그날의 LATAM 항공편은 이
미 모두 떠난 뒤였고, 체크인 창구도 텅 비 어 있었다. 돌아간 제자리에도 사람은 없
었다. 결국 다음 날 아침에서야 짐을 찾을 수 있었다. 다시 리마를 거쳐 쿠스코로 향
하는 길. 이번엔 매니저에게 간곡히 부탁
했다. 짐이 쿠스코까지 가도록 해달라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하지만 쿠스코 공
항의 컨베이어 벨트는 나의 짐을 끝내 내
놓지 않았다.
영어를 못하는 공항 직원과 번역기를
통해 간신히 대화했다. 전화로 여기저기
확인하던 그는 결국 말했다. “가방은 리마
에 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웃음조차 나
오지 않았다. 짐은 숙소로 보내 달라고 요
청하고, 공항을 나섰다. 새벽 1시. 공항 앞
풍경은 고요함과 불안이 뒤섞인 기묘한 분위기였다. 그 많던 사람도, 택시도 보이
지 않았고 조명은 사물의 윤곽만 겨우 드
러낼 정도였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도시, 공항 외부에선 와이파이도 닿지 않
아 번역기마저 무용지물이었다. 공항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택시
를 타야 한다는 말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몇 번이고 손짓발짓을 반복했다. 다
행히 그는 상황을 이해했고, 마침내 택시 를 불러주었으며 공항 출입 철문을 열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공항 밖에 도착한 택시는 목적지까지
15달러를 요구했다. 나중에 보니 그 요금
은 통상 요금의 세 배였다. 호텔 앞에 도착 해 벨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때 택시 기사가 차에서 내려 함께 벨을
눌러주고 문을 두드려 주었다. 그 순간, 지
나가던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공항 직원이며 호텔을 구하러 왔다고 했 다. 그의 휴대전화로 호텔에 전화를 걸었 고, 호텔 문이 열렸다. 호텔은 유럽의 집
단주택처럼 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 출
입문을 닫으면 외부의 소리는 거의 들리 지 않았다. 호텔직원이 방이
흔들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광장은 대낮처럼 밝고 경찰들이 있었지 만, 골목길은 어둡고 사람의 그림자만 아
득했다. 그 순간에는 무섭지 않았지만, 나 중에 생각해 보니 아찔했다. 낯선 땅, 낯 선 언어, 고요한 새벽. 호텔은 닫혀 있었고, 공항 직원이라던 남자의 정체도 의심스러 웠다. 진짜 공항 직원이었다면 새벽에 방 을 찾아 헤맬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 택시 기사가 나를 홀로 두고 떠났다면,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지 알 수 없다. 그는 바가지요금을 받았지만, 내게는 안전을 지켜준 ‘작은 불빛’이었다. 그날 밤, 내가 지급한 것은 단순한 교통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낯선 이의 책임감 이자 배려였다. 언어보다 깊고, 돈보다 값 진 것이었다. 나는 이방의 도시에서, 바가 지를 쓴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지켜준 한 사람을 만났다.

고흐의 독백처럼 별이 흐르고 있는 로키의 밤하늘을 보았네 거친 질감
격렬한 소용돌이로 적셔내는 붓 놀림
수십년 타향살이 섞으면 섞을수록
명도가 낮아지고 뚜렷한 색채 없이 황량한 빈 들판위에 서있는 저 무한 감
고흐의 고독처럼 치열함이 없었다면 선 굵은 기하학적 구름과 갈필법도
한 고뇌 짙은 파란색 밤 하늘도 없었네
감정이 굽이치는 곡선의 격한 율동 별과 사이프러스 나무와 밀밭까지 소통은 복잡한 군상 자연까지 어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