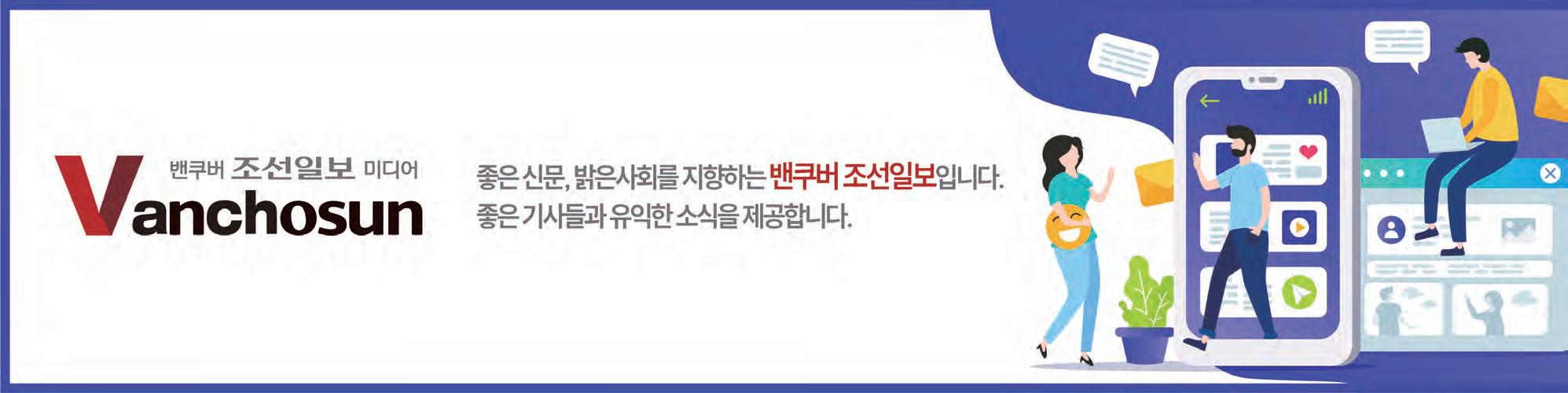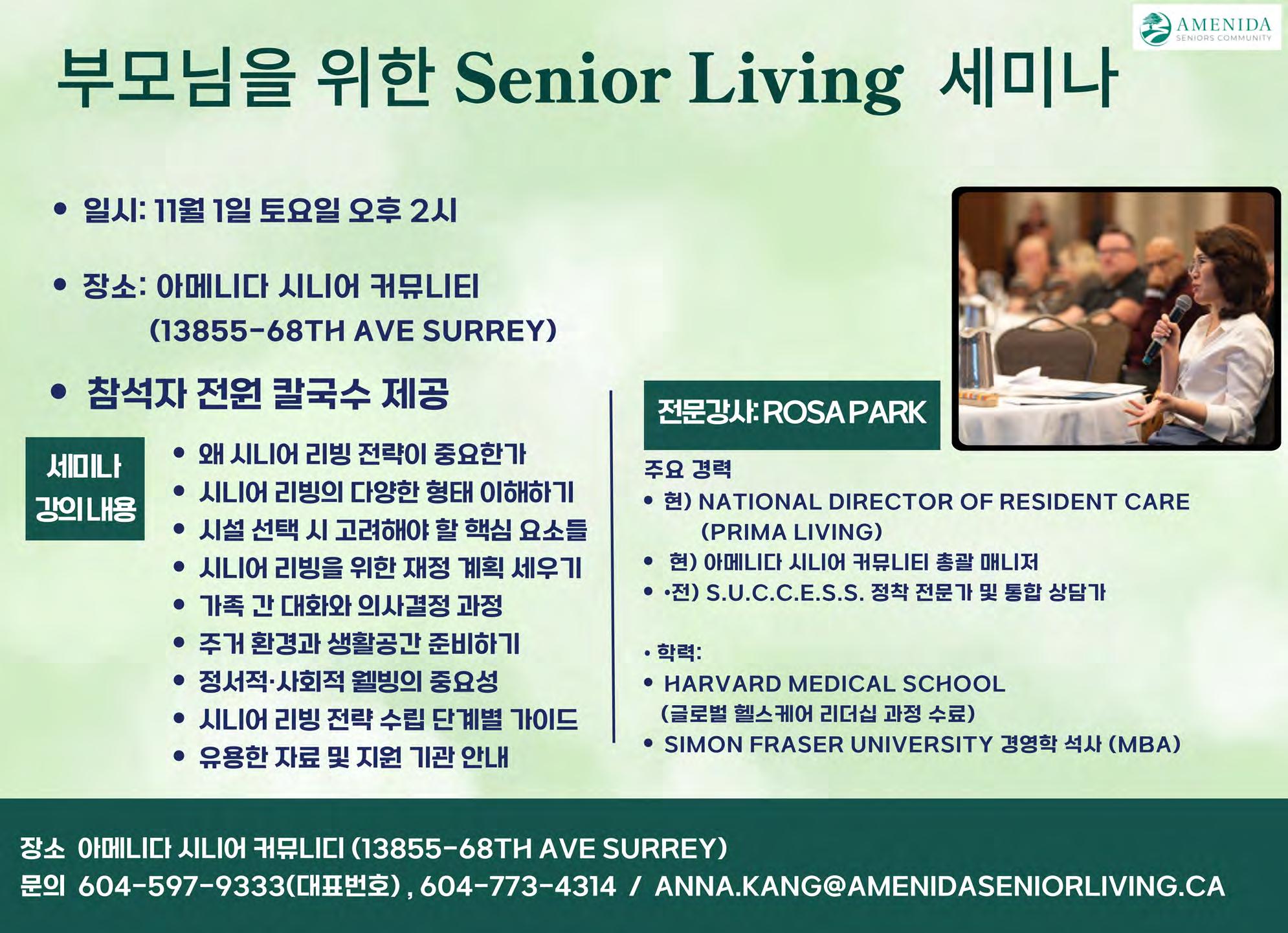정류장

가을빛 향연에 이끌려 길을 나선다. 마
지막 열정을 불태우는 단풍나무 숲을 지
나 산책길 끝의 공원묘지로 향한다. 캐나
다의 공원묘지는 삶의 한 가운데 자리하
고 있음에도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
진다. 아마도 나뭇가지 사이로 드리운 햇
살과 잘 가꿔진 잔디와 꽃들 사이를 거닐
며, 죽음 또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깨달음
이 자연스레 스며들기 때문일 것이다.
‘툭’ 하고 단풍잎 하나가 어깨 위로 떨
어진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
를 몸으로 말하려는가. 주검은 땅속에서
잠들고 그 위에 초록빛 생명들이 살아 숨 쉰다. 그들이 세상에 다녀간 흔적은 동판
위에 새겨져 있다. 이름 석자와 생애의 햇
수. 그들 역시 먼 바다를 건너온 이들이었
을까.
부모님의 산소를 미국으로 옮기자고 했
다. 미국에 사는 조카의 제안이었다. 가족
납골당을 마련해 후손들이 쉽게 찾아 뵙
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었다. 경
비와 수고는 자신이 맡겠다며 동의만 해
달라고 했다. 조부모를 생각하는 조카의
효심이 고맙고도 감동스러웠다. 어릴 적
엄마 없이 조부모님 손에서 자란 터에, 할
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아이다. 다섯 오빠 중 세 분은 이미 미국
에 묻혔고, 남은 오빠들도 사후를 대비해
야 할 때가 되었으니 그 제안이 무리는 아
니었다. 하지만 지금 편히 계시는 부모님
을 굳이 바다 건너까지 모셔야 할지. 두 오
빠도, 나 역시도 선뜻 마음이 동하지 않았
다. 이제 조카도, 나도 나이가 들었고, 부모
님을 기억하는 이 또한 많지 않다. 묘지는
죽은 이의 집이기도 하지만, 산 이를 위한
기억의 집이 아닐까.
용인 산 중턱에 자리한 부모님의 묘소
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친히 고른 장소였
다.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오래
도록 누워 계실 때, 아버지는 나를 앞세워
산을 오르며 묫자리를 보았다. 엄마를 묻
고 그곳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
전망이 좋구나 하시던 아버지의 쓸쓸한
미소가 아직 눈에 선하다. 부모님의 묘소
는 나에게 남겨진 유산의 실체였다. 명절
뿐 아니라 마음이 허하거나 부모님 생각
이 날 때면 고향같이 찾아가곤 했다. 청주
한 잔 음복하고 북어를 뜯으며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던 그날, 가슴 속에 고이던
막연한 슬픔의 정체를 들여다보곤 했다.
슬픔의 감정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한꺼
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가랑비처
럼 조금씩 몸을 적시며 그리움으로 스며
들었다. 그곳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새
록새록 돋아나는 그리움의 뭉치를 풀어놓
는 위무의 장소였다.
이민 온 후부터는 자주 갈 수 없었기에
문득문득 그곳에 남겨진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저렸다. 그러나 나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에 언제 어느 곳에 있어도 마음과
생각은 늘 그곳에 가 닿았다. 아이들이 커
서 독립하면 고국에 돌아가 노후를 보내
고, 내가 태어난 땅에 묻히고 싶다는 바람
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이국에 남겨 둔 채 돌아간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
라는 막연한 예감이 마음을 눌렀다. 부모
가 자식의 고향이라면 자식도 부모의 의
지처가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에게 위안
과 안식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뿌리가 되 기로 했다. 토론토에 묘지를 마련했다. 아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나 정신적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함이었다. 그때만 해도 토론토를
떠나 타 주로 이사하게 되리라곤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딸아이는 시애틀로 떠났
고 아들아이는 밴쿠버에 정착했다. 아들
은 조만간 미국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했
다. 돌이켜보니 이민을 온 것도, 이십여 년 간 살았던 토론토를 떠나 밴쿠버에 온 것
내 의지보다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더 컸다. 내가 살아온 길이 내가 선 택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선택의 여지 가 없었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차선의 방 법일 때가 더 많았다. 흐르는 물의 줄기를 내 뜻대로

임현숙 사)한국문협 밴쿠버지부 회원
본다
오래된 햇살 같은 이름 하나 젖은 이불 깃에 스며든 바람의 온도 창밖의 어둠 속으로 사람들은 하나둘 그림자를 거두고 나는 묵묵히 남은 모래알을 세고 있다
것이 더
일이 아닐까. 죽음이란 우리가 생 각하는 끝이 아니라, 기억
살
또 다른 형태의 삶일지도 모른다. 누군가 놓고 간 국화 한 다발에서 노란 그리움이 피어오른다. 남아 있는 이의 기 억과 그리움 속에 있다면 그들은 아직 세 상에 존재하는 것이리라. 바쁠 일 하나 없
다는 듯 거위들이 느릿느릿 걸어간다. 나 역시 상념을 털어내고 단풍잎 쌓인 길로 발걸음을 옮긴다.
어쩌면 이 기다림은 빛 한 줄기 되어 고향집으로 되돌아가는 것
버스 문이 열릴 때마다 혼불 하나 닳고 닳은 문지방을 넘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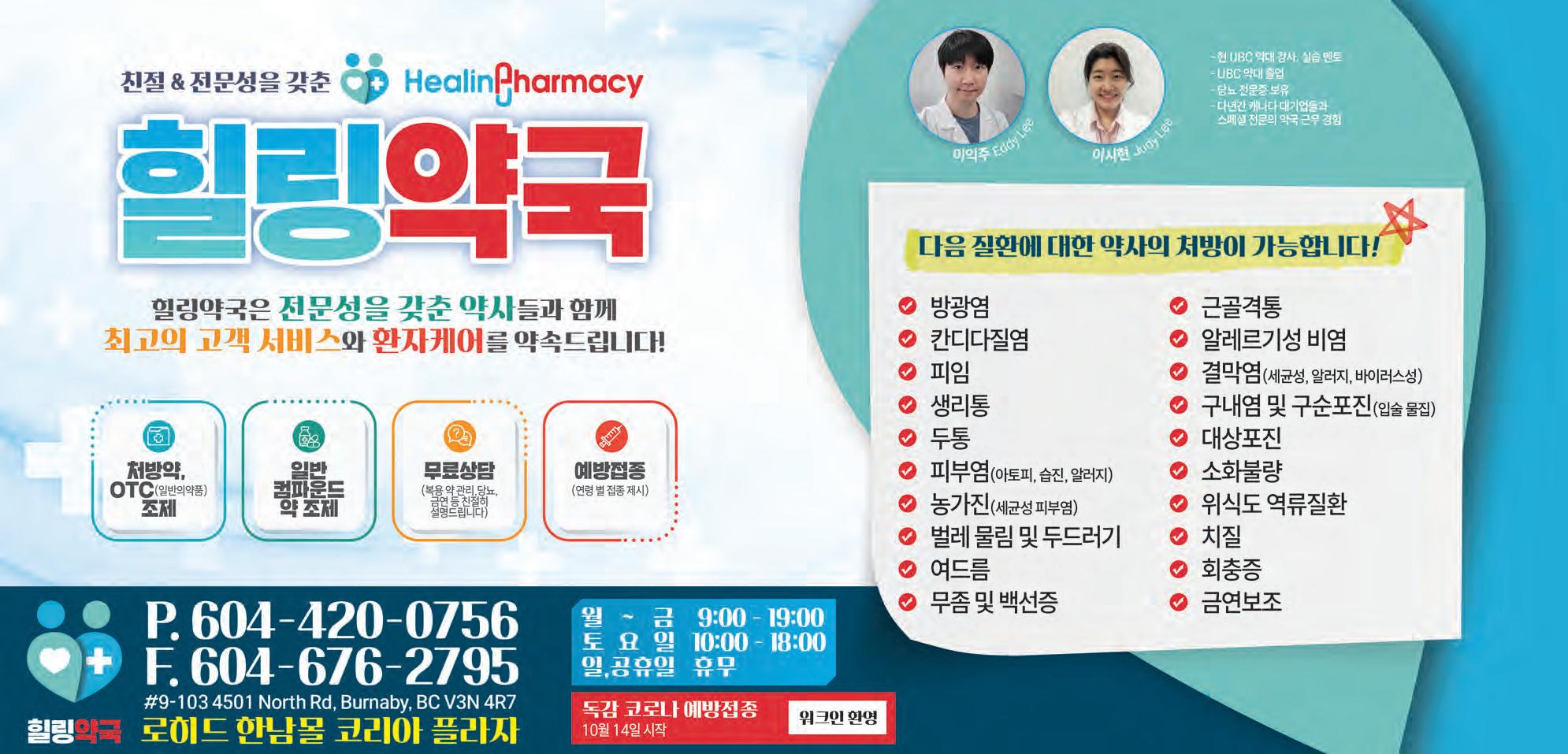


철저한 전략과 분석! Smart Buying & Selling
■ 경력: 15 years+
■ 실력: 실적 상위 0.1% (MLS FVREB)
메달리언 클럽멤버
■ 열정: 7am-11pm 7days a week (무료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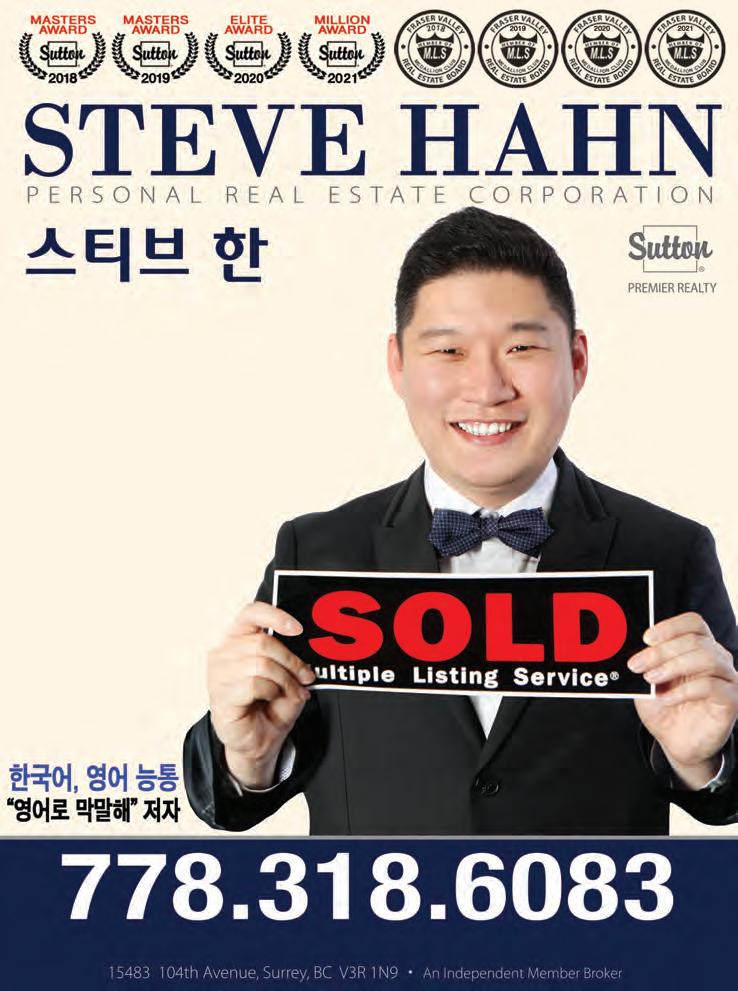
www. MrOpenHouse.ca


vanchosun.com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어 오늘도 가사를 쓴다
【아무튼, 주말】

김희갑이 남편
‘열정’ 시작으로
‘타타타’ 거쳐 명성황후 뮤지컬까지

위해서.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 럼 갈 순 없으니까. 끝내 신춘문예 당선 소감문으로 쓸 수는 없었다. 대신 전 국민이 아는
노랫말이 됐다. 가수 조용필이 부른 ‘
킬리만자로의 표범’. 지난 추석 연휴
방영돼 최고 시청률 18.2%를 찍은 조
용필 콘서트에서 이 40년산(産) 노래
는 명곡이 주는 위대함을 다시금 증
명했다. ‘심장을 움켜쥐는 듯하다’ ‘한
폭의 시(詩) 같은 가사’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철학적 질문과 존재론적
고뇌가 느껴진다’ 같은 감상평이 줄
을 이었다.
콘서트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기도 용인의 한 실버타운에서 남
편 김희갑(89)씨와 함께 살고 있는
작사가 양인자(80)씨를 만났다. 김희
갑은 한국 대중문화의 황금기를 열
었다는 평가를 받는 작곡가다. ‘킬리
만자로의 표범’을 비롯해 지난 60년
간 3000여 곡의 노래를 만들었다. 오
는 5일엔 그의 음악 여정을 담은 다
큐멘터리 영화 ‘바람이 전하는 말’이 개봉한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타타타’
양인자는 “외출이 여의치 않아 (조 용필) 콘서트까진 못 갔다”면서 “휴 대전화로 내 것은 찾아서 봤다”고 했 다. 그가 말하는 ‘내 것’은 ‘그 겨울의 찻집’ ‘Q’ ‘킬리만자로의 표범’으로, 모 두 그가 작사하고 남편이 곡을 붙인 것이다.
◇조용필과의 위대한 만남
이번 콘서트에 등장한 세 곡을 포함, 양인자는 ‘서울 서울 서울’ ‘말하라 그
대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를’ 등 가장 많은 조용필 노래(21곡) 가사를 썼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나온 지 올

해로 40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사랑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방송을 보며 ‘오래전부터 지금까 지 사람들은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을 갖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요.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어?’ 하 는 그런 질문. 그 질문 때문에 그 노 래를 좋아하고, 거기서 위로도 받는 게 아닐까요.” -신춘문예에서 떨어진 스스로를 일 으키기 위해 쓴 글이라고 들었습니 다. “한 번에 다 쓴 건 아니고요. 신춘 문예에서 떨어질 때마다 실의에 빠
진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여기저기
한 줄씩 쓴 내용에 살을 붙인 게 가사 가 됐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야, 일어 나’ 이런 말도 써놓고. 메모해 놓은 거 정리하다 보니 여기저기 유언도 얼 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웃음).” -남편이 곡을 만드셨죠. “가요를 쓰다 보면 ‘나 그대를 만 나서 행복했고, 즐거웠고’ 그러면 3분 끝이에요. 뭔가 해야 할 얘기를 안 한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곡 을 써줄 수 없느냐고 (남편에게) 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