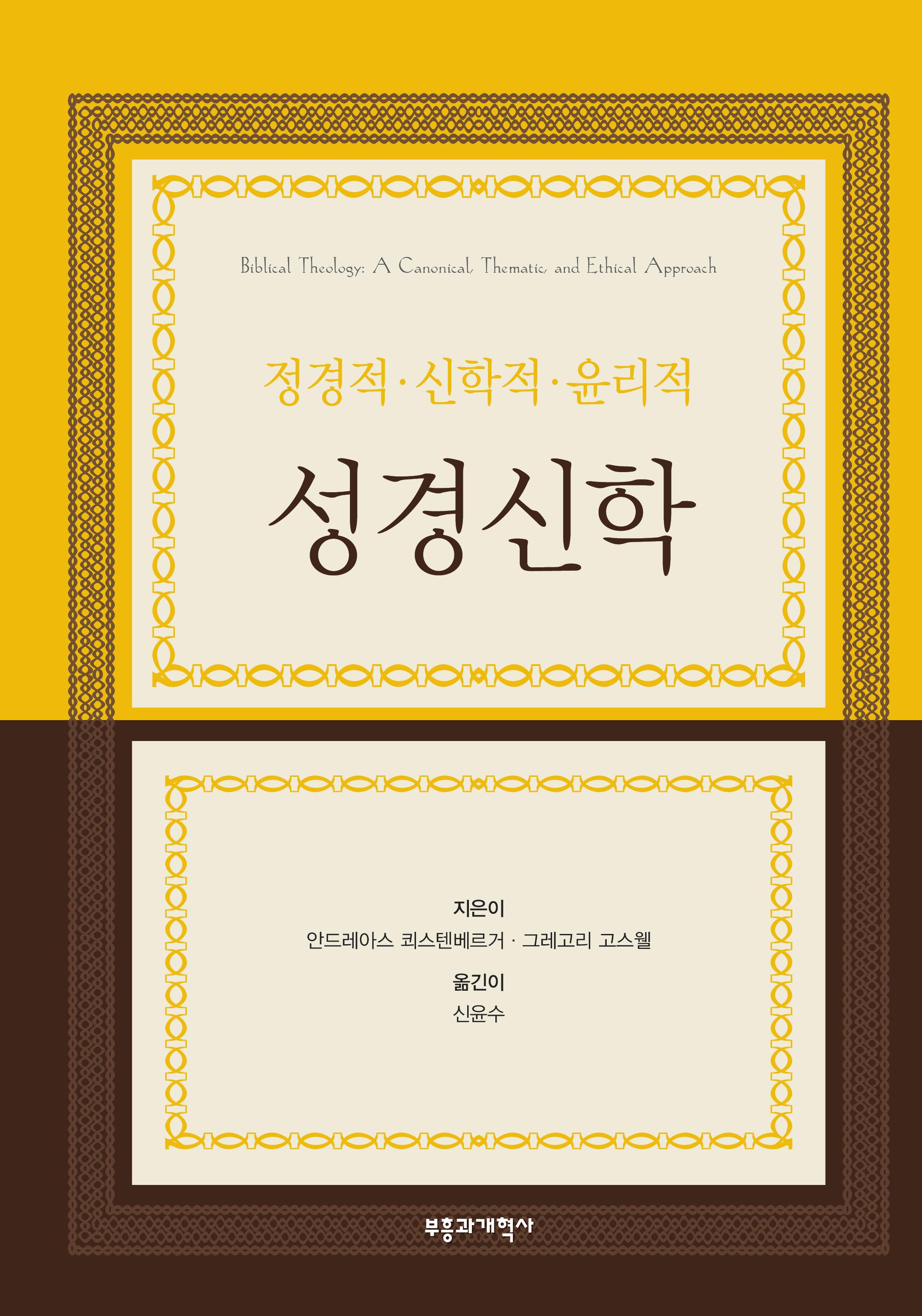| 저자 서문 |
성경신학 책을 쓰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제정신이 라면 누가 이런 어려운 작업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 과정에서 소화하기 벅찬 음식을 삼켰다고 생각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이런 방대한 작업에 도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큰 보람도 있 었다. 이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 연구의 공백을 메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정경 간 연관성 을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독려했으며, 이전 연구의 일부를 활용해 더 큰 전체로 통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따라서 여러 면에서 이 프로젝트는 구약 및 신약 성경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심도 있는 연구의 정점을 찍는 궁극의 프로젝트다.
우리 두 사람은 이 프로젝트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매우 즐겼다. 이 책은 학자뿐 아니라 목회자, 신학생, 기타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학생도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도움이 되 고, 논리적이며, 명료하다고 평가해 주기 바란다. 이 책의 구성은 다소 단순하다. 우리는 정경적, 주 제적, 윤리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전체적으로 정경 순서( 구약의 경우 히브리어 성경 순서 ) 를 따랐는데, 성경 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주의 깊은 성경신학적 읽기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이다. 성경의 개별 책에 대해 주제, 윤리, 성경의 줄거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방식으로, 중심 주제와 메타내러티브 접근법을 모두 갖춘 책별 읽기를 목표로 했다.
이 정도 규모의 저작물에서 관련 문헌 전체를 인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정 도 개인적 해석에 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성경신학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따라, 우리는 일
반적으로 역사적 배경을 포함한 개론상 문제와 대부분의 주석 문제를 전제로 한다. 이런 이유로 매
번 신구약 개론서나 주석서를 인용하는 것은 아니다( 신약의 경우, 본서는 안드레아스가 스캇 켈럼 및 찰스 퀄스와 공저한 『신약개론: 요람, 십자가, 왕관』[The Cradle, the Cross, and the Crown]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우리가 초점을 맞추
고 있는 성경신학은 성경 책 사이의 연결, 특히 신약의 구약 사용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와 관련 하여 주로 단행본 문헌, 저널 논문 및 에세이를 인용한다. 또한 우리는 성경신학뿐 아니라 구약신학 및 신약신학과도 상호 소통한다.
일차적인 영향의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신학은 귀납적으로, 즉 신구약 두 성경을 원어로 주의 깊
고 지속적으로 읽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2차 문헌이나 심지어 성
경 외의 1차 문헌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성경 자체와 정경적 맥락에서 해당 책을 반복적으로 읽음
으로써 해당 책의 신학과 성경의 줄거리에서 그 윤리와 위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전
개했다. 또한 리처드 헤이스의 저서, 특히 『신약의 도적적 전망』(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 『바울서신에 나타난 구약의 반향』(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 『복음서에 나타난 구약의 반 향』( Echoes of Scripture in the Gospels)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프로젝트에는 감사할 사람이 많다. 안드레아스는 아내 마니의 도움에 감사하고 있다. 또한
퀸 모지어, 지미 로, 드레이크 이저벨, 마크 베이커의 연구 지원과 척 범가드너의 세심한 원고 검토
및 유용한 편집 제안에 감사드린다. 그레그는 아내 미뇬의 변함없는 지원과 수년 동안 많은 저자와
선생님들의 공헌에 감사드리며, 특히 그레그의 학부 신학 공부에서 성경과 성경신학에 대한 관심을
키워 준 고( 故 ) 윌리엄 덤브렐의 가르침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정경적·신학적·윤리적 성경신학
성경 저자들의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다. 지구의 모든 지역을 탐험할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지구가 제공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일부만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일반 여행자는 경외감과 보람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도 성경 전체를 읽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읽은 내용만 봐도 다양한 문학 장르, 역사적 배경, 신학적 통찰이 놀랍도록 다양하게 드러난다. 수십 명의 저자가 수백 년에 걸쳐 쓴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어떻게 머릿속에서 정리 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의도한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한 영감 받은 책으로서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 과 하나님의 길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깊은 인격 적 관계로 이끌고자 한다. 한 가지가 더 있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를 묻어 버릴 가
능성이 있는 목소리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들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의 이번 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성경의 세계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
란다. 준비!
1.1 성경신학의 본질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성경신학은 성경에 근거한 신학”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1) 그러나
이 정의의 문제점은 모든 기독교 신학은 성경에 제대로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정의를
제시하는 것은 그저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간단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성경신학은 성경의 신학이다”( Biblical theology is the theology of the Bible ) 2) 달리 말하면, 성경
1) 이 장의 나머지 논의는 Andreas J. Kö stenberger, “The Sizemore Lectures 2018: The Promise of Biblical Theology: What Biblical Theology Is and What It Isn’t,” MJT 17, no. 1 (Spring 2018): 1–13; “The Sizemore Lectures 2018: The Practice of Biblical Theology: How Is Biblical Theology Done?,” MJT 17, no. 1 (Spring 2018): 14–27의 일부 내용을 허락을 받아 차용 및 각색한 것이다.
2) 성경신학을 “성경에 포함된 신학, 성경 자체의 신학”으로 정의하는 Gerhard Ebeling, “The Meaning of ‘Biblical Theology,’” in Word and Faith, trans. James W. Leitch (Philadelphia: Fortress, 1963), 79 참고. Charles H. H. Scobie, The Ways of Our God: An Approach to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MI: Eerdmans, 2003, 『성경신
신학은 우리 자신의 신학이나 우리 교회나 교단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 저자들 자신의 신학이다. 따라 서 구약신학은 구약 저자들의 신학, 신약신학은 신약 저자들의 신학,3) 바울 신학은 바울의 신학, 요 한 신학은 요한의 신학이다.4) 동시에 성경 저자들의 다양한 신학은 성경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단
일 목적을 표현하는 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서로 모순되지 않고 통일되어 있으므로 신성한 연속성 이 있다.5) 이것이 우리가 성경신학을 정의하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성경적 토대 위에 우리의 신학을 구성할 뿐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 하지만 ) 성경의 저자 및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 아래 구약과 신약의 기
록에서 표현한 그들의 믿음과 기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6)
물론 중요한 의미에서 성경 저자들은 성경신학에 직접 참여했으며, 이는 우리가 성경에서 내용만
얻는 것이 아니라 방법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대의 구약 저자들은 이전의 구약 책들을 다시
참고했고, 신약 저자들은 구약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했다.7) 이런 이유로 성경 자체가 성경신학이
학』, 부흥과개혁사 역간, 2017), 5는 앞서 제시한 에벨링의 정의를 인용하며 이 정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선호하는 것 이라고 덧붙인다.
3) 제임스 바는 이들을 “성경신학”이라는 속(genus)의 종(species)이라고 부르며, 이를 “범성경신학”이라고 부른다(The Concept of Biblical Theology:An Old Testament Perspective [Philadelphia: Fortress, 1999], 1).
4) 물론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벤 위더링턴이 주장하듯이 “성경신학은 구약신 학과 신약신학을 결합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라는 것도 사실이다(Biblical Theology: The Convergence of Can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2). 지난 2세기 동안 성경신학이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으로 갈 라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지만, 통합된 성경신학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과 성경 신학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개관은 Charles H. H. Scobie, “History of Biblical Theology,” in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Exploring the Unity and Diversity of Scripture, ed. T. Desmond Alexander, Brian S. Rosner, D. A. Carson, and Graeme Goldsworth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0), 11–20을 참고하라. 또 한 D. A. Carson, “New Testament Theology,” in Dictionary of the Later New Testament and Its Developments: A Compendium of Contemporary Biblical Scholarship, ed. Ralph P. Martin and Peter H. David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7), 796–804; Thomas R. Schreiner, New Testament Theology: Magnifying God in Christ (Grand Rapids, MI: Baker, 2008, 『신약신학』, 부흥과개혁사 역간, 2015), 867–888; Henning Graf Reventlow, “Theology (Biblical), History of,” ABD 6:483–505; Robert W. Yarbrough, The Salvation Historical Fallacy? Reassessing the History of New Testament Theology, Histo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2 (Leiden: Deo, 2004)도 참고하라.
5) 성경신학의 프롤레고메논으로서 계시에 대한 철저한 탐구는 Hans Hü bner, Biblische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vol. 1: Prolegomena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를 참고하라. 또한 일관된 성경신 학을 위한 필수 전제에는 “성경이 신성한 계시를 전달한다는 믿음,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과 삶의 규범을 구성한다는 믿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다양한 자료가 어떤 식으로든 성경 전체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 적과 연관될 수 있다는 믿음”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Scobie, Ways of Our God, 47도 참고하라. Robert Morgan, “Theology (NT),” ABD 6:474는 이를 반대하며 “실제로 성경과 계시를 동일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성경주의”라 고 주장한다(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며 성경에 하나님의 언어적 자기 계시에 대한 증인들이 있음을 지적하는 Carson, “New Testament Theology,” 806의 비판 참고).
6) 물론 성경신학자들도 성경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해야 한다. Scobie, Ways of Our God, 4-5는 성경신학 이 “성경이 하나님과 세상 및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질서 있게 연구하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지적한다(강 조 추가). 성경신학의 범위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Jeremy M. Kimble and Ched Spellman, Invitation to Biblical Theology: Exploring the Shape, Storyline, and Themes of Scripture (Grand Rapids, MI: Kregel, 2020); Jason S. DeRouchie, Oren R. Martin, and Andrew David Naselli, 40 Questions about Biblical Theology, 40 Questions (Grand Rapids, MI: Kregel, 2020, 『성경신학개론』, 부흥과개혁사 역간, 2021)를 참고하라. 또한 Grant R. Osborne, The Hermeneutical Spiral: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rev. e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6, 『성경해석학 총론』, 부흥과개혁사 역간, 2017), ch. 15 및 Stephen J. Wellum, Graeme Goldsworthy, James M. Hamilton Jr., Robert W. Yarbrough, and Mark A. Seifrid의 기고가 실린 “Exploring Biblical Theology,” SBJT 12, no. 4 (Winter 2008)도 참고하라.
7) 예를 들어, D. A. Carson and H. G. M. Williamson, eds., It Is Written: Scripture Citing Scripture: Essays in Honour of Barnabas Lindars, SSF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G. K. Beale and D. A. Carson, ed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Baker, 2007)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성경이 해석학의 틀 을 제공하는 특정한 해석학적 원칙들을 제시하는 방식이나 오늘날 교회가 윤리적 의사 결정에 어떻 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을 마련해 주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성경이 다루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8) 그러므로 오늘날 행해지는 성경신학은 여러 면에서 성경신학을 행하는 성경의 방식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성경 내적 연결성을 찾고, 상호 텍스트성을 추적하며, 성경 의 구원사적 메타내러티브를 따라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주제의 실을 따라가는 것이다.9)
현대에 이르러 “성경신학”이라는 용어는 이전의 여러 저작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10) 성
경신학이라는 학문 분야는 일반적으로 요한 필립 가블러와 그의 1787년 알트도르프 대학 취임 연
설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올바른 구별에 대하여”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11) 가블러의 연설 제
를 참고하라.
8) 특히 Abner Chou, The Hermeneutics of the Biblical Writers: Learning to Interpret Scripture from the Prophets and Apostles (Grand Rapids, MI: Kregel, 2018); Chris Bruno, Jared Compton, and Kevin McFadden, Biblical Theology according to the Apostles, NSBT 52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20, 『NSBT 이스라엘 역사 성경신학』, 부흥과개혁사 역간, 2022)를 참고하라.
9) Jean-Franç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trans.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Theory and History of Literature 10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orig. French ed. La condition postmoderne [1979]), xxiv는 포스트모던 시대를 “장엄한 내러티브들에 대한 불신”으로 특징지었다. 그러나 장 프랑 수아 리오타르의 비판은 단순한 인간 이성으로 현실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근대성의 과신을 폭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지만, 인식론적 회의론에 시달리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보컴이 지적했듯이, 성 경 이야기는 리오타르의 정당한 비판 대상이 아닌 비근대적 메타내러티브의 한 예다. Richard Bauckham, “Reading Scripture as a Coherent Story,” in The Art of Reading Scripture, ed. Ellen F. Davis and Richard B. Hay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3), 47–53을 참고하라. 리오타르의 pp. 45–47에 대한 보컴의 비판은 Steven Connor, Postmodernist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the Contemporary, 2nd ed. (Oxford: Blackwell, 1997), 23–43; Gary K. Browning, Lyotard and the End of Grand Narratives (Cardiff: University of Wales Press, 2000) 에 빚을 지고 있다. 또한 D. A. Carson, The Gagging of God: Christianity Confronts Pluralism, rev. e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2)도 참고하라.
10) Wolfgang Jacob Christmann, Teutsche biblische Theologie (Kempten, 1629;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Henricus A. Diest, Theologia Biblica (Daventri, 1643); Gotthilf Traugott Zachariä, Biblische Theologie oder Untersuchung des biblischen Grundes der vornehmsten theologischen Lehren, 5 vols. (Gö ttingen/Kiel: Boßiegel, 1771, 1772, 1774, 1775, 1786;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1786년 5권의 출판이 가블러의 연설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에 주목하라(다음 각주와 관련 본문을 보라; 참고. John Sandys-Wunsch and Laurence Eldredge, “J. P. Gabler and the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Translation, Commentary, and Discussion of His Originalit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3, no. 2 [April 1980]: 140–158). 참고. Gerhard Hasel, Old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4th ed. (Grand Rapids, MI: Eerdmans, 1991), 11–12. 성경신학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Gerald Bray, Biblical Interpretation: Past and Presen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6), 193–208; Ferdinand Hah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Bd. I: Die Vielfalt des Neuen Testaments, 3rd ed., UTB (Tübingen: Mohr Siebeck, 2011), 1–28; James K. Mead, Biblical Theology: Issues, Methods, and Them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7), 13–59; Eckhard J. Schnabel, “Biblical Theology from a New Testament Perspective,” JETS 62 (2019): 225–249; Scobie, Ways of Our God, 9–28; idem, “History of Biblical Theology.” 또한 Peter Balla, Challenges to New TestamentTheology:AnAttempttoJustifytheEnterprise (Peabody, MA: Hendrickson, 1998); 더 간단한 것으로, Hendrikus Boers, What Is New Testament Theology?The Rise of Criticism and the Problem of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1979); Edward W. Klink III and Darian R. Lockett, Understanding Biblical Theology: A Comparison of Theory and Practic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2, 『성경신학의 5 가지 유형』, 부흥과개혁사 역간, 2015), 13–17을 보라. 11) 알트도르프는 독일 바이에른주 동부 지역(바바리아 지역)의 뉘른베르크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 해 있다. 가블러의 연설 라틴어 제목은 ‘오라티오 데 유스토 디스크리미나 테올로기아이 비블리카이 에트 도그마티 카이 레군디스케 렉테 우트리우스케 피니부스’(Oratio de iusto discrimina theologiae biblicae et dogmaticae regundisque recte utriusque finibus)였다. 이 연설의 영역본은 Old Testament Theology: Flowering and
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성경신학의 역사적 성격과 조직신학의 교리적 성격에 맞도록 이 둘을 적
절히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을 옹호하고 성경신학의 역사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 적절하지만, 가블러는 또한 보편적인 종교적 이성 원칙에 따라 성경에서 “진정으로 신성한”( 즉,
계시적인 ) 것과 “단지 인간적인” 것을 구분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12) 이런 이유
로 일부 사람들은 가블러를 “성경신학의 아버지”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정당성을 가
지고 이의를 제기한다.13)
그 후 몇 년 동안 고대 근동 종교와 1세기 헬레니즘의 종교 관습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종교 및 초 기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시도한 종교사적 접근법을 필두로 역사비평은 튀빙겐 학파의 기치 아래 전
성기를 구가했다.14) 튀빙겐 학파의 창시자인 페르디난트 크리스티안 바우어의 맥락에서 성경신학은
성경의 계시적, 영감적, 권위적 특성을 대체로 거부한 학자들이 수행하는 단순한 역사적 과제로 생
각되었다.15) 그리하여 1897년 빌리암 브레데( William Wrede ) 는 『소위 신약신학의 과제와 방법에 대하
여』( Concerning the Task and Method of So-Called New Testament Theology ) 라는 제목의 역작을 쓸 수 있었는데, 그는 여기서 신약신학의 종말을 선언했다.16) 가블러-바우어-브레데로 이어지는 역사비평학파의 배
경에서 몇 안 되는 밝은 점 중 하나는 스위스-독일 신학자 아돌프 슐라터로, 그는 두 권짜리 신약신 학 책을 1909/10년과 1921/22년에 각각 초판과 2판을 출간하여 『그리스도의 역사』( The History of the
Future, ed. Ben C. Ollenburger, Sources for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y 1, 2nd ed.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4; repr. ed., 2016), 497–506에 수록된 Johann Philipp Gabler, “An Oration on the Proper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and the Specific Objectives of Each”를 보라. 가블러의 연 구 요약은 William Baird, History of New Testament Research, vol. 1: From Deism to Tübingen (Minneapolis: Fortress, 1992), 184–187; Scobie, Ways of Our God, 15–16을 참고하라. 영어 번역과 비평은 Sandys-Wunsch and Eldredge, “J. P. Gabler and the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133–158을 보 라; Witherington, Biblical Theology, 11–18, 특히 14도 보라. 가블러 연설의 현대적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Peter J. Gentry and Stephen J.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Covenants, 2nd ed. (Wheaton, IL: Crossway, 2018), 40–41을 보라. J. P. 가블러와 게르하르두스 보스의 비교 평 가는 Matthew Barrett, Canon, Covenant, and Christology: Rethinking Jesus and the Scriptures of Israel, NSBT 51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20), 17–20을 참고하라.
12) Sandys-Wunsch and Eldredge, “J. P. Gabler and the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143; 및 Barrett, Canon,Covenant,and Christology, 18의 논의 참고.
13) 예를 들어, Charles H. H. Scobie, “The Challenge of Biblical Theology,” TynBul 42 (1991): 34; William D. Dennison, “Reason, History, and Revelation: Biblical Theology and the Enlightenment,” in Resurrection and Eschatology: Theology in Service of the Church: Essays in Honor of Richard B. Gaffin Jr., ed. Lane G. Tipton and Jeffrey C. Waddington (Phillipsburg, NJ: P&R, 2008), 343; 및 Barrett, Canon, Covenant, and Christology, 18–19의 논의 참고.
14) 튀빙겐 학파에 대해서는 Horton Harris, The Tübingen School: A Historical and The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School of F. C. Baur (Oxford: Clarendon, 1975)를 참고하라. 종교사학파(宗敎史學派)에 대해서는 Wilhelm Bousset, Kyrios Christos: A History of the Belief in Christ from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to Irenaeus, trans. John Steely (Nashville: Abingdon, 1970)를 참고하라.
15) F. C. 바우어와 요한 크리스티안 콘라트 폰 호프만(Johann Christian Konrad von Hofmann)의 작업에 대한 비교, 대 조에 대해서는 Yarbrough, Salvation-Historical Fallacy, 8-59를 참고하라. 야브루는 바우어가 “가블러의 의미에서 최초의 위대한 신약신학 종합서 중 하나”를 저술했다고 언급한다(8).
16) 독일어 제목은 Über die Aufgabe und Methode der sogenannten neutestamentlichen Theologi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7)이다. Carson, “New Testament Theology,” 797은 브레데가 “신약의 각 책을 개 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데, 각 책은 해석자가 저자의 전체 ‘신학’을 재구성하기에는 너무 적은 정보를 제공 하기 때문이다. 책임감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기 기독교 종교와 신학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인다.
Christ ) 와 『사도들의 신학』( The Theology of the Apostles ) 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를 펼쳤다.17) 신학 거장들
인 칼 바르트와 루돌프 불트만은 신정통주의를 옹호하거나 탈신화화에 참여함으로써 각자의 방식으
로 신학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두 경우 모두 신학은 성경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차원에서 더 이상
유기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18) 그 대신 그들은 계시는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사도의 선포된 메시지
인 케리그마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9) 그래서 바르트는 브레데의 역사 연구, 곧 “브레데반”에
편승하기보다는 “선포를 통해 현존하게 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본문과의 실존적 만
남을 일으키고자 하였고, 불트만은 예수의 부활을 포함한 성경의 기적을 순전히 실존주의적인 용어
로 재해석했다.20)
1950년대와 60년대에 새로운 성경신학 운동이 일어났는데, 부분적으로는 칼 바르트에게, 그리
고 어느 정도는 요한 크리스티안 콘라트 폰 호프만에게 영향을
17) Adolf Schlatter, Das Wort Jesu (Stuttgart: Calwer, 1909); 2nd ed., Die Geschichte des Christus (Stuttgart: Calwer, 1921); idem, Die Lehre der Apostel (Stuttgart: Calwer, 1910); 2nd ed., Die Theologie der Apostel (Stuttgart: Calwer, 1922). trans. The History of the Christ:The Foundation of New Testament Theology, trans. Andreas J. Köstenberger (Grand Rapids, MI: Baker, 1997); The Theology of the Apostles: The Development of New Testament Theology, trans. Andreas J. Köstenberger (Grand Rapids, MI: Baker, 1999). 한편 슐라터는 폰 호프만의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Die heilige Schrift des neuen Testaments zusammenhängend untersucht, 11 vols. (Nördlingen, Germany: C. H. Beck, 1862–1878; 2nd ed., W. Volck, ed., 1896); idem, Weissagung und Erfüllung im Alten und im Neuen Testamente, 2 vols. (Nördlingen, Germany: C. H. Beck, 1841)을 보 라. 폰 호프만의 입장은 Theodor Zahn, Johann Chr. K. von Hofmann: Rede zur Feier seines hundertsten Geburtstags in der Aula der Friderico-Alexandrina am 16. Dezember 1910 gehalten (Leipzig: A. Deichert, 1911), 17의 다음 인용문에 대표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사람들은 폰 호프만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 아닌 신학 자,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는 길에 있지 않은 신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화가가 되기를 열망하는 맹인만큼이나 불 쌍한 존재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슐라터와 브레데의 비교와 대조에 대해서는 Robert Morgan, The Nature of New Testament Theology (London: SCM, 1973)을 참고하라. 그는 “신학에서 역사적 방법의 필요성과 그것이 역사가의 개인적인 관점에 방해받지 않고 그것이 작동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 슐라터가 브레데와 얼마나 깊이 일치하는지는 놀 랍다”(29)라고 한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논의를 참고하라.
18) 예를 들어, Karl Barth, Der Römerbrief (Zürich: EVZ, 1919; 2nd ed. 1921); trans. The Epistle to the Romans, trans. Edwin C. Hoskyns (1933; rep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Rudolf Bultmann,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rans. Kendrick Grobel, 2 vol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1, 1955) 참고. Carson, “New Testament Theology,” 797–798의 논의를 참고하라.
19) Morgan, Nature of Biblical Theology, 34–35의 논의를 참고하라.
20) 이 인용문은 Morgan, Nature of Biblical Theology, 34에서 발췌한 것이다. “브레데반”(Wredebahn; 브레데의 길) 이라는 용어는 N. T. 라이트에게서 차용했다. 라이트는 신약 연구에 대한 역사적 접근 또는 묵시적 접근이라는 선택 지를 가리키면서 “브레데반” 외에도 “브레데슈트라세”(Wredestrasse)나 “슈바이처반”(Schweitzerbahn; 슈바이 처의 길)이라는 용어도 썼다. Wright, “The Servant and Jesus: The Relevance of the Colloquy for the Current Quest for Jesus,” in Jesus and the Suffering Servant: Isaiah 53 and Christian Origins, ed. William H. Bellinger Jr. and William R. Farmer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8), 281-297을 보라. 불트만에 대 한 중요한 비평은 Peter Stuhlmacher, Biblica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trans. and ed. Daniel P. Bailey (Grand Rapids, MI: Eerdmans, 2018), 19-21을 참고하라. 그는 불트만의 실존주의와 탈신화화 프로그램, 유대교와 헬레니즘 사이의 이분법, 구약 성경에 대한 소홀함 등을 비판한다. 무엇보다도 슈툴마허는 불트만에 맞서 예수의 선 포가 (불트만이 유명하게 주장한 것처럼) 단순히 신약신학의 전제가 아니라 “신약신학의 (적절한) 역사적 토대”라고 주장한다(20). Peter Stuhlmacher, “Die Tübinger Biblische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Ein Rückblick,” Theologische Beiträge 48 (2017): 76-91도 참고하라. 여기서 저자 슈툴마허는 (자신의 책을 헌정한 두 학자) 하르 트무트 게제와 마르틴 헹겔 등과의 관계를 회상하며 현재 튀빙겐 대학교의 교수진이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불트 만 학파로 돌아간 것을 한탄한다(xvii, n. 9에 언급된 바와 같다).
했다.21) 이 도전은 1970년 브레바드 차일즈가 『위기의 성경신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쓸 정도로
정체되었다.22) 물론 성경신학이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 운동이 쇠퇴한 것이었다. 제임스 바는 부적절한 방법론과 언어적 절차를 이유로 그 운동의 실천가들을 심각하게 비판했고, 일부 사
람들은 그가 그 운동 전체를 죽였다고 생각할 정도였다.23) 바 자신은 성경을 “내적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많은 “단편적인 문서 모음”으로 보았다.24) 그러나 그 후 특히 북미의 보수적 복음주의 세
계에서는 고등 성경관에 기초하고 역사 연구와 문학 연구에 기반을 둔 새로운 유형의 성경신학이 번
성하기 시작했다.25) 이 책에서 우리가 주제적, 윤리적, 정경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성경신학이다.
무엇보다도 성경신학은 성경 저자 자신의 신학과 관련 있다. 슐라터는 한 세기 전에 이 문제를 잘
정리했다. “‘신약’ 신학을 말할 때, 우리는 해석자 자신의 신학이나 그가 속한 교회와 시대의 신학이
아니라 신약 성경 자체가 표현하는 신학을 검토하는 것이다.”26)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신 학을 분별해야 할까? 다시 한번 슐라터의 말이 도움이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에서 단
호하게 눈을 돌려 교회가 생겨났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것으로 눈길을 돌린다. 우리
21) Carson, “New Testament Theology,” 798. 그런 접근의 한 예로 G. Ernest Wright, God Who Acts: Biblical Theology as Recital, SBT 1, no. 8 (London: SCM, 1952)이 있다.
22) Brevard S. Child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Louisville: Westminster, 1970). “성경신학의 (구약신학과 신약신 학으로의) 분열, (종교사에 흡수된) 성경신학의 쇠퇴, 그리고 마침내 성경신학의 사실상 소멸”에 대해 말하는 Scobie, Ways of Our God, 6을 보라. 성경신학 운동의 종말 이후 신약 성경을 정경적으로 읽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Markus Bockmuehl, Seeing the Word:Refocusing New Testament Study, Studies in Theolog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6), 3장, 특히 101을 보라. 그는 모든 지식은 관점적이고 매개적이라는 점을 강조 하며 신약 성경 본문의 선택적 해석적 성격에 주목하고(13-21) 성경 해석에서 영향사(Wirkungsgeschichte)와 살아 있는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4장 및 6장).
23) James Barr,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특히 게르하르트 키 텔이 편집한 여러 권의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에 대한 그의 비평(8장)을 참고하라. 바 자신 의 성경신학 개념도 참고하라.
24) James Barr, “Biblical Theology,” in IDBSup (1976), 109 (Barrett, Canon, Covenant, and Christology, 12의 논 의 참고).
25) 이미 2003년에 Scobie, Ways of Our God, 42-45는 “성경신학의 부흥”의 조짐을 볼 수 있었다. 대표적인 시리 즈에 대해서는 Biblica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BTNT; Andreas J. Köstenberger, ed.; Zondervan);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EBTC; T. Desmond Alexander, Thomas R. Schreiner, and Andreas J. Köstenberger, eds.; Lexham); Essential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ESBT; Benjamin L. Gladd, ed.; InterVarsity Press);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NSBT; D. A. Carson, ed.; InterVarsity Press); Short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SSBT; Dane C. Ortlund and Miles V. Van Pelt, eds.; Crossway)가 있다. 또 한 Theology for the People of God (David Dockery, Christopher W. Morgan, and Nathan Finn, eds.; B&H Academic)은 주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성경신학자 및 조직신학자들의 공동 작업을 다루고 있다.
26) Schlatter’s Das Wort Jesu (1909), reprinted (ET) in Schlatter, History of the Christ, 18의 서문(Scobie, Ways of Our God, 19에서 슐라터의 저작에 대한 긍정적 언급을 참고하라). 비슷한 맥락의 논의에 대해서는 Andreas J. Köstenberger with Richard D. Patterson, Invita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Exploring the Hermeneutical Triad of History, Literature, and Theology, 2nd ed. (Grand Rapids, MI: Kregel, 2021, 『성경해석학 개론』, 부흥 과개혁사 역간, 2017), 14장을 참고하라. Barr, Concept of Biblical Theology, 4도 참고하라. 그는 성경신학은 “성경 자체의 시대, 언어, 문화 안에서 생각되거나 믿어진 것”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 은 그때 거기 존재했던 ‘신학’이며……그것은 성경 인물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신학”이라고 덧붙인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신학이 거의 암시적일 수 있지만, 다른 경우(예. 요한복음)에는 더 명시적일 수 있으며, 그 신학은 예를 들어 그리 스도의 신성 등에 대한 의식적인 성찰을 나타낼 수 있다(“[신학이란] 종교적 표현의 내용이 어느 정도 추상화되고, 숙 고되고, 성찰과 토론의 대상이 되어 의도적으로 재구성되는 성찰 활동”[249]이라고 언급하는 앞의 책, 248-249의 논 의 참고).
의 주된 관심은 그들이 생각했던 사상과 그들에게 유효했던 진리여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어
났고 다른 시대에 존재했던 것을 보고 철저히 파악하기를 원한다.”27) 슐라터는 이를 “역사적 과제”
라고 부르는데, 이는 교회의 교리 정립에서 정경 이후의 발전을 다루는 역사신학과 구별되는 것으
로, 특정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화하는 “교리적 과제”는 그 뒤를 잇는 것이다.
정의( 定義 ) 는 중요하다.28) 정의 문제에 대한 이 모든 논의가 다소 현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
리는 성경신학의 실천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성경신학에 대한 책을 쓰든 일상적인 소통에 참여하든, 대화 상대가 우리와 같
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과정의 일부는 핵심 용어를 신중하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신학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경 저자 자신의 신학적 공헌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이해에 기초하여 성경신학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공헌을 일관된 형식으로 제시하고, 주어진 성경 책에서 특징적인 강조점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이를 대주제와 소주제의 형태로 배열하고, 우리의 진술이 성경 저자들의 사상 세계를 가능한 한 정
확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서로 연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29)
1.1.1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인접한 두 학문 간의 협업으로 이해하는 것
이 가장 좋다.30) 한 주자( 성경신학 ) 가 다음 주자( 조직신학 ) 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릴레이 경주의 이미지 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두 학문은 함께 경주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성경신학이 먼저
달리고 조직신학이 두 번째로 달린다. 사실 성경신학은 4인 릴레이 팀의 일원으로서 특정 본문에 대 한 주석은 말할 것도 없고 저자, 연대, 출처, 청중, 상황, 기록 목적과 같은 개론적 문제에 기반을 두 고 있기 때문에, 개론적 문제가 먼저 진행되고, 주해가 이어지며, 그다음에 성경신학( 역사신학으로 보완 됨 ),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신학( 그리고 목회신학 ) 이 이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31) 개론이 릴레이 팀
27) Schlatter, History of the Christ, 18. 물론 이 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머리인 교회를 태어나게 한 분은 그리스도며, 그 들은 교회의 창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인간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28) D. A. Carson, “Current Issues in Biblical Theology: A New Testament Perspective,” BBR 5 (1995): 17-26을 참 고하라. 카슨은 정의적 명확성을 요구한 후, 성경신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효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1) 기술적이고 역사적으로 고찰된 성경 전체의 신학, (2) 다양한 성경 모음집 또는 층위의 신학(예. 구약신학과 신약신학), (3) 성경 전체에 걸친 특정 주제에 대한 신학. Kimble and Spellman, Invitation to Biblical Theology, 16-21 참고. 두 사람은 성경신학을 “성경 전체를 그 자체로 연구하는 것”(16, 21)이라고 실무적 정의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성 경신학을 “성경에 제시된 신학”과 “성경에 부합하는 신학적 성찰”이라고 정의되는 “두 가지 의미의 이야기”라고 주장 한다(17-18). 우리는 첫 번째 의미만이 성경신학의 올바른 정의이며, 두 번째 의미는 조직신학을 더 정확하게 설명한 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 “의미” 또는 정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혼란을 지속시키고 두 학문 사이의 경계를 지나 치게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29) 이것은 앞서 언급한 Kimble and Spellman, Invitation to Biblical Theology, 17-18이 취한 접근 방식(이들은 “성경 에 부합하는 신학적 성찰”을 성경신학의 일부로 포함한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일차적 으로 기술적이기 때문에 설명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연결과 배열이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30) Osborne, Hermeneutical Spiral, 353-355는 조직신학은 한편으로는 주해신학과 성경신학, 다른 한편으로는 적용과 설교학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썼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인 분석에서 이들 학문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과제를 과도하게 분리하려는 시도는 인위적인 것”이라고 덧붙인다(355쪽에서 인용).
31) D. A. Carson, “The Bible and Theology,” in NIV Biblical Theology Study Bible, ed. D. A. Carson (Grand
을 좋은 출발로 이끌고, 주해가 확고한 선두를 구축하며, 성경신학이 그 리드를 더 벌리고, 조직신학
이 결승선을 통과하여 팀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32)
따라서 마지막 두 주자만 놓고 보면 성경신학이 먼저 달리고 마지막 주자의 특권과 책임을 가진
조직신학에 바통을 넘기는 것이 된다.33) 그런데 슐라터가 정확히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 그는 먼저
두 권의 신약신학( 『그리스도의 역사』와 『사도들의 신학』 ) 을 저술한 후, 윤리, 철학, 기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저술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신학( 『기독교 교리』 ) 을 저술했다.34)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구분하고 성경
신학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슐라터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 이 두 학문 사이의 경계를 지
나치게 모호하게 하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관
점이 왜곡되고, 우리의 적용 또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크다.35)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지상의 몸을 “장막”( 텐트 ) 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설교자들이 하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 갔던 캠핑 여행의 예화를 사용하기보다는 1세기 맥락에서 이 은유가 갖는 의미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예.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등 ).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자 신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에 대한 언급을 현대 용어가 아닌 고대 근동의 용어 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진처럼 사람의 신체적 외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원칙[representative rule]을 전달하는 것으로 ) 36)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진화나 지적 설계의 문제
를 다루는 것으로 읽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그 본래의 목적( 이스라엘 언약 역사의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두
려는 것 ) 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37) 슐라터가 관찰한 것처럼, “따라서 이 두 분과[성경신학과 조직
신학]의 구별은 서로에게 유익한 것으로 드러난다. 분과의 할당에서 부적절한 절차가 분과의 인식을
Rapids, MI: Zondervan, 2018), 6-11. 그러나 엄밀한 선형적 해석에 대한 아래 주의도 참고하라.
32) 이 비유는 성경학자, 주석가, 성경신학자, 조직신학자로 구성된 다양한 팀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기량을 겨루는 릴레이 경주에서 다른 주자들을 상상함으로써 확장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팀이 성 경 저자들의 사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최선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33) 참고. D. A. Carson, “Systematic Theology and Biblical Theology,” in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89–104; Scobie, Ways of Our God, 66: “교의 신학은 본문의 지평에서 해석자의 지평으로 이동하는 마지막 단 계다.” 반대 견해에 대해서는 “조직신학은 단순히 성경신학을 따르는 두 번째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주해 과정 자체 의 파트너”라고 주장하는 Kevin J. Vanhoozer, “Is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One or Many? Between (the Rock of) Systematic Theology and (the Hard Place of) Historical Occasionalism,” in Re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iblical and Systematic Theology in the New Testament: Essays by Theologians and New Testament Scholars, ed. Benjamin E. Reynolds, Brian Lugioyo, and Kevin J. Vanhoozer, WUNT 2/369 (Tübingen: Mohr Siebeck, 2014), 38을 참고하라.
34) 예를 들어, Adolf Schlatter, Die Geschichte des Christus (Stuttgart: Calwer, 1909; 2nd ed. 1922); Die Theologie der Apostel (Stuttgart: Calwer, 1910; 2nd ed. 1923); Das christliche Dogma (Stuttgart: Calwer, 1911; 2nd ed. 1923); Die christliche Ethik (Stuttgart: Calwer, 1914); Die philosophische Arbeit seit Cartesius: Ihr religiöser und ethischer Ertrag (Gütersloh: C. Bertelsmann, 1906; 4th ed. Stuttgart: Calwer, 1959) 등을 참고하라. 철저한 참고문헌을 포함한 최고의 전기(傳記)에 대해서는 Werner Neuer, Adolf Schlatter: Ein Leben für Theologie und Kirche (Stuttgart: Calwer, 1996)를 참고하라.
35) 역사와 적용에 대해서는 Köstenberger with Patterson, Invita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2장과 15장을 각각 참 고하라.
36) 참고. John H. Walton, TheLostWorldofAdamandEve:Genesis2–3andtheHumanOriginsDebat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5), 여러 곳.
37) 참고. John H. Walton, 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Ancient Cosmology and the Origins Debat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9), 여러 곳.
흐리게 만들 듯이, 분과의 인식에서 왜곡 또한 분과의 할당에 해를 끼친다.”38) 달리 말하면, 현재의
주제들을 다루는 것( 조직신학 ) 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슐라터가 “역사적 과제”라고 부르는 성경신
학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목적을 위해 성경신학을 본질적으로 역사적, 귀납적, 기술적 신학이라고 정의하
겠다.39) 이런 식으로 해석자는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를 “끌어내는”( 주해 ) 작업을 할 수 있다. 게르하
르두스 보스가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성경신학에서는 주해가 기본이며, 주해를 위해서는 해석자의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경신학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듣는 과
정”이다.40) 나아가 해석자는 “저자 의도”의 해석학을 사용할 뿐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여 해
석 작업을 수행한다. 해석자는 주해신학적 연구와 성경신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화하여 현대적 적용을 위한 탄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신학
은 조직신학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후자는 역사, 문학, 신학이라는 해석학의 트라이어드( triad, 다리가
셋 있는 의자 ) 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41)
이런 질문을 판단하는 데 있어, “조직신학의 가능성”이라는 적절한 부제가 붙은 이 주제에 대한
D. A. 카슨의 에세이가 편리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42) 카슨은 주해, 성경신학, 조직신학의 관계를 다
루면서 “우리가 다음 도해의 방향만을 따라 작업할 수 있다면 편리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주해 → 성경신학 → [역사신학] → 조직신학.”43)
그러나 카슨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이 도해에 나타난 것같이 간단하고 선형적인 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순진한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전제 없이 주해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카
38) Schlatter, History of the Christ, 18. 39) 아래 1.2.1을 참고하라. Carson, “Current Issues in Biblical Theology: A New Testament Perspective,” 31은 “이상적으로 성경신학은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서……사람을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부른다”(강조 제 거)라고 올바르게 지적한다. 이 부분은 출판사의 허가를 받아 Köstenberger with Patterson, Invita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14장에서 수정 및 발전시킨 것이다. 40) 참고.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MI: Eerdmans, 1948), 4. 마찬가지로 Schlatter, History of the Christ, 18에서는 듣는 해석학과 주로 존재하는 것을 “보는” 데 초점을 맞춘 인 식의 해석학을 요구한다. 보스는 이어서 주해신학은 성경의 내용에 대한 연구, 개론학, 정경 연구(“정경학”), 성경신학 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그는 성경신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을 다루는 주해신학의 한 분야” 라고 덧붙인다(Biblical Theology, 4).
41) 이들 “트라이어드의” 해석학적 접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Köstenberger with Patterson, Invita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1장을 참고하라. 요약은 Andreas Köstenberger, “Invita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and the Hermeneutical Triad: New Hermeneutical Lenses for a New Generation of Bible Interpreters,” CTR n.s. 10, no. 1 (Fall 2012): 3-12를 참고하라.
42) 미드웨스턴 성경연구 센터 웹사이트(cbs.mbts.edu)에 게시된 성경신학에 대한 여러 팟캐스트도 참고하라.
43) D. A. Carson, “Unity and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The Possibility of Systematic Theology,” in Scripture and Truth, ed. D. A. Carson and John D. Woodbridge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3), 91; repr. in D. A. Carson, Collected Writings on Scripture (Wheaton, IL: Crossway, 2010), 145; idem, “Bible and Theology,” 2633-2636; Benjamin B. Warfield, “The Idea of Systematic Theology,” in Studies in Theology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88), 49-87(원래 Presbyterian and Reformed Review 7 (1896): 243-271 에 게재); Richard B. Gaffin Jr., “Systematic Theology and Biblical Theology,” WTJ 38 (1976): 281-299.
슨은 해석학적 순환 모델을 탐구한 후, 이런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도식 형태를 제안 한다.44) 그럼에도 그는 “주해는 조직신학의 영향을 받지만, 조직신학의 족쇄에 묶여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한다.45)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모두 이미 일종의 조직신학을 가지고 주석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이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든 아니든, 그런 조직신학이 얼마나 정교한지에
도 상관없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학 체계와 전제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거리
를 두어 가능한 한 귀납적으로 주해와 성경신학적 작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46)
우리가 신학적 전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때 숨어 있는 한 가지 특
별한 위험은 시대착오, 즉 후기에 발전된 내용을 초기의 본문으로 읽는 오류다.47) 예를 들어, 성경
의 점진적 계시를 인정하면서도 주로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불연속성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적절
히 고려하지 않는 접근법을 예로 들 수 있다.48) 그러나 질문해야 할 것은 주어진 체계가 성경신학의
귀납적 성격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지다. 적어도 원칙적으로, 우리는 후대의 발전된 내용을 이전
의 성경으로 읽지 않고 오히려 이전의 본문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구약 성경
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눅 24:24-27; 요 5:46-47 ) 신약 신자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고
전 10:1-13; 딤후 3:16-17 ), 그럼에도 성경 계시는 점진적이며 때로는 이전에 계시되지 않았던 영적 진리의 공개를 수반하기도 한다.49) 그러므로 우리가 일차적이고 근본적으로 귀납적인 학문 분과인 성경신 학에 헌신한다면, 이 영역에서 자제는 우리가 성경의 다양성과 불연속성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할 것
44) Carson, “Bible and Theology,” 2635의 “되풀이 회로”(Feedback Loop) 차트를 참고하라.
45) Carson, “Unity and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92. “조직신학적 도식이 성경적 사고에 이질적인 범주를 강 요하는 경향이 있으며 “땅”이나 “지혜” 같은 실제 성경 범주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반대를 지적한 Scobie, Ways of Our God, 83 참고.
46) 가블러는 “자신의 의견과 판단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타락한 관습”과 “자신의 가장 실체 없는 의견을 감히 성경 기자 에게 돌리는 저 불행한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올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성경에 폭력 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인다(Sandys-Wunsch and Eldredge, “J. P. Gabler and the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135에 인용됨).
47)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라.
48) 안타깝게도 지면 관계상 여기서 이 문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다.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병행하는 학문으로 보는 주장 에 대해서는 Geerhardus Vos, The Idea of Biblical Theology as a Science and as a Theological Discipline (New York: Anson D. F. Randolph, 1894); idem, Biblical Theology; Vern Sheridan Poythress, “Kinds of Biblical Theology,” WTJ 70 (2008): 129–142를 참고하라. 보스는 “성경 계시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Biblical Theology, 5-9). 보스의 성경신학 방법에 대해서는 Andreas J. Köstenberger, “Geerhardus Vos: His BiblicalTheological Method and His Theology of Gender,” Geerhardus Vos Lecture (Beaver Falls, PA: Geneva College, 출간 예정)를 참고하라.
49) 여기서 헬라어 ‘뮈스테리온’(μυστήριον)에 대한 신약 성경의 용례를 참고하라(예. 마 13:11; 막 4:11; 눅 8:10; 롬 11:25-27; 16:25-26; 고전 15:51; 엡 3:2-10; 5:32; 골 1:26-27; 살후 2:7; 딤전 3:16). 이 단어는 우리말 번역에서 는 통상, 하지만 다소 부적절하게 “미스터리”(개역개정은 주로 “비밀”)로 번역되어 있다. 사실, ‘뮈스테리온’은 미스터 리와는 정반대로,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D. A. Carson, “Mystery and Fulfillment: Toward a More Comprehensive Paradigm of Paul’s Understanding of the Old and New,” in Justification and Variegated Nomism, vol. 2: The Paradoxes of Paul, WUNT 2/181, ed. D. A. Carson, Peter T. O’Brien, and Mark Seifrid (Tübingen: Mohr Siebeck; Grand Rapids, MI: Baker, 2004), 393-436 참고. 또한 G. K. Beale and Benjamin L. Gladd, Hidden but Now Revealed: A Biblical Theology of Myste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4)도 보라.
을 요구한다.50)
그렇다면 우리는 조직신학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카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조직신학은
“논리, 질서, 필요라는 무시간적 원리들에 따라 조직된 내적 구조를 가진 기독교 신학이다.”51) 따라
서 한 가지 전형적인 도식은 성경 자료를 프롤레고메나( 기원론 또는 우주론[기원에 대한 연구] 및 성경학[성경에 대 한 교리] ), 신론( 신에 대한 교리 ), 천사론 및 악마론, 인간론( 인간에 대한 교리 ), 죄론( 죄에 대한 교리 ), 기독론, 성령
론( 성령에 대한 교리 ), 구원론( 구원에 대한 교리 ), 교회론( 선교학 포함 ), 종말론( 미래에 대한 교리 ) 과 같은 범주에 따
라 조직화한다.52) 이런 각 주제에 대한 주해와 성경의 가르침에 적절히 근거한다면 논리, 순서, 필
요( 시대적 상황 ) 에 따라 자료를 무시간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 교회를 위한 성경적 틀을 구
성할 때 매우 유익할 수 있다.
사실 조직신학이 성경신학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
선, 어떤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하나의 구절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체계적이고 조
직적인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종교개혁의 원리( 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 “성경은
그 자신의 해석자다” ) 를 고려할 때, 조직신학은 해석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중 일부만 강
조하고 다른 부분은 소홀히 하여 균형이 맞지 않거나 심지어 신학적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사이에는 진자의 운동 같은 역동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주
해에서 성경신학으로, 그리고 거기서 조직신학으로 선형적인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의 핵심 교리가 성경신학적 탐구의 고백적 틀이 되도록 우리는 “순환을 반복”한다( 단, 성경신학의 귀납적
성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D. A. 카슨은 이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쓴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은 조직신학을 폄하하거나 그 학문을 외면하려는 시도가 아 니라는 점이다. 조직신학이 성경의 말씀을 길들이는 위험에 대해 경고할 때, 그럼에도 나는 조 직신학이 적절히 전개되면 우리의 주해를 풍성하게 하고, 심화하고, 보호해 준다고 기꺼이 주 장한다……최고의 조직신학은 모든 성경을 충실한 방식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할 뿐 아니라, 전
50) 올바른 해석학적 원리들(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점진적 계시 개념이다)과 더불어 작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Witherington, Biblical Theology, 3 참고. George Eldon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rev. ed., ed. Donald A. Hagner (Grand Rapids, MI: Eerdmans, 1993), 27: “성경신학은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추적하 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을 예상해야 한다.” 또한 래드는 학자들이 “기본적인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기대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28). 성경신학의 방법은 “역사적 진보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단언하는 Vos, Biblical Theology, 16도 참고하라. 그 결과 “진리의 요소 사이에는 이미 여러 지점에서 체계화 과정의 시작을 식별할 수 있는 상관관계의 시작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에 선행한다. 그러나 보스의 방법에는 한 가지 큰 한계가 있는데, 그는 성경신학을 예수에서 정점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로 접근하기 때문에 바울서신, 나머지 신약 편지, 요한계시록을 다루지 않아서 그의 설명이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51) D. A. Carson, “The Role of Exegesis in Systematic Theology,” in Doing Theology in Today’s World: Essays in Honor of Kenneth S. Kantzer, ed. John D. Woodbridge and Thomas E. McComiske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4), 66. 마찬가지로, idem, “Bible and Theology,” 2634.
52) 예를 들어,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3rd ed. (Grand Rapids, MI: Baker, 2013);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2nd e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20) 참고.
체 정경의 증언을 의식적으로 고려함으로써……무책임한 선택을 막아 주해를 끌고 가는 데 도
움이 되는 교육적 기능도 가장 잘 수행한다.53)
이런 “신학적으로 통제가 잘 된 주석”은 과거에 대한 통찰에서 유익을 얻고 최신 신학적 경향에 굴
복하지 않을 수 있다.54) 사실, 앞서 언급했듯이 주해와 조직신학 사이에는 “주해가 조직신학을 형성
하고……조직신학이 주해를 형성하는” 쌍방향 관계가 존재한다.55)
그럼에도 카슨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조직신학에 참여할 때 “우리 삶에서 성경의 권위를 저버리는
교묘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방법 하나는 “조직신학의 범주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길
들이도록 허용하는 것”이다.56) 주해, 성경신학, 심지어 조직신학이 아닌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로 남아 있어야 한다( 종교개혁의 원리인 오직 성경, 즉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모든 문제에서 기독교 성경만
이 최종 권위라는 원칙 ). 결국, 우리는 개별 구절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그 구절들 사이의 여러 점을 연결 하는 방식( 성경신학 ), 더 나아가 우리의 더 큰 전체 신학 체계까지 항상 성경 자체에 종속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학 체계는 사실상 성경의 역할을 빼앗아 본래 성경만을
위해 마련된 우리의 일차적 참고 및 권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구분하는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성경신학은 주로 신학적 연결 ( 성경 본문을
문학적, 본문 상호적으로 연결할 뿐 아니라 역사적 흐름을 따라 연결 ) 에 대한 것이고 조직신학은 주로 신학적 구성 ( 성 경 자료를 주제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성 ) 에 대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성경신학에서도 어느 정 도의 배열과 조직은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신학은 특정 성경 책이나 저자의 신학을 해당 성 경( 구약 또는 신약 )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경 전체의 다른 책의 신학과 연관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우
리는 정경에 포함된 다양한 성경 문헌에서 전체적으로 상호 연결된 신학적 관계의 그물망이 드러나
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조직신학은 주어진 교리를 보다 추상적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구성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 진다. 삼위일체 교리를 예로 들어 보겠다.57)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가르
치지 않지만(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오늘날 이 교리가 정의되는 바와 같이 정확한 의미는 반드시 아니지만 ‘트리니타스’[trinitas] 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라틴 저술가였다 ),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성부 ), 예 수( 성자 ), 성령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정당하게 신학적으로 구성한 결과물이다. 처음에는 성경 기록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흐름을 따라 ( 먼저 구약에서, 다음에는 신약에서 ) 이 가르침을 수집할 수 있
53) D. A. Carson, “Subtle Ways to Abandon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Our Lives,” Themelios 42, no. 1 (January 2017): 8.
54) Carson, “Subtle Ways,” 8.
55) Carson, “Subtle Ways,” 8.
56) Carson, “Subtle Ways,” 8-9에서 다섯 번째 요점.
57) 다른 예로는 아들의 영원한 세대(“독생자”), 전가 교리(예수의 완전한 삶과 순종의 유익이 신자에게 돌아감) 또는 성 화 교리 등이 있다. 각각의 경우에 성경신학은 주어진 가르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계시된 과정을 추적하 면서 원래의 역사적 노선을 따라 진행하는 반면, 조직신학은 무시간적, 논리적 방향에서 교리의 틀을 구성한다.
지만, 결국에는 연결이 구성으로 이어지면서, 무시간적, 논리적, 체계적으로 정리된 삼위일체 교리가 태어난다.
삼위일체 교리의 체계적 정립이 잘못되었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사람은 아
무도 없다. 이 교리를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 있다. 동시에, 이런 무시간적 설명은 성경 본문 자체에 충분히 근거를 두고 역사적 흐름( 성경신학의 공헌 ) 을 따라 연구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신학은 성경학자들과 ( 조직신학 ) 신학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적용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58) 이 협력 모델은 역사신학(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연구 ) 과 기독교 철학( 우리 가 어떻게 앎에 이르는지에 대한 과학인 인식론 등의 문제를 다룸 ) 같은 다른 분야로 더 확장될 수 있다.
D. A. 카슨은 그레이엄 콜( Graham Cole ) 의 연구를 인용하여 성경적 탐구와 신학적 탐구의 네 가지
단계를 구분한다.59)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을 역사적 맥락과 문학적 특징( 장르 포함 ) 측면에서 주해하
는 것으로, 가능한 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경신학의 전체 범
위 내에서 주어진 본문을 해석하여 성경의 메타내러티브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세 번째
는 성경의 다른 주요 신학적 주제와 함께 주어진 본문의 신학 구조를 이해하려는 탐구다. 네 번째는
성경 기록에서 도출된 모든 가르침을 해석자의 더 큰 해석학적 제안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전통적으 로 해석자들은 주로 1단계와 2단계에서 활동해 왔지만, 최근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3단계와 4단계에서 작업한다.60) 최고의 성경신학 작업은 4단계( 또는 적어도 첫 세 단계 ) 모두에서 작동 하지만, 성경신학자들은 3, 4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1, 2단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학자들
은 2단계나 심지어 3단계에서 멈춰서도 안 된다. 따라서 콜의 모델은 주어진 접근법의 강점과 약점 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동시에 성경신학을 신중하게 정의하고 성경신학과 조직신 학을 적절하게 구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61)
58) 성경신학자와 조직신학자 사이의 이런 학제 간 협력의 예는 Andreas J. Köstenberger and Scott R. Swain, Father, Son,andSpirit:TheTrinityandJohn’sGospel, NSBT 24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8, 『NSB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부흥과개혁사 역간, 2016); Gregg R. Allison and Andreas J. Köstenberger, The Holy Spirit, Theology for the People of God (Nashville: B&H Academic, 2020, 『성경신학적·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본 성령』, 부흥과개혁사 역간, 2023)을 참고하라. 후자는 성경의 모든 주요 교리에 대한 성경신학자와 조직신학자의 공동 연구를 특징으로 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
59) D. A. Carson,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Scripture: Yes, But……,” in Theological Commentary:Evangelical Perspectives, ed. R. Michael Allen (London: T&T Clark, 2011), 206-207.
60) 자세한 것은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라.
61) Andreas J. Köstenberger, “The Present and Future of Biblical Theology,” Themelios 37, no. 3 (2012): 445464; SwJT 56, no. 1(2013): 3-24에 실렸던 같은 제목의 이전 글을 참고하라.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지속적인 구 별을 촉구함으로써 우리는 조직신학의 지속적인 생존 능력을 다투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존 칼빈 의 연구를 분석하고 신학과 주석의 학문적 공생을 촉구하는 R. Michael Allen and Scott R. Swain, “In Defense of Proof-Texting,” JETS 54 (2011): 589-606을 참고하라. 그러나 우리는 조직신학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저자들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위에서 인용한 카슨의 글인 “Systematic Theology and Biblical Theology,” in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에 대해 그들이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1.1.2 성경신학과 신학적 성경 해석(TIS)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적 성경 해석( TIS=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Scripture ) 으로 알려진 최근의 한 가지
신학적 노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위에서 설명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중 조직신학은 종합적
인 작업이 성경신학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서 더 포괄적인 과제다. 이런 신학화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훨씬 광범위한 자원을 활용하는데, 그중 하나는 성경신학과 그 결과물이다. 전반적으로 최근의
TIS 옹호자들은 또 다른 전문적 신학 분야를 추가하기보다는 보다 총체적인 것을 추구하고 다양한
학문 간의 구분을 회복하려고 시도한다.62) 그럼에도 방법론적 수준에서 TIS는 더 연역적이 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성경신학은 더 귀납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IS는 조직신학에서 파생된 광범
위한 범주를 사용하여 성경신학의 그림을 그리는 반면, 성경신학은 성경 자료 자체에서 발견되는 구
체적인 관찰을 통해 작업한다.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에서 보듯이, 성경신학과 TIS는 각각 정
당한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다. 기독교 신자들
은 하나님의 인격, 행동, 동기를 이해하고 이것이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무
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 어쨌든 그것이 이상이다. 즉,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
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이 성경 자체가 요청하는 독자
의 역할에 속한다.63) 성경을 읽는 일은 단순히 기술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독자
의 도덕적 성품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성경을 그 의도대로 사용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독
자에게 주신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의 도덕적 성품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맥
락에서 TIS의 실천가들은 계몽주의 이후 신학의 분열로 인해 신학이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등의 이름 아래 각각 고유한 목표, 가치, 작동 규칙을 가진 일련의 개별 학문으로 나뉘게
되었다고 이해한다.64)
이런 야심찬 통합 의제에 따라 교리와 윤리 교육을 위해 교회에 제공된 신학 자료로서 정경의 책 순서를 포함한 성경 정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요한 문헌의 통합 기능은 복음 서, 서신서, 묵시록 등 여러 장르에 속하는 문학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구성 요소들이 함께 배치되어 있지 않고 신약 정경 전체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이 주 목되었다.65)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전문가들은 서로 대화하고 심지어 협력하기 시작했다. “두 지
62) Murray Rae, “Theological Interpretation and the Problem of Method,” in Ears That Hear: Explorations in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ed. Joel B. Green and Tim Meadowcroft (Sheffield, UK: Sheffield Phoenix, 2013), 25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63) Richard S. Briggs, The Virtuous Reader: Old Testament Narrative and Interpretive Virtue, Studies in Theolog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0) 참고. 브릭스의 목표는 구약 성경 본문에 내포된 독자의 미덕을 탐구하는 것이다. 성경은 어떤 독자를 원할까? 브릭스는 다양한 본문에서 명시적이거나 암시적 으로 드러나는 특정한 해석적 미덕, 즉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과 관련된 도덕적 미덕에 대한 일련의 사례 연구를 제공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Köstenberger with Patterson, Invita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66에서 해석적 미덕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라.
64) Stephen E. Fowl, Engaging Scripture: A Model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Challenges in Contemporary Theology (Oxford: Blackwell, 1998), 13-21에서 제공한 논의를 참고하라.
65) 이에 대해서는 Bockmuehl, Seeing the Word, 109에서 간략하게 언급한다.
평 주석”( Two Horizons Commentary ) 시리즈는 이런 화해의 한 예로서, 성경 본문을 신학적 관심사와 긴
밀하게 대화하면서 섹션별로 주해를 제공함으로써 성경학과 조직신학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자 한다.66)
성경신학 책을 집필하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 배우려고 노력했으며, 따라서 본서는 성경 자
료의 정경적 구조( 예. 오경과 사복음서 같은 정경 묶음들 ) 및 책 순서( 예. 헬라어 정경에서, 사사기–룻기 또는 예레미야–예 레미야애가 ) 를 조율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신학에서 정당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종합 과정에 참여
하고, 이는 성경 여러 책의 여러 신학이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양립할 수 있고 서로를 풍요
롭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책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경 전체에서 공
통된 신학 주제를 기록하고 추적한다. 신구약 성경의 책별 연구에서 우리는 신학적 주제뿐 아니라
그 윤리적 가르침도 탐구한다. 성경신학은 윤리의 영역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은 제기되지 않고 답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엇이 신학적 성경 해석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유용한 논의는 케빈 밴후저가 쓴 『신학적 성
경 해석 사전』 서문에 나와 있다.67) 물론, 성경 주해를 제약하기 위해 성경에 신학 체계나 신앙고백
적 요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
문의 신학적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신학에 의존해야 하며, “역사적, 문학적, 사회학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해석은 궁극적으로 본문의 주제를 정의할 수 없다.”68) 물론 많은 것은 TIS의 전문가들이 “신 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신학적 해석”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신학”은
해석자 자신의 신학과 해석 대상 텍스트에 표현된 신학이 혼재되어 있다. 이런 경우 TIS는 성경신학 을 본질적으로 성경 본문과 궁극적으로 성경 정경 전체에 표현된 성경 저자들의 신학을 이해하려는 탐구로 이해하는 이 글에서 주장하는 접근 방식을 뛰어넘는다.
66) 예를 들어, Ernest C. Lucas, Proverbs, THOTC(Grand Rapids, MI: Eerdmans, 2015); Stephen E. Fowl, Philippians, THNTC(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등이 그 예다. 또 다른 예로, Journal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Supplement 시리즈가 있다. 이 시리즈에는 성경연구와 역사신학을 결합한 여러 권이 포함되어 있 다. 예를 들어, Thomas Holsinger-Friesen, Irenaeus and Genesis: A Study of Competition in Early Christian Hermeneutics, JTISup 1(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9); Seth B. Tarrer, Reading with the Faithful: Interpretation of True and False Prophecy in the Book of Jeremiah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JTISup 6(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3)을 참고하라. 성경의 신학적 해석의 또 다른 예는 Gerald Bray, God Is Love: A Biblical and Systematic Theology(Wheaton, IL: Crossway, 2012)으로 제럴드 브레이가 자신이 하고 있 는 일을 정확히 그런 용어로 설명하고자 하는지와 상관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 교리를 따뜻한 마음으 로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이 매력적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 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부제에 걸맞게 각주에는 거의 예외 없이 성경 인용문만 등장한다. 브레이는 모든 신 학 전문 용어를 피하고 간단하고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 책의 또 다른 뛰어난 특징은 결혼, 스포츠, 정치에 대 한 기독교인의 태도를 포함하여 논의의 적절한 지점에서 신학적 및 실천적 윤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교리를 다룰 때 에도 브레이의 논의는 본격적으로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논의할 때 그는 실패 경험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기도의 위치와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혼은 했지만 배우자에게
67) Kevin J. Vanhoozer, “What Is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n Dictionary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ed. Kevin J. Vanhoozer, Craig G. Bartholomew, Daniel J. Treier, and N. T. Wright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5), 19-27.
68) Vanhoozer, Dictionary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18.
최종 분석 결과는 성경은 교회에 속하며 신자를 위해 쓰인 것이지 학계를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학문적 도발( 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하다 ) 을 무시하거나 학자들이 성경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 도구가 그들이
해명하고자 하는 본문에 적합하다면 ).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성경의 주된 목적은 종교사나 기타 여러 환원주
의적 또는 심지어 무신론적 프로젝트의 집필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믿음과 행동을 인
도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69) 현재 실행되고 있는 TIS에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
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 등 함정이 있다(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는 성경신학 전문
가도 마찬가지다 ) 70) 사실 현재의 다양한 접근 방식은 거의 모든 성경연구 또는 신학 연구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TIS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것
은 “하나의 해석학적 접근 방식 군 ( 群 ) ”이다.71) 우리는 현재 TIS 운동에서 사용되는 모든 방법을 승
인하지도 옹호하지도 않는다.72)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 받은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해 고등 관점을
가진 믿는 학자로서 우리는 TIS의 정당한 관심사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책임 있는 성경학자들
과 조직신학자들이 상당한 기간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해 온 방식과 결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분
별력 있는 적용은 교회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73)
1.1.3 성경신학과 해석학
이제 성경신학과 해석학 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살펴보겠다. 성경신학은 해석학을 전제로 하지만, 성경 해석학 자체는 성경의 본질( 존재론 ) 에 타당한 근거를 두고 있다.74)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것( ‘데오프뉴스토스’, 딤후 3:16 ) 이며 하나님 영감의 산물( 벧후 1:20-21 ) 이라고 주장한다.75)
69) Adolf Schlatter의 에세이, “Atheistic Methods in Theology,” trans. David R. Bauer, Asbury Theological Journal 51, no. 2 (1996): 45-57 참고. 그는 당시 독일에서 “‘신학’에 대한 깊은 의심과 격렬한 항의”가 있었음을 개탄하며 그런 취급에서 “윤리가 잊혀졌다”라고 지적한다.
70) Gregg R. Allison, “The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Scripture: An Introduction and Preliminary Evaluation,” SBJT 14, no. 2 (2010): 28-36, 특히 32-33.
71) Allison, “Theological Interpretation,” 30 (강조 추가).
72) Carson,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Scripture,” 187-207; idem, “New Covenant Theology and Biblical Theology,” in God’s Glory Revealed in Christ:Essays on Biblical Theology in Honor of Thomas R.Schreiner, ed. Denny Burk, James M. Hamilton Jr., and Brian Vickers (Nashville: B&H Academic, 2019), 25-27의 비평을 보라. 또한 Stanley E. Porter, “What Exactly Is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Scripture, and Is It Hermeneutically Robust Enough for the Task to Which It Has Been Appointed?,” in Horizons in Hermeneutics: A Festschrift in Honor of Anthony C. Thiselton, ed. Stanley E. Porter and Matthew R. Malcolm (Grand Rapids, MI: Eerdmans, 2013), 234-267도 참고하라(그는 논문 제목의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73) TIS의 전문가가 쓴 중요한 저작의 요약과 비평은 Andreas J. Köstenberger, “Review of Craig G. Bartholomew, Introducing Biblical Hermeneutics,” https://www.booksataglance.com/book-reviews/introducing-biblicalhermeneutics-comprehensive-framework-hearing-god-scripture-craig-g-bartholomew를 참고하라. 이상하 게도 앞서 언급했듯이 바살러뮤의 역사에 대한 장(10장)은 특히 설득력이 크지만, 신학에 대한 장(12장)은 다소 부족 하다(주로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론은 소홀히 한다).
74) 이 단락과 다음 단락의 일부 생각과 참고문헌은 Samuel G. Parkison, “Divine Revelation’s Creaturely Corollary: Illumination as the Christ-Adoring Bridge between Systematics and Hermeneutics” (PhD seminar paper,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18)에 빚을 졌다.
75) D. A. Carson, “Approaching the Bible,” in D. A. Carson, Collected Writings on Scripture, comp. Andrew David Naselli (Wheaton, IL: Crossway, 2010), 19–54; Andreas J. Kö stenberger, L. Scott Kellum, and
스콧 스웨인은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최고의 문학적 표현이다”라고 단
언한다.76) 성경 영감의 관점에서 에카르트 슈나벨은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또는 “문학적”을 덧붙일 수 있 을 것이다 ) 측면에만 관심을 갖는 “무신론적” 해석 방법이라기보다는 “성스러운 해석학”( hermeneutica
sacra ) 을 요구한다고 올바르게 관찰한다.77) 또한 저자의 의도는 결코 인간 저자의 의도라는 관점에 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신적 의도가 전체적인 정경적, 주제적, 메타내러티브적 틀을 제공하는 신
적 저자-인간적 저자라는 이중 저자( dual authorship ) 의 궤도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78)
궁극적인 분석에서 성경의 통일성은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런 근본적인 통일성에 기초하여 성경의 명백한 다양성은 신성한 계시가 일어난 역사적 시간 간격,
다양한 문학적 장르, 개별 성경 저자의 개인적인 표현 방식( 어휘와 문체 등 ), 다양한 상황과 기타 요인에
따라 각 저술에서 선택된 강조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79) 아버지는 창조주며 자신을 계
시하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리스도는 성경 계시의 주체이자 ‘텔로스’( 궁극적 기준점 ) 며, 모든 성경은
그를 지향하고 그 안에서 그 성취를 발견한다.80) 성령은 영감의 주체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영감
받은 계시에 해당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에 의한 해석이다.81) 따라서 성령의 역할은 성경의 기록과 해석에서도 매우 중요하다.82)
Charles L. Quarles, The Cradle, the Cross, and the C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2nd ed. (Nashville: B&H Academic, 2016), ch. 1; D. A. Carson, ed., The Enduring Authority of the Christian Scriptures (Grand Rapids, MI: Eerdmans, 2016); Wayne A. Grudem, “Scripture’s Self-Attestation and the Problem of Formulating a Doctrine of Scripture,” in Scripture and Truth, ed. D. A. Carson and John Woodbridge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3), 19–59 참고.
76) Scott R. Swain, Trinity,Revelation,and Reading: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ible and Its Interpretation (New York: T&T Clark, 2011), 8.
77) Eckhard J. Schnabel, “Scripture,” in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41. 참고. Schlatter, “Atheistic Methods in Theology”; 또한 Robert W. Yarbrough, “Adolf Schlatter’s ‘The Significance of Method for Theological Work’: Translation and Commentary,” SBJT 1, no. 2 (1997): 64–76; James Eglinton and Michael Brä utigam, “Scientific Theology? Herman Bavinck and Adolf Schlatter on the Place of Theology in the University,”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7, no.1 (2013): 27–50도 보라.
78) 성경 영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Swain, Trinity,Revelation,and Reading, 67; Michael W. Goheen and Michael D. Williams, “Doctrine of Scripture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in A Manifesto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ed. Craig G. Bartholomew and Heath A. Thoma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6), 72–93을 보 라. 성경 정경에 대해서는 Stephen G. Dempster, “The Canon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in Bartholomew and Thomas, Manifesto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131–148; Michael J. Kruger, The Question of Canon: Challenging the Status Quo in the New Testament Debat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3)를 보 라.
79) 장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Kevin J. Vanhoozer, “The Semantics of Biblical Literature: Truth and Scripture’s Diverse Literary Forms,” in Hermeneutics, Authority, and Canon, ed. D. A. Carson and John D. Woodbridge (Grand Rapids, MI: Baker, 1995), 49–104를 보라.
80) 특히 눅 24:25-27, 44-48을 보라. 마 5:17; 요 5:45-47; 롬 10:4; 히 1:1-2도 보라. 참고. Graham Cole, The God Who Became Human: A Biblical Theology of Incarnati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3); Thomas R. Schreiner, The King in His Beauty: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3, 『성경신학』, 부흥과개혁사 역간, 2016); Vos, Biblical Theology
81) 이것은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ed. John Bolt, trans. John Vriend (Grand Rapids, MI: Baker, 2003), 350을 인용한 Parkison, “Divine Revelation’s Creaturely Corollary”의 주요 논지다.
82) 참고. 고전 2:11-16. Köstenberger with Patterson, Invita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55에서 중생하고, 성 령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해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보라. 해석에서 믿음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는 Gerhard Maier, Biblical Hermeneutics, trans. Robert W. Yarbrough (Wheaton, IL: Crossway, 1995), ch. 11; Robert W. Yarbrough, Clash of Visions: Populism and Elitism in New Testament Theology, Reformed
그러나 성경신학은 단순한 성령 충만한 해석 그 이상이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계시의
상이한 가닥들 사이에 존재하는 점들을 연결하는 것을 포함한다.83) 그렇다면 그 가닥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상호 텍스트성을 이용하는 것이다.84) 후대의 성경 저자
가 의도적으로 인용한 선행 본문을 식별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고 정당한 일이지만, 상호본문적 접근
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빈번한 경향은 각각의 역사적 배경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상호 텍스트성은 본문의 자율성, 즉 해석이 관련되는 한 본문이 전부라는 개념을 긍정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해체주의자, 포스트모더니스트, 구조주의자, 주어진 본문( 또는 일련의 본문 ) 의 근거를 역사에
충분히 두고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의 실천가들에 의해서도 실행될 수 있다.85) 그러나 본문은 그 자체
가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비롯한 모든 본문의 해석자는 본문의 세 번째 중요한 차원인 신
학을 염두에 두는 것 외에도 해석 과정 내내 본문과 역사라는 두 가지 해석적 실재를 함께 유지해야 한다. 이는 성경신학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다양한 주제를 탐
구할 때 주어진 성경 본문을 역사, 문학, 신학의 트라이어드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이 좋다.86)
또한 보스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셈어 의미에서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사랑하다”, “사랑 안에서 골라내다”를 의미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킨다.87)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사랑이다.88) 따라서
구약 계시의 중추는 학교가 아니라 일련의 언약이다.89) 또한 보스는 “종교에서 인간의 죄악 된 마음 은……독립적이고 우월한 권위의 주장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합리주의적이고 비평적인
학문에 대한 중요한 비판에 참여한다.90) 그러므로 자세히 살펴보면, 합리주의의 “전통에 대한 항의
Exegetical Doctrine Studies (Fearn, Ross-shire, UK: Christian Focus, 2019)를 보라. 83) 신학은 ‘아 데오 도케투르, 데움 도케트, 아드 데움 두키트’(a Deo docetur, Deum docet, ad Deum ducit, “하나님 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며, 하나님에게로 이끈다”)는 믿음을 옹호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한 Vos, Biblical Theology, v, 18을 참고하라. 보스는 성경신학의 과제는 “특별계시의 진리의……유기적 성장”을 추적하 는 것이라고 믿었다(v-vi). 보스는 이를 위해 성경의 역사를 모세 시대와 선지자 시대의 두 시대로 나누었다. 84)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용어는 불가리아계 프랑스 사상가이자 작가인 쥘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만든 용어 다. 최근에는 리처드 헤이스 같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연구에 상호 텍스트적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책 전체, 특히 복음서를 다룬 8장에서 헤이스와의 광범위한 상호 작용을 살펴보라.
85) 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 독자 반응 비평, 해체주의에 대한 논의는 Osborne, Hermeneutical Spiral, 465-499의 부 록 1을 참고하라.
86) Kö stenberger with Patterson, Invita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참고. 또한 Brian S. Rosner, “Biblical Theology,” in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3: “성경신학은 주로 성경 전체의 전반적인 메시지와 관련 있 다. 그것은 전체와 관련하여 부분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모음집의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차원의 상호 작 용과 성경 전체 정경 내에서 이들 간의 상호 관계를 연구해야 한다”(강조 추가).
87) Vos, Biblical Theology, 8. 같은 전제가 Andreas J. Köstenberger with Richard D. Patterson, For the Love of God’s Word: An Introduc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MI: Kregel, 2015, 『성경해석학 개론』, 부흥과개혁사 역간, 2017)에도 놓여 있다. 또한 David K. Clark, To Know and Love God: Method for Theology, Foundations of Evangelical Theology (Wheaton, IL: Crossway, 2003), xxix에서 “신학은 단연코 하나님에 대한 진 리이지만”, “결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정보를 표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강조 원문)라고 지적하는 것을 참고하 라. 신학에는 과학적 측면 외에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지각적이고 영적인 차원도 있다(xxix).
88) Vos, Biblical Theology, 8-9.
89) Vos, Biblical Theology, 8.
90) Vos, Biblical Theology, 10.
는 전통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한 항의다.”91) 보스는 진화론과 실증주의를 비난하면서 “역사적으로
진리를 추구”하지만 “근본적인 경건의 결여”로 인해 “스스로를 신학이라고 부를 권리를 잃었다”라 고 덧붙인다.92) 문제는 이성적 능력 행사가 아니라 계시에 대한 불경건과 반역, 궁극적으로는 하나
님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에 일차적 관심을 갖는 성경신학은 근본적인 수
준에서 성경이 갖는 신적 권위, 영감, 완전성을 존중하는 해석학에 기초해야 한다.93) 무엇보다도 성
경 해석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명령에 기초한 “사랑의 해석학”을 실천해야
한다.94)
1.2 성경신학의 실천
그렇다면 성경신학을 성경 및 성경 저자들의 신학으로서 그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뿐 아니라 지
극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이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일련의 후속 질문을 제기한다. 성경 저
자들의 신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경신학에 참여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
인가? 성경 저자들의 신학을 확인하는 것이 도대체 현실적인 목표일까? 이런 질문은 타당하고 중요 하다. 성경 해석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자들이 해석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특정 성경 저자의 신학에 대한 명확한 이 해에 도달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적절한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해석 자가 본문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인식하고 다른 해석자로부터 기꺼이 배우려는 의지가
91) Vos, Biblical Theology, 10.
92) Vos, Biblical Theology, 10-11.
93) Vos, Biblical Theology, 11-13에서 확언한 세 가지 기본 원칙인 유신론, 계시, 전적 영감 및 “성경은 하나님의 성 품과 역사에 대한 점진적 계시의 책”이라고 쓴 Witherington, Biblical Theology, 5 참고. 또한 성경신학자들은 “계 시에 대한 복음의 주장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Stuhlmacher, Biblical Theology, 13을 참고하라. 슈툴마 허는 역사비평적 방법이 본문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현재 확립된 유일한 방법”이라고 긍정하면서도 “신약 성경 은 예수의 선교와 사역, 죽음에서의 부활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증명한다”(12, 강조 원문)라고 말한다. 동 시에 슈툴마허는 성경에 오류와 모순이 있다고 믿는다. Andreas J. Köstenberger, “Diversity and Unity in the New Testament,” in Biblical Theology: Retrospect and Prospect, ed. Scott J. Hafeman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2), 144에서 지적했듯이, 슈툴마허는 “성경은 단순히 서로를 보완할 뿐 아니라 서로 모순되 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라고 믿는다(“Der Kanon und seine Auslegung,” in Jesus Christus als die Mitte der Schrift: Studien zur Hermeneutik des Evangeliums, ed. Christof Landmesser et al., BZNW 86 [Berlin: de Gruyter, 1997], 287: “서로 보완할 뿐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다양한 목소리”[vielfältige Stimmen, … die sich nicht nur gegenseitig ergänzen, sondern auch widersprechen]). 슈툴마허의 연구에 대한 철저한 요약과 비평은 Andreas J. Köstenberger, “Review of Peter Stuhlmacher, Biblical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https:// www.booksataglance.com/book-reviews/andreas-kostenbergers-review-of-biblical-theology-of-the-newtestament-by-peter-stuhlmacher을 보라.
94) N. T. Wright와 Michael F. Bird, The New Testament in Its World: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Literature, and Theology of the First Christians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9), 73, n. 43에 인용된 Augustine, De doctrina christiana 1.36. 라이트와 버드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과 본문들을 공감적이면서도 탐구적인 자세로 귀속시키며”, 그 과정에서 “연인[즉, 성경 해석자]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실재와 타자성을 긍정 한다”라는 것이다(“비평적 사실주의”로 알려진 모델[73]). 또한 이런 성경신학의 맥락에서 “사랑의 해석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및 그에 대한 보답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열망을 성경 이야기의 핵심 주제로 조명할 것이다.
있는 한, 해석자의 전제들이 반드시 결과를 약화시키지는 않을지라도 말이다.
에드워드 헤렐코는 다소 간과되는 주제인 성경신학에서 전제의 역할에 대한 박사 학위 논문을 썼다.95) 특히 그는 제임스 D. G. 던과 토머스 R. 슈라이너의 바울 신학을 구체적으로 비교했다.96)
이 두 학자는 모두 성경신학에 종사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들은 성경신학의 본질과 목표에 대해 위에서 논
의한 것과 같은 본질적인 정의를 공유하고 있다 ), 각자의 저작을 살펴보면 바울 신학을 다소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이 사례 연구가 보여 주는 것은 모든 해석자가 성경신학의 실천에 임할 때, 작업 결과에 부단
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전제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이다. 던과 슈라이너의 바울 신학의 경우, 그런 전제에는 성경에 대한 관점, 서론적 문제들에 대한 견해, 역사 사용 등이 포함된다. 슈라이너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그에게 돌려진 13통의 편지를 모두 썼다고 믿는 무오성( inerrancy ) 옹호자다.
던은 무오성을 긍정하지 않고 바울이 7통의 편지만 저술했다고 주장한다.97) 누군가가 로마서, 고린
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및 기타 몇 개의 편지만을 근거로 바울 신학을 집필한다면 그의 설명은 13통
의 편지 전체를 근거로 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던과 슈라이너는 바
울서신을 해석할 때 1세기 유대교의 배경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던은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 New Perspective on Paul ) 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인 반면 슈라이너는 기본적으로 개
혁신학적 관점을 고수한다.98)
그렇다면 성경신학에 참여하면서 전제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특
정 성경 저자의 신학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을 피할 수 없는 현
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여러 전제 또는 일부에서 말하는 선이해( preunderstanding, Vorverständnis ) 가 반드시 문제 되는 것은 아니며, 극복할 수 없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99) 성경에 대 한 높은 견해와 신약 성경이 바울에게 돌리는 편지의 바울 저작에 대한 믿음 같은 전제들이 바탕이
된다면 그런 전제는 성경신학 작업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성경 해석의 올바른 원칙을 따르고 상호 대화와 비평을 통해, 특히 성경 저자의 원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음주 의 해석학의 맥락에서 우리는 바울 신학과 다른 성경 저자의 신학에 대한 타당한 그림에 도달할 수
95) Edward J. Herrelko III, “The Role of Presupposi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Process of Biblical Theology: A Case Study of the Pauline Theologies of James Dunn and Thomas Schreiner” (PhD diss.,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16).
96) James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MI: Eerdmans, 1997); Thomas R. Schreiner, Paul, Apostle of God’s Glory in Christ: A Pauline Theology, 2nd e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20).
97) 이와 유사하게, Stuhlmacher, Biblical Theology, 253 등 여러 곳에서는 목회서신(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에베소서, (잠정적으로)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제2 바울서신(즉, 바울이 쓴 것이 아닌)으로 분류한다.
98) 이 두 학자의 많은 출판물 중에서 예를 들어 James D. G. Dunn, The New Perspective on Paul, rev. ed. (Grand Rapids, MI: Eerdmans, 2007); Thomas R. Schreiner, Romans, 2nd ed., BECNT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8, 『BECNT 로마서』, 부흥과개혁사 역간, 2012)을 참고하라.
99) Hans-Georg Gadamer, Truth and Method, ed. Garrett Barden and John Cumming (New York: Continuum, 1975; 독일어 원서: Wahrheit und Methode [1960])는 독일어 단어 ‘포어우어타일’(Vorurteil)을 재조명하고자 했는 데, 이 단어는 경멸적인 의미(“편견”[bias])를 담고 있지만, 가다머는 “선판단”(prejudgment)이라는 의미로 더 중립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100)
이 외에도 성경신학은 단순한 학문 활동 이상이며 교회와 상당한 실제적 관련성을 갖는다.101) 성 경신학은 설교자와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생에게 큰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가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신중하게 정의하고 실행할 가치가 있다.102) 게르하르두스 보스는 성경
신학의 실제적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보스는 성경신학이 계시의 유기적 전개를 보여 줌으
로써 “초자연주의의 실재에 대한 설계에서의 특별한 논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관찰한다.103) 또한
성경신학은 “이성주의의 비판에 맞서는 유용한 해독제도 제공한다.”104) “성경은 교리적인 안내서가
아니라 극적인 흥미로 가득한 역사적 책이라는 사실에 비추어……성경신학은 진리를 원래의 역사
적 배경에서 우리에게 보여 줌으로써 진리에 새로운 생명과 신선함을 부여한다.”105) 성경신학은 또
한 우리 신앙의 “교리적 토대”의 필수 불가결한 성격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새로
운 사상의 세계를 공급하기 위해” 큰 관심을 기울이셨다.106) 우리는 성경신학에 참여함으로써 고립 된 증거 본문을 넘어 유기적인 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107) 성경신학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
광이기 때문에, 성경신학은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 접근 및 인간과의 교제와 관련
하여 하나님 본성의 특정한 측면을 보여 주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108) 마찬가지로 찰스
스코비도 “성경신학은 교회의 삶과 무관하게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109) 제대로 이해
하면, 성경신학은 “성경의 역사적 연구와 교회가 성경을 권위 있는 경전으로 사용하는 것 사이의 중 간적 위치에 서 있는 가교 학문이다.”110) “성경의 역사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지만……단순히 성경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성경신학은 또한 정경 전체로서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따라서 성경 해석의 과정과 분리할 수 없다.”111)
100) 예를 들어, Andreas J. Kö stenberger, A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The Word, the Christ, the Son of God, BTNT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9, 『BTNT 요한신학』, 부흥과개혁사 역간, 2015); idem, Commentary on 1–2 Timothy and Titus, EBTC (Bellingham, WA: Lexham, 2020); Andreas J. Köstenberger and Margaret E. Köstenberger, God’s Design for Man and Woman: A Biblical-Theological Survey (Wheaton, IL: Crossway, 2014); Allison and Köstenberger, Holy Spirit; Andreas J. Köstenberger with T. Desmond Alexander,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NSBT 53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20) 참고. 101) 예를 들어, Michael Lawrence, Biblical Theology in the Life of the Church: A Guide for Ministry (Wheaton, IL: Crossway, 2010, 『교회를 위한 성경신학』, 부흥과개혁사 역간, 2011) 참고. 또한 Stuhlmacher, BiblicalTheology, 13 에서 성경신학은 (1) 역사적으로 적절해야 하고, (2) 계시에 열려 있어야 하며, (3) 교회의 신앙과 관련되어야 하고, (4) 합리적으로 투명하고 통제 가능해야 한다는 네 가지 방법론적 필수 조건을 제시하고 성경 주석과 교리뿐 아니라 “교회의 삶에 참여”(789)하라는 요청으로 끝맺음 하는 것을 참고하라.
102) 성경신학적 종합을 다루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이 주제로 돌아올 것이다.
103) Vos, BiblicalTheology, 17.
104) Vos, BiblicalTheology, 17.
105) Vos, BiblicalTheology, 17.
106) Vos, BiblicalTheology, 17.
107) Vos, BiblicalTheology, 17-18.
108) Vos, BiblicalTheology, 18.
109) Scobie, WaysofOurGod, 8.
110) Scobie, WaysofOurGod, 8.
111) Scobie, WaysofOurGod, 8. 이 암시는 성경이 “무엇을 의미했는가”에 관심을 갖는 성경신학과 성경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조직신학(또는 교리신학)을 구분하는 Krister Stendahl, “Biblical Theology, Contemporary,”
1.2.1 성경신학의 방법
이제 우리는 성경신학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 방법에 대한 고찰로 넘어간다.112) 위의 논의에서
우리는 성경신학( biblical theology ) 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질서 있게 제시해야 하는 성경의 신
학( theology of the Bible ) 이라고 정의했고, 성경의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차원을 연구하여 저자의 의도
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석학의 트라이어드를 제안했다.113) 그렇다면 성경신학을 할 때 우
리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D. A. 카슨은 “누구나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며 이를 성경신학이라고 부른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한 적이 있다.114) 따라서 방법론에 적절한 주
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런 방법에 다음 세 가지 필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115)
첫째, 그런 방법은 역사적이어야 한다.116) 즉, 기본적으로 추상적이고 주제적인 성격의 조직신학 과는 달리 성경신학은 성경의 특정 구절을 원래의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
를
들어, 잘 알려진 구절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1 ) 를 해석할 때는 이 약속의 원래 수
신자가 누구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예언이 어느 시기에 선포된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 다른 예
IDB 1:419에 대한 것이다(참고. Scobie, WaysofOurGod, 5).
112) 참고. “The Method of Biblical Theology,” in Scobie, Ways of Our God, 46-80; “How Do We Do New Testament Theology?,” in I. Howard Marshall, New Testament Theology: Many Witnesses, One Gospel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4), 17-48.
113) 저자의 의도에는 신적 저자와 인간 저자의 의도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석학에서 신적 의도를 무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Barrett, Canon, Covenant, and Christology, 5의 다음 글을 참고하라. “복음주의자들은 영감에 대해 말로만 추켜세우지만, 본문 자체로 돌아가면 신적 저자는 정경 전체에 걸쳐 기능적으로 거의 각인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해석학은 이신론적(deistic) 하나님, 즉 본문에 영감을 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전체 본문(과 그 이야기)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신적 의도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인간적 의도를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으므로 신적 의도와 인간적 의도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신적 의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예는 해석자가 저자의 의도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고 오로지 신적 의도에만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 Vern S. Poythress, “Dispensing with Merely Human Meaning: Gains and Losses from Focusing on the Human Author, Illustrated by Zephaniah 1:2–3,” JETS 57 (2014): 481-499를 참고하라. 또한 성경의 이야기 또는 줄거리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신적 의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약간 파악하기 힘든 것 일 수 있다(참고. Barrett, Canon, Covenant, and Christology, 2: “성경의 이야기에는 한 명의 신적 저자가 있기 때문 에 그 신적 저자의 의도가 성경의 줄거리 전체에 내재되어 있다”[강조 원문]).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단어와 본문으 로 표현되는 신적/인간적 저자의 의도에 대해 말하기를 원한다.
114) Carson, “Systematic Theology and Biblical Theology,” 91.
115) Scobie, Ways of Our God, 46에서 역사 연구, 성경신학(그에게 이 용어는 본질적으로 정경에 대한 문학적 연구를 의 미함) 및 “교회의 신앙과 삶”에 초점을 맞춘 “중도 성경신학”(intermediate biblical theology)을 제안하는 것을 참고 하라. 실행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는 성경신학에 참여하는 것이 정경의 틀 안에서의 역사적, 문학적 연구뿐 아니라 성 경 가르침의 윤리적 차원에 대한 관심도 포함한다는 데 동의하고자 한다.
116) Gabler, “Oration on the Proper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Systematic Theology,” 501: “거룩한 저자들이 신성한 문제에 대해 느낀 것을 전달하는 역사적 기원을 가진 진정한 성경신학이 있다.” 참고. 그러나 John V. Fesko, “On the Antiquity of Biblical Theology,” in Tipton and Waddington, eds., Resurrection and Eschatology, 443477, 특히 445-453을 인용하는 Barrett, Canon, Covenant, and Christology, 17-20의 중요한 비평을 참고하라. Stuhlmacher, Biblical Theology, 5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신약신학은 계시에 대한 역 사적 주장과 신약 정경의 교회적 중요성 모두를 정당하게 다루어야 한다”(강조 제거). 슈툴마허는 “제1권: 신약 성 경 선포의 기원과 성격”에서 예수의 선포, 초기 교회, 바울, 바울 이후 시대, 공관복음, “요한과 그의 학파”의 여섯 부 분으로 자신의 신약신학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또한 Ladd,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20에 나오는 해그너 (Hagner)의 다음 말도 참고하라. “성경신학은 성경 책들의 메시지를 그것들의 역사적 배경에서 설명하는 학문으 로……일차적으로 기술적 학문이다.”
를 들자면, 십일조에 대한 성경신학을 연구할 때 우리는 말라기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십일조 언급을
성경의 해당 구절이 놓인 구체적인 구원사적 상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117)
둘째, 성경신학은 성경에서 다루는 개념뿐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사용한 단어, 어휘, 용어 자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성경을 귀납적으로, 그 자신의 방식대로 연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118) 예를 들어, 성경신학자는 “성화”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연구하기보다는 성경에서 그리스
도인의 성장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개별 단어, 즉 “구별하다”( ‘하기아조’ ) 또는 “자라다”( ‘아
욱사노’ ) 같은 단어를 연구할 것이다.119) 물론 핵심 단어가 없는 중에도 주제, 이슈, 개념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역으로 단어 연구에 국한하는 것이 가진 위험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사랑이
라는 주제를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오는 경우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선교”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을 수 없지만 선교라는 개념은 분명히 있다.120) 물
론 성경신학 자체에 종합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화하여 적용하기 전에 성경의 신학을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신학의 목적이다.121) 그러나
성경신학의 종합은 본질적으로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해당 가르침이 주어진 원래의 역사
적 배경의 틀 안에서 통찰 사실을 주제별로 묶는 것을 포함하지만, 조직신학은 개념적 차원에서 더
광범위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22)
셋째, 성경신학은 올바르게 개념화하면 주로 기술적 ( 記述的 )인 것이다. 즉, 성경신학에서 우리의 주 요 목표는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성경 저자의 공헌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완전히 알든 모르든 ). 우리는 성경을 잘 듣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성경 저자들 의 공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현대적 관련성
117) David A. Croteau and Andreas J. Köstenberger, “‘Will a Man Rob God?’ (Malachi 3:8): A Study of Tithing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BBR 16, no. 1 (2006): 53-77; idem, “Reconstructing a Biblical Model for Giving: A Discussion of Relevant Systematic Issues and New Testament Principles,” BBR 16, no. 2 (2006): 237-260. 118) Stuhlmacher, Biblical Theology, 3: “신약신학은 신약 성경 자체가 그 주제와 표현을 지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강 조 제거); Rosner, “Biblical Theology,” 10: “그것[성경신학]은 역사적, 문학적 감수성을 가지고 진행되며 성경의 중 요한 내러티브와 그리스도 중심적 초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및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 자체로 분석하고 종합하려고 노력한다”(강조 추가). Carson, “Current Issues in Biblical Theology,” 27-32는 성경신 학은 성경을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글 모음으로 읽고, 일관되고 합의된 정경을 전제하며, 귀납적 접근법을 활용하고, 다양한 글 모음을 연결하고, 사람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9) 성화에 대한 유용한 책으로는 David Peterson, Possessed by God: A New Testament Theology of Sanctification and Holiness, NSBT 1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1)이 있다. Marny Köstenberger, Sanctification as Set Apart and Growing in Christ by the Spirit (Wheaton, IL: Crossway, 2023, 『SSBT 성화 성경신학』, 부흥과개 혁사 역간, 2023)도 보라.
120) Andreas J. Köstenberger, The Missions of Jesus and the Disciples according to the Fourth Gospel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참고.
121) Marshall, New Testament Theology, 44: “신약 성경은 무엇보다도 1세기에 가능했던 방식 내에서 있던 사상의 표현 으로서 가능한 한 그 자체의 용어로 이해해야 한다.”
122)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의 성경신학”은 존재할 수 없다.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의 관계에 대한 성경신학적 탐구는 있을 수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진술 은 지나치게 현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방법론적 요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드레아스와 공저자인 스콧 스웨인 이 NSBT에서 자신들의 책 제목으로 『삼위일체』 대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선택하고, 부제로 “요한복음 안의 삼 위일체”가 아닌 “삼위일체와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8).
과 적용에 대해 질문할 준비가 된 것이다. 또한, 본서에서 우리는 역사적, 귀납적, 기술적 연구를 바
탕으로 다양한 구약 및 신약 성경의 윤리적 가르침을 탐구하는데, 이는 성경이 신자에게 단순히 성
경이 말하는 것을 아는 것뿐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중요한 도덕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고 믿기 때문이다( 참고. 예. 마 7:24-27; 약 1:22-25 ). 123)
1.2.2 통일성, 다양성, 단일 중심 탐구
성경신학의 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사전 질문 중 하나는 성경신학에 참여하는 올바른 방법이 하나
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합법적인 선택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성경신학에 대한
다양한 대표적 출판물을 조사한 결과 간단한 분류법이 도출되었다.124) 성경신학에 참여하는 방법에
는 본질적으로 네 가지 주요 상호 보완적인( 반드시 경쟁적인 것은 아님 ) 방법이 있다. (1) 성경의 주요 주
제에 대한 책별 조사( “고전적” 접근법 ), (2)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에 대한 조사, (3) 성경의 단일 중심을
식별하는 것, (4) 성경의 주요 줄거리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메타내러티브 접근법.125) 이런 각
접근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성경학자와 학생들은 성경의 특정 책이나 모음집의 신학을 연구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및
요한서신 ) 의 신학을 탐구하거나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신의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처음에는 한 번에 한 권 또는 하나의 모음집 단위로 특정 성경 저자의 신학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체적 강론 단위로서 해당 책의 통일성을 존중하는 미덕이 있다. 예를 들어, 바울의 신 학을 살펴볼 때, 바울이 편지를 쓰는 회중의 필요와 바울이 다루기로 선택한 문제에 따라 다양한 저
술에서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서로 다른 속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것
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126)
바울의 각 편지를 한 번에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바울의 사상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은 분명하다.127) 물론 그렇게 한 후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바울 의 사상을 일반적으로 종합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먼저 각 편지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개
별적으로 연구한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G. K. 빌이 그의 『신약성경신학』에서 사용한 용
123) Marshall, New Testament Theology, 43은 신약신학이 “기독교 신자들의 신학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라 고 올바르게 주장하고 신약신학이 애초에는 기술적이지만 “규범적 요소는 제거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한다(44).
124) Köstenberger, “Present and Future of Biblical Theology.”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안적인 분류법에 대해서는 Klink and Lockett, Understanding Biblical Theology를 참고하라. 저자들은 “보다 역사적”에서 “보다 신학적”에 이 르는 스펙트럼을 따라 성경신학을 역사적 설명(제임스 바), 구속사(D. A. 카슨), 세계관-이야기(N. T. 라이트), 정경 적 접근(브레바드 차일즈), 신학적 구성(프랜시스 왓슨)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Carson, “New Covenant Theology and Biblical Theology,” 17-31의 날카로운 비평을 참고하라.
125) 다만 (2)와 (3)은 결합할 수 있을 것이며, 단일 중심 접근법(single-center approach)은 하나의 주제가 다른 모든 주 제보다 우선시되는 중심 주제 접근법(central-themes approach)의 하위 분류로 볼 수 있다.
126) 또한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설교를 살펴볼 수도 있다. 127) Marshall, New Testament Theology, 707 참고. 마셜은 자신의 성경신학 접근 방식을 설명하면서 “각 문서의 신학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마셜은 누가복음-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의 경 우처럼 일련의 저술이 동일한 저자에게서 나온 경우에도 “각 저술이 전체 그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고 덧붙인다(707).
어를 반영하여 “고전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128) 이것은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성경신학 연구
를 생각하고 실제로 수행해 온 방식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신학을 계속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방 식이라고 믿는다.
둘째, 스콧 해프먼이나 폴 하우스 같은 일부 학자는 중심 주제 접근법을 활용했다.129) 이 학자들은 개별 성경 책의 신학을 살펴보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메시아, 구원 등과 같은 주요 주제를 확인하고 이런 주제가 점진적 성경 계시를 통합하는 방식을 추적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성경의 통일
성과 일관성을 보여 주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중심 주제의 형태로 점
들을 연결하기 전에 성경의 개별 책에 대한 신학 연구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우
리는 성경의 개별 책의 독특한 가르침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릴레이 경주의 비유가 떠오
른다. 현재의 목적에 맞게 비유를 조정하자면, 첫 번째 주자는 개별 책의 신학을 연구하는 성경신학
자고, 두 번째 주자는 여러 성경의 중심 주제를 검토하고, 세 번째 주자는 성경( 또는 바울의 저술이나 요한
의 저술 같은 모음집 ) 의 가능한 중심을 찾고, 마지막 네 번째 주자는 개별 책의 신학과 중심 주제를 성경
의 메타내러티브에 연결한다. 셋째, 일부 성경신학자는 성경의 중심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는 성배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연상시킨다.130)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시도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았
고, 애초에 그런 하나의 중심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131) 2천여 년 동안 기록되고 66권 으로 이루어진 성경에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있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성경의 모든 책이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학자 대부분은 단일 중심을 찾는 것을 당 연히 포기했다.132) 그 대신, 성경을 다양성 속의 통일성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런
128) G. K. Beale, A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The Unfolding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MI: Baker, 2011, 『신약성경신학』, 부흥과개혁사 역간, 2013), 7은 “고전적인 신약신학은……일반적으로 각 모음집의 정경 순서대로 각 신약 책에 대한 연속적인 신학적 분석을 수행한 다음……각 책의 개별적 신학적 강조점 을 최종적으로 비교한다”라고 말하며 Marshall, New Testament Theology 및 Frank S. Thielman,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A Canonical and Synthetic Approach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5)를 인용한다. 1장에서 성경신학의 쟁점에 대한 그레고리 빌의 전체 입문 논의와 2장과 6장에서 “줄거리”에 대한 그의 논의를 참고하라.
129) Scott J. Hafemann and Paul R. House, eds., CentralThemesinBiblicalTheology:MappingUnityinDiversity (Grand Rapids, MI: Baker, 2007); Scobie, Ways of Our God; the discussion in Köstenberger, “Present and Future of Biblical Theology,” 449-451도 참고하라.
130) 예를 들어, Trent A. Rogers, “Song, Psalm, and Sermon: Toward a Center of Biblical Theology,” JETS 64 (2021): 129-145; 참고. Hasel, Old Testament Theology는 여전히 유용하다. 또한 Beale,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86의 요약 논의를 참고하고, 더 넓게는 Scobie, Ways of Our God, 93-102와 Stuhlmacher, Biblical Theology, 772-791을 참고하라.
131) 참고. Carson, “New Testament Theology,” 810: “중심을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신약신학은 너무 얽혀 있어 서 어느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 우리는 신약의 모든 책에 공통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러나 광범위 하게 공통인 주제 묶음을 추적함으로써 더 나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드레아스도 Hafemann, Biblical Theology, 154에 실린 자기 에세이 “신약의 다양성과 통일성”에서 “신약의 단일 중심을 찾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자세한 논의는 아래를 참고하라.
132) 최근 수십 년 동안 몇 안 되는 예외 중 하나는 James M. Hamilton Jr., God’s Glory in Salvation through Judgment: A Biblical Theology (Wheaton, IL: Crossway, 2010)인데, 해밀턴은 이 접근법을 다소 엄격하게 실천하고 있다(그리 고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다: 참고. idem, “The Definition, Structure, and Center of Biblical Theology,” MJT 20, no. 1 [2021]: 1-18). Köstenberger, “Present and Future of Biblical Theology,” 452–455의 논의와 평가 및 Gentry and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20-21의 비평을 참고하라. 젠트리와 웰럼이 관찰한 대로, “[성경신학의
다양성 가운데 네 복음서 기자 같은 다양한 저자들은 각자의 개인적 관점과 주어진 청중에게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특정 측면을 강조한다.133) 그러므로 하나의 중심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포함한 성경의 여러 통합적인 주제를 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134)
단일 중심 성경신학의 한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분명히 존
재한다. 예를 들어 창조/새 창조 주제가 있다. 창세기의 시작은 요한계시록의 끝과 상응한다.135) 바
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고후 5:17 ) 이며 할례나 무할례도 중요하지 않
고 중요한 것은 새 창조( 갈 6:15 ) 라고 썼다. 또한 그리스도는 둘째 또는 마지막 아담( 롬 5:12-21; 참고. 고전
15:45 ) 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골 1:15 ) 이시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제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요 1:1, 14 )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19:30 ), 예수는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
에 숨을 불어넣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완수하도록 명령하셨다고 기록한다( 20:21-23 ). 따라서 창조/새
창조는 성경의 중요한 신학적 모티프임이 분명하다.136)
그러나 창조 신학만이 성경에서 중요하고 널리 퍼져 있는 유일한 주제는 아니다. 또 다른 주제는
언약에 대한 것이다. 아담 언약을 하나의 언약으로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르지만,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은 분명히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등 여러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예수는 새 언약을 제정하셨다.137) 요한계시록은 신실한 언약의 하나
중심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환원주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31, n. 2). 해밀턴은 2021년 의 논문에서 책별 접근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칭찬할 만하지만 성경 기록의 신학적, 주제적 다양성을 적절히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공허하게 들린다. J. Scott Duvall and J. Daniel Hays, God’s RelationalPresence:TheCohesiveCenterofBiblical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9)에서는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데, 저자들은 하나님의 관계적 임재가 “응집력 있는 중심”이라고 이야기한다. 또 한 Joshua W. Jipp, The Messianic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2020)를 참고 하라. 여기서 “중심 주장”은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 정체성은 신학의 전제일 뿐 아니라 신학의 일차적인(물론 배타적 인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라는 것이다(3). 이 책은 James D. G. Dunn, Unity and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AnInquiryintotheCharacterofEarliestChristianity, 3rd ed. (London: SCM, 2006)과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133) 예를 들어, 1권에서 다양성을, 2권에서 통일성을 다루는 Hah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를 보라. 그는 1 권에서 바울(주제적)과 “바울 학파”(데살로니가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목회서신)로 시작하여, 바울과 무관한 사 도 이후 “헬레니즘 유대 기독교 문서”(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공관복음과 사도행전, 요한 문 헌, 마지막으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로 이동한다. 2권에서는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기 독론, 구원론, 교회론, 윤리, 종말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Hübner, Biblische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도 계시에 대한 긴 프롤로그 후 바울(연대순)로 시작하여(1권), 제2 바울서신(한과 동일)과 공동서신으로 넘어간 후(2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공관복음, 요한 문헌 및 요한계시록(3권)을 다루고 있다.
134) Köstenberger, “Diversity and Unity in the New Testament,” 200-223
135) 예를 들어 Andrew David Naselli, “How Do Genesis 1–3 and Revelation 21–22 Relate as the Bible’s Bookends?,” in 40 Questions about Biblical Theology, 339–346을 보라. D. A. Carson, “Genesis 1–3: Not Maximalist, but Seminal,” TrinJ 39, no. 2 (2018): 143–163도 보라.
136) 예를 들어, G. K. Beale, “The New Testament and New Creation,” in Biblical Theology: Retrospect and Prospect, 159–173; Matthew Y. Emerson, Christ and the New Creation: A Canonical Approach to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Eugene, OR: Wipf & Stock, 2013)를 참고하라. 에머슨은 신약 성경의 책 순서가 “새 창조를 가 져오는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목표를 가리키며” 이를 “신약신학의 중심 또는 초점”이라고 말한다(xvii). Sean McDonough, Creation and New Creation: Understanding God’s Creation Project (Peabody, MA: Hendrickson, 2016)도 참고하라.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창조/새 창조 주제에 대해서는 Kö stenberger, Theology of John’s Gospel, 8장을 참고하라.
137) 이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는 Köstenberger with Patterson, Invita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566-576을 참고하라. Thomas R. Schreiner, Covenant and God’s Purpose for the World, SSBT (Wheaton, IL: Crossway, 2017)도 참고 하라.
님이 어떻게 영원한 상태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인지를 보여 준다.138) 물론 이것은 방대한
성경의 주제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의 요점은 최소한 창조/새 창조와 언약
둘 다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라는 점이다. 이외에도 메시아, 하나님 나라, 구원, 선교 등 성경에 널리
퍼져 있는 몇 가지 다른 주제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단일 중심 접근법이 명백히 환원주
의적이며 따라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성경신학에서 가장 최근에 시도되고 있으며, 상당한 결실을 맺은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
해하기 위해 메타내러티브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다.139) 이 접근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
야기, 즉 전체적인 줄거리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신학을 통일성만 아니라 다양성에서도 설명한다. 이
는 여러 면에서 칭찬할 만한 일이며 이전의 노력을 보완하고 심지어 개선하기도 한다. 성경의 신학
을 책별로 연구한 다음 개별 책과 그 신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
만, 여전히 큰 그림을 완전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성경의 중심 주제를 추적하더라도 개
별적으로, 심지어는 함께 살펴보더라도 성경의 메타내러티브, 즉 장대한 내러티브를 온전히 파악하
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경신학에 대한 메타내러티브, 즉 이야기식 접근 방식은 개선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전부라면 점들을 연결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140) 이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며, 그 그림이 지나치게 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장대한 내러티브를 주시하다 보면 성경의
줄거리에서 줄거리의 반전, 사소한 주제, 등장인물을 간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신명기, 이사야, 복음서 중 하나 이상의 책, 로마서, 요한계시록 같은 몇 가지 선택된 책에서만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12 소선지서 및 야고보서나 유다서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신약 성경 편지는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욥기, 전도서, 아가 같은 지혜서는 어떤가? 주의하지 않으면 학자들이 말하는
“정경 속의 정경”이라고 부르는 것, 즉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책 모음집( 또는 자신이 선호하는 성경 줄 거리의 전체적인 해석에 가장 잘 맞는 책들 ) 만 읽으면서 덜 알려진 책이나 불편할 수 있는 책은 무시하거나 심 지어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141) 동시에 성경의 특정 책이 다른 책보다 정경
138) “언약을 통한 왕국”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요약한 Gentry and Wellum, Kingdom through Covenant 를 참고하라.
139) 예를 들어, T. Desmond Alexander, From Eden to the New Jerusale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MI: Kregel, 2008,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부흥과개혁사 역간, 2012); Graeme Goldsworthy, Christ-Centered Biblical Theology: Hermeneutical Foundations and Principl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2); Beale, NewTestamentBiblicalTheology를 참고하라. Köstenberger, “Present and Future of Biblical Theology,” 445–464에서 이런 저작에 대한 논의와 평가를 참고하라.
140) 사실, 메타내러티브 접근법은 조직신학에 크게 의존하는데, 고전적 개혁주의 언약신학, 세대주의 신학, 새 언약신학 또는 다른 어떤 체계이든 모든 사람이 신학적 연결을 이끌어 내는
신앙고백의 범위 내에서 글을 쓴다).
141) 독일 학계에서 “정경 속의 정경”에 대한 질문은 Hah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1:24를 참고하라. 그 는 바울 신학만을 진정한 기독교 신학으로 간주하는 학자의 예로 Siegfried Schulz, Die Mitte der Schrift: Der Frühkatholizismus im Neuen Testament als Herausforderung an den Protestantismus (Stuttgart: Kreuz, 1976)를
적, 신학적 비중이 더 큰 것도 물론 사실이다.142)
이런 이유로 우리는 메타내러티브 접근법을 성경신학적 탐구의 마지막 단계로 권장하지만, 고전
적인 책별 접근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브루스 메츠거가 이에 대해 잘 말했다.
신약학자들은 교회의 종으로서 신자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발전을 위해 특정 계파와 특정
시기에 가장 인기 있는 책뿐 아니라 정경 안에 있는 모든 책의 완전한 의미를 조사하고, 이해
하고, 해명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폭과 깊이를 다하여 들을 수 있을 것이다.143)
주어진 책이나 모음집에서 ( 책별로 ) 시작하여, 주요 주제( 중심 주제 ) 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이 성경의 줄거리( 메타내러티브 ) 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다양한 접근
법의 강점을 결합하고 잠재적인 약점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균형 잡힌 절차를 통해 해석자
는 자신이 성경 내러티브의 하이라이트라고
구성한 이야기를 단순 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슐라터 같은 사람들이 성경신학의 목표로 올바르게 생각한 것처럼 성경 저
자 자신의 신학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성경의 줄거리에 자명한 중요한 요점이 있다 는 것을 쉽게 인정한다.144) 사소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창조, 타락, 구속, 완 성 등 성경 전체 이야기의 기둥에 대해서는 논쟁을 벌이기 어렵다.
1.2.3 주제 탐지 및 분석
위의 논의에서 우리는 성경신학이 무엇인지와 무엇이 아닌지를 정의했다. 또한 성경신학의 해석 학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성경을 한 권씩 살펴보는 방법, 성경의 중심 주제를 연구하는 방법, 하나 의 중심을 찾아내는 방법, 성경의 메타내러티브를 추적하는 방법 등 성경신학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 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어떻게 이론에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책 전체가 성경 전
인용한다.
142) 예를 들어, 신명기는 스바냐보다, 로마서는 유다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약 책에 대한 신약의 언급 빈도에 주목하라. 오경(특히 신명기), 시편, 이사야에 대한 언급이 우세한 반면 에스더나 아가의 명시적인 인용 은 없다. 아래 7장을 참고하라.
143) Bruce M. Metzger,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Its Origin,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xford: Clarendon, 1987), 282. 그러나 이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여전히 신약의 중심 가르침을 청중에게 알려야 하는 주 해의 책임을 덜어 주지는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Stuhlmacher, Biblical Theology, 785의 부드러운 반발을 참고하 라. 슈툴마허는 구약을 무시하지 않고 신약의 주요 전통을 분별할 것을 주장하는 베르너 게오르크 퀴멜의 선례를 따 르며(참고. Werner Georg Kümmel, “Das Problem der ‘Mitte des Neuen Testaments,’” in Heilsgeschehen und Geschichte, 2 vols., Marburger Theologische Studien 16 [Marburg: N. G. Elwert, 1968], 2:73), 결과적으로 그는 바울의 칭의 복음을 성경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 슈툴마허는 자신의 책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복 음은 신약 성경의 결정적인 중심이다”(12)라고 단언한다.
144) 예를 들어, Jason S. DeRouchie, “What Is Scripture’s Storyline?,” in 40 Questions about Biblical Theology, 29–40; “Epilogue: The Story Line of Scripture,” in Köstenberger, Kellum, and Quarles, Cradle, the Cross, and the Crown, 1024-1049; 아래 1.2.4의 논의를 참고하라.
체의 신학을 연습하는 것이지만, 어떤 성경 모음집의 신학을 연구하거나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한 주제를 탐구함으로써 성경신학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처음부터 살펴보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이나 디모데전후서 디도서같이 특정 책이나 모음집의 신학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할 때, 또는 남자와 여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선교 모티프, 성령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같은 주제
를 추적할 때, 일단 확실한 방법이 정해지면 체계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일만 남게 된다. 따라서 용
어를 신중하게 정의하고 방법을 연마하는 것이 절반의 전투다. 이제부터는 성경신학이 실제로 어떻 게 작동하는지 초보적인 단계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우리는 성경신학을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일반적인 지침을 제안한다.
1.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중요한 주제와 강조점을 파악하기 위해 메모를 하거나 성경에 표 시하라. 이것은 핵심 단어나 개념 수준에서 드러날 수 있다.
2. 이 과정에서 서문이나 프롤로그, 요약 및 목적 진술, 결론같이 주어진 책이나 모음집의 성 경신학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핵심 구절을 식별하라.
3. 눈에 띄는 주제와 독특한 신학적 강조점을 파악하라. 이 과정에서 문학적 분석을 활용하 고 전략적 배치, 반복, 구조 및/또는 강조점 같은 중요한 문학적 특징을 고려하라.
4. 주제의 계층 구조를 개발하라. 이전 단계에서 파악한 주요 주제 중 어떤 것이 성경 이야기 에 일관성을 제공하는 기본 주제( 예. 사랑 ) 고 어떤 것이 구체적인 사례( 예. 십자가 ) 인지 결정 하라.
다음에서는 먼저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신학에 대한 사례 연구를 살펴본 다음, 선 택한 성경신학 주제인 성령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두 번째 사례 연구로 넘어가겠다.
1.2.3.1 사례 연구 #1: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이런 일반적인 지침을 고려하여 이제 첫 번째 사례 연구인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 즉 일반적으로 “목회서신”으로 알려진 편지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성경신학적 접근 방
식은 귀납적, 역사적, 기술적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질문은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책들을 어 떻게 개괄하거나 신학적 범주를 생각해 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본문으로 판단할 때 바울 자신이 이 편지에서 자신의 신학적 사고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결국 성경신 학의 본질을 성경과 성경 저자의 신학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지, 우
바울이 곧 순교로 이어질 수 있는 투옥 생활을 하던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 난다. 많은 학자는 이 편지가 바울이 죽은 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 는 이 편지가 바울의 이전 편지와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145) 예를 들어, 이 편지들의 저자는 교회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은유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
용하지 않고 그 대신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한다.146) 이것은 중요한 변화인 것 같다. 또한 저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파루시아’가 아닌 ‘에피파네이아’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며,147) 바
울의 이전 편지처럼 성령의 열매나 그리스도인의 다른 은혜에 대해 말하지 않고 경건( ‘유세베이아’ ) 같
은 일련의 미덕을 본받을 것을 자신의 사도적 대표에게 촉구한다.148) 많은 사람이 또한 교회 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뚜렷한 관심에 주목하고, 이는 2세기 교부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초기 가톨
릭”을 반영한다고 말한다.149)
이런 차이점 중 어느 것도 바울이 이 편지들의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정당화하지는 못하지 만, 이 세 편지는 바울서신 모음에서
도, 최종 분석에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고등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럼에
저자일 것을 요구하며( 세 편지 모두 처음부 터 바울이 저자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1세기에 확립된 문학적 관행으로 편지가 위작일 증거는 거의 없다 ) 증거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믿는다.150) 그렇긴 하지만, 이 편지들은 독특한 성경신학 주제를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 또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
용하는데, 이는 그의 이전 편지에는 없던 호칭이다.151)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연이어 나오는 “미쁘
도다( 신뢰할 만하도다 ) 이 말이여”라는 표현이다.152)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이 편지들을
145) 예를 들어, 위경이 바울의 전통을 되찾기 위해 받아들여진 방법이었다고 주장하는 Lewis R. Donelson, Pseudepigraphy and Ethical Argument in the Pastoral Epistles, HUT 22 (Tübingen: Mohr Siebeck, 1986); 비 슷한 주장을 펼치는 David G. Meade, Pseudonymity and Canon: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of Authorship and Authority in Jewish and Earliest Christian Tradition, WUNT 1/39 (Tübingen: Mohr Siebeck, 1986); 세 편지 모두 교회 질서(디모데전서, 디도서) 및 종말론(디모데후서)을 위해 위조된 논쟁으로 간주하는 Bart D. Ehrman, ForgeryandCounterforgery:TheUseofLiteraryDeceitinEarlyChristianPolem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가 그렇다. 하지만 Armin D. Baum, Pseudepigraphie und literarische Fälschung im frühen Christentum. Mit ausgewählten Quellentexten samt deutscher Übersetzung, WUNT 2/138 (Tübingen: Mohr Siebeck, 2001); Stanley E. Porter and Gregory P. Fewster, eds., Paul and Pseudepigraphy (Leiden: Brill, 2013), esp. the essay by Armin Baum; Terry L. Wilder, Pseudonymity, the New Testament, and Deception: An Inquiry into Intention and Reception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4); idem, “Pseudonymity, the New Testament, and the Pastoral Epistles,” in Entrusted with the Gospel: Paul’s Theology in the Pastoral Epistles, ed. Andreas J. Köstenberger and Terry L. Wilder (Nashville: B&H Academic, 2010), 28-51; Köstenberger, 1–2 TimothyandTitus, 14-24에서 “진정성”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라.
146) 특히 딤전 3:15를 보라. 참고. 4-5절.
147) 예. 딤전 6:14; 딤후 4:1; 딛 2:13.
148) 예. 딤전 4:12; 6:11; 딤후 2:22.
149) 추가적인 이유와 평가는 Köstenberger, 1–2TimothyandTitus, 19-24를 참고하라.
150)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 “초기 교회에 유포되었던 알려진 익명의 문서라기보다는 바울의 것으로 받아들여 진 편지와 훨씬 유사하다”라는 카슨과 무의 판단은 타당하다(D. A. Carson and Douglas J. Moo,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2nd ed. [Grand Rapids, MI: Zondervan, 2005], 563).
151) 딤전 1:1; 2:3; 딛 1:3, 4; 2:10, 13; 3:4, 6.
152) 딤전 1:15; 3:1; 4:8-9; 딤후 2:11-13; 딛 3:4-8.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는 저자는 동일하지만( 즉 바울 ) 바울이 자신을 다
르게 표현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후자라면 용어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 가지 가능성
은 바울이 편지를 쓴 각 지역에 맞게 메시지를 맥락화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바울이 아덴에서 사
용한 접근 방식( 행 17:16-34 ) 에서 이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디도가 사역하던 그레데 섬의 고
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그곳 사람들은 여호와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들도 구주로 숭배했으며, 이
는 바울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153) 따라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구주며, 그레데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확실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 에카르트 슈나벨은 이 점을 적절하게 지적했다.
목회서신에 바울의 신학 주제(예. 십자가, 성령, 육과 영의 이분법)가 없다고 해서 그 편지가
진정한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바울이 모든 편지에서, 특히 자신의 신학을 아는 동역
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본적인 신학 주제를 전부 언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 목회서신의 신 학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바울의 확실한 편지와 모순된다는 것이 입증될 때에만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154)
이런 사전적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편지들의 성경신학을 살펴보겠다.155) 위의 일반적
인 지침에 따르면, 성경신학 연구에 참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책을 여러 번 읽고 중
요한 주제와 강조점을 파악하기 위해 메모하거나 성경에 표시하는 것이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들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편지들이 선교 개념, 더 구체적으로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
도적 선교에 얼마나 확고하게 뿌리를 두고 있는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디
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사도행전 및 다른 바울서신과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로 이 편지들의 첫 번째 주요 주제, 즉 기본 주제는 선교라고 주장할 수 있다.156) 이것은 다소 당연 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날 대다수 학자는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이 편지들에 대한 연구를 단순한 학문 활동으로 취급하며, 따라서 이 편지들이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153) Köstenberger, 1–2TimothyandTitus, 296-299 참고.
154) Eckhard J. Schnabel, “Paul, Timothy, and Titus: The Assumption of a Pseudonymous Author and of Pseudonymous Recipients in the Light of Literary, Theolog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 Do Historical Matters Matter to Faith? A Critical Appraisal of Modern and Postmodern Approaches to Scripture, ed. James K. Hoffmeier and Dennis R. Magary (Wheaton, IL: Crossway, 2012), 392(강조 원문). 그러나 슈나벨은 이 편지들에 서 성령의 “부재”에 대해 말할 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 Köstenberger, 1–2 Timothy and Titus, 427-431 참고.
155) 자세한 논의는 Köstenberger, 1–2TimothyandTitus, 357-544의 성경신학 부분을 참고하라.
156) 특히 Andreas J. Köstenberger, “An Investigation of the Mission Motif in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with Implications for Pauline Authorship,” BBR 29 (2019): 49-64; Chiao Ek Ho, “Mission in the Pastoral Epistles,” in EntrustedwiththeGospel, 241-267을 참고하라.
둘째, 목회서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가르침이라는 주제는 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바울의 사도적 선포인 케리그마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 그의 사도적
대표자들에게 전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편지들에서 “가르침”이라는 주제를 전달하는 구체
적인 단어나 문구는 상당히 다양하다.157) 그런 어휘에는 “맡은 것/부탁한 것”( 딤전 6:20; 딤후 1:14 ), “믿
음”( 딤전 6:12; 딤후 4:7 ), “하나님의 말씀”( 딤전 4:5; 딤후 2:9 ), “진리의 말씀”( 딤후 2:15 ), “성경”( 딤후 3:16-17 ), “가
르침”( ‘디다스칼리아’; 딤전 1:10 ), 동사 “가르치다”( ‘디다스케인’; 딤전 4:11; 6:2 ), 긍정의 의미 및 부정의 의미( ‘헤테
로디다스칼레인’; 딤전 1:3; 6:3 ),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신뢰할 만한 말” 등이 있다. 목회서신에 가르침
의 주제에 대한 어휘가 광범위하고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것은 바울이 올바른 교리, 즉 바울이 자주
부르는 대로 “건전한” 또는 온전한 가르침( 예. 딤전 1:10 ) 에 엄청난 가치를 두었음을 강조한다. 그 이유
는 올바른 가르침은 건강하고 생명을 주는 반면, 거짓 가르침은 신자 개개인과 교회의 생명을 빼앗
는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와 가르침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목회서신에서 가
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셋째, 반복적이고 두드러진 언급의 경우, “구원” 어휘군이 명사 ‘소테리아’와 동사 ‘소조’ 및 관련
용어 전체에서 꽤 두드러진다.158) 우리는 목회서신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로 “우리 구주 하나
님” 또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언급되는 것을 이미 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석가는 목회
서신의 기독론이 본질적으로 목회서신의 구원론과 동등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과장된 표현일 수 있 지만, 목회서신에서 그리스도가 주로 구주의 역할로 등장한다는 관찰은 타당하다. 가르침과 마찬가
지로 구원은 선교와 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선교, 가르침, 구원 이 세 가지가 모두 목회서신 에서 두드러진 주제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원이 두드러진 주제인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구 원이 필요하다는 점, 선교의 근본적인 현실이자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했듯이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
에 구원, 하나님, 그리스도를 하나의 동일한 전체 표제 아래 함께 다루는 것이 가장 좋다.159) 실제로 구원이 사실상 주요 주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성령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원천이자 제공자라는
점에서 하위 주제라는 그럴듯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우연히도 이것은 성경신학이 어떻게 조직신 학을 보완하거나 심지어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이 주된 주제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 구원과
관련하여 함께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 또는 그들의 교회에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그 자체로 그리고 그의 다양한 속성과 관련하여 생각하라고 자주 권하지 않는다( 물론 그가 송영에서 그것을 표출하는 곳도 있지 만 ). 오히려 바울은 일반적으로 선교, 가르침,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 그런 맥락에서 자신이
157) Köstenberger, 1–2TimothyandTitus, 386-397 참고.
158) Köstenberger, 1–2TimothyandTitus, 431-445.
159) Köstenberger, 1–2TimothyandTitus, 413-446.
선교 활동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구원은 하나님을 그 근원으로, 그리스도를 그 제공자로 삼고 있음 을 분명히 한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만큼 두드러지게 등장하 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디도서 3장 4-7절에 성령에 대한 주목할 만한 구절이 하나 있지
만, 목회서신에는 주로 디모데가 사역자로 임명된 것과 관련하여 성령에 대한 언급이 몇 번 있을 뿐 이다.
넷째, 바울은 이전의 여러 편지처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교회에 대
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은유를 제시한다.160) 이와 관련된 주요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14-15절로,
바울은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
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의 기둥과 터니라”( 4-5절 참고 ) 라고 썼다. 명시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언급하는 것 외에도, 이 개념은 특히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상당 부분에 암시적으로도 나타난다.161)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
은 두 편지 전체, 또는 적어도 상당 부분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
한 지침을 제공하는 확장된 “가정 규범”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개념이
목회 직분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자연적인 가정에 다양한 필요를 가진 다양한 구성원이 있고 가장이 그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 요구되는 것처럼, 목사와 장로도 교회
의 다양한 구성원의 필요를 보살펴야 한다. 그들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궁핍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 하고 돌보아야 한다. 다섯째,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특히 신자가 추구해야 할 미덕에 대해 두드러지게 이야기한다.162) 이와 관련하여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사도적 대표자로서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사랑, 의로움, 신실, 경건, 절제 같은 기독교적 미덕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책임
을 종종 떠맡게 된다. 이는 교회 지도자의 인격과 성품이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임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결코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개인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딤전 4:16 ),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 딤전 4:12 ) 라고 말한다. 또 한 바울은 선행과 선한 시민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고난과 역경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권면한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편지들에서 마지막 날에 대해 반복해서 말한다.163) 어떤 이들은 이 편지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160) Köstenberger, 1–2TimothyandTitus, 446-482 참고.
161) 유용한 연구는 박사 학위 논문인 Charles J. Bumgardner, “Family Relationships in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20)를 참고하고, 같은 저자의 “Kinship, Christian Kinship, and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SoutheasternTheologicalReview 7, no. 2 (2016): 3-17도 참고하라.
162) Köstenberger, 1–2TimothyandTitus, 482-513.
163) Köstenberger, 1–2TimothyandTitus, 513-527.
구적인 기관인 교회에 더 관심이 컸던 시기에 나왔다고 주장한다.164)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이것
은 “초기 가톨릭” 이론이라고 불리는데, 이에 따르면 이 편지들은 1세기 말 또는 심지어 2세기 초
에 나왔으며, 그 무렵 교회는 주교와 사제의 계급을 발전시켰고 이것이 결국 로마 가톨릭교회로 이
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기 교회 선교와의 연관성을 간과하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견해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
지도자들을 임명했음을 볼 수 있으며( 예. 행 14:23; 참고. 빌 1:1 ),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은 1세기 말이
나 2세기 초의 관행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 또한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는 사탄, 악마, 천사의
활동, 그리스도의 재림 등 종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준다. 특히 바울은 마귀가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전복하고 사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
에서 종말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울이 현시대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로 보고 있다는 점인데, 그는 이 둘 모두 비슷한 용어로 묘사한다( 즉, ‘에피파네이아’ 어휘
군을 사용한다 ). 165) 지금까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 바울 신학의 주요 윤곽을 일부 간략하게 스케치 했다. 이에 비추어 중요한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겠다. 이 편지들에 대한 이런 성경신학적 이해는 조
직신학의 표준적 취급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몇 가지 일반적인 관찰을 제시할 수 있다. (1) 선교 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조직신학은 사실상 선교로 결코 시작하지 않으며, 조직신학은 다수
또는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선교라는 주제를 절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구원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구원에 종속시키는 것도 다르다. 조직신학은 일반적으로
구원에 앞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다루며 그 후 기독론과 구원론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3) 다수
의 조직신학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는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는 더 두
드러진 은유에 비하면 미미할 수 있다. (4) 우리가 해 온 것처럼 종말론과 교회론을 함께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회론과 종말론을 분리하여 다루는 조직신학과도 다르다.
예를 들 것이 더 많지만, 전반적인 요점은 분명하다. 성경신학은 제대로 수행된다면 해석자가 성
경에 가까이 다가가게 해 주고, 특히 주어진 구약이나 신약의 책 또는 모음집을 볼 때 표준적인 조직
신학적 취급을 비판하고 때로는 수정할 수 있게 해 주는 독립적인 다리를 제공할 수 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신학에 대한 이상의 연구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모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
지만, 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조직신학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시대에 더 가까이 가져오도록 노력한다. 반 면,
164) 예. Ernst Kä semann, “Paulus und der Frü hkatholizismus,” ZTK 60 (1963): 75-89; 참고. Dunn, Unity and Diversity, 372-400.
165) 초림, 딛 2:11; 재림, 딤전 6:14; 딤후 4:1; 딛 2:13.
로 우리는 성경을 길들여 우리의 의제, 이념 또는 문화에 맞추기보다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고 성경 이 의제를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이제 두 번째 사례 연구로 넘어가 보겠다.
1.2.3.2 사례 연구 #2: 성령
성경신학에 참여하는 몇 가지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는 방금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경 한 권이나 모음집에 나타난 모든 주제를 연구 하는 것이다. 성경신학에 참여하는 또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자 최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경 전
체에 걸쳐 하나의 주요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교라는 주제나 남자와 여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등 여기서 몇 가지 예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안드레아스의 성경신학적 연구의 주요 결과 중 일부를 요약하
여 성경의 성령 신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166)
성령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역사적, 귀납적, 기술적으로 연구할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
나는 개별적인 성령의 언급부터 시작한다. 구약 성경에는 “영”( ‘루아흐’ ) 에 대한 언급이 약 400회 정
도 나오지만, 그중 100회 정도만 성령과 관련 있고 나머지는 인간의 영이나 호흡 또는 바람( 때로는 하
나님의 심판 상징으로 사용 ) 을 가리킨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성령/거룩한 영”이라는 표현은 단 두 번
만 등장하며( 시 51:11[일부 이견 있음]; 사 63:10-11 ), 가장 일반적으로는 “여호와의 영” 또는 단순히 “그 영”이
라는 문구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프뉴마’, 즉 “영”에 대한 언급이 모두 성령을 가
리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언급은 인간의 영이나 바람을 가리킨다.167) 또한 때로는 ‘프뉴마’라는 단
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성령을 언급하기도 한다.168) 신학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의 발전이 나타난다. 즉 전자에서는 성령이 창조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하나님이 지
정한 때에 특정 지도자나 선지자에게 임한다고 말하지만 일반 신자에게 내주한다고는 말하지 않는
반면 후자에서는 오순절부터 성령이 신자에게 내주한다고 말한다( 행 2장 ).
성경 전체에서 성령을 연구할 때 한 가지 흥미로운 도전은 구약 성경에 성령에 대한 자료가 한정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창세기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세 번, 오경의 나머지 부분에는 열 번 더 있다.169) 성경에서 성령은 창조 당시 물 위를 맴돌고 있었다고 처음 언급된다( 창 1:2 ). 가장 가까운 구
약의 비유는 독수리가 새끼 위를 맴돌고 있는 모습이므로( 신 32:11 ), 창세기는 성령을 어미 새로 비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 31:5도 참고하라 ).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대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 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는 성령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인
166) Andreas J. Köstenberger, “Part 1: Biblical Theology,” in Allison and Köstenberger, HolySpirit, 3-219.
167) 예를 들어, 요 3:6-8에서 예수가 ‘프뉴마’(πνεῦμα)를 사용하여 성령만 아니라 바람도 지칭한 것을 참고하라.
168) 예를 들어, 눅 24:49의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예수의 언급이나 행 1:4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참고하라.
169) 창 1:2; 6:3; 41:38; 출 31:3; 35:31; 민 11:17; 11:25(2x), 26, 29; 24:2; 27:18; 신 34:9. Allison and Köstenberger, HolySpirit, 9-15 및 아래 논의를 참고하라.
식한 사람이 바로 외에 없다. 오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성령은 성소를 짓는 장인들( 브살렐과 오홀리압; 출
31:2; 35:34-35 ), 칠십 장로( 민 11:17, 25 ), 선지자 발람( 민 24:2 ),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민 27:18; 신 34:9 ) 등
다양한 개인에게 임하거나 함께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오경에서 성령은 세 가지 주요
기능으로 나타난다. (1) 창조의 행위자로서, (2) 심판의 행위자로서( 성령이 떠나면 약해지고 죽는다는 의미에 서 ), (3)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능력 부여의 행위자로서.
역사서에는 사사시대에 옷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민족 구원자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
되어 있다.170) 왕정 초기에는 성령이 사울에게 먼저 임했고( 삼상 10:6 ), 나중에 사무엘의 후계자인 다
윗에게도 임했다( 삼상 16:13 ).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두 시대 모두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하고
국가의 구원자와 통치자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열왕기, 역대기, 느헤미야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은 모두 엘리야, 엘리사, 스가랴 같은 선지자나 영감 받은 개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
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성령의 활동과 관련 있다.171) 따라서 역사서에서 성령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다. 즉 (1) 국가의 구원자와 통치자를 일으켜 준비시키는 것과 (2) 하나님의 대변자에게 예
언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혜 문헌에는 성령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172) 전반적으로 지혜 신학은 존재하는 모 든 것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성령은 하
나님의 피조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차지하고 활용하고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사람의 내면을 살피는 것으로도 나타
난다( 시 143:10; 잠 20:27 )
성령은 선지서, 특히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173) 이사야에서 성령의 활
동은 주의 종의 오심과 연관되어 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선지자는 “그[종]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한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이사야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예언하는데, 주의 종 또한 메시아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인용한 구절에 서 이사야는 주의 종으로 보이는 인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
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사 61:1-2; 참고. 눅 4:18-19)
170) 삿 3:10; 6:34; 11:29; 13:25 등. Allison and Köstenberger, HolySpirit, 17-26을 참고하라.
171) 왕상 18:12; 왕하 2:16; 대하 24:20.
172) 하지만 예를 들어, 시 33:6; 104:30; 139:7; 욥 33:4를 보라. Allison and Köstenberger, HolySpirit, 26-31 참고.
173) Allison and Köstenberger, HolySpirit, 33-49.
성령은 에스겔에도 자주 언급되지만 예레미야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기 백
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겔 36:25-27; 참고. 39:29 ), 성령을 포로 생활에서의 회
복과 연결한다( 겔 37:12-14 ). 소선지서에서 성령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아마도 요엘 2장 28-29절
일 것이다. 이 구절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인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행 2:16-21 ) 로, 하나님의 영
이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 마리아, 엘리사벳, 스가랴, 시므온같이 메시아 예수를 고대하는
구원사의 중요 인물에게서 성령이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를 통해 자기 백성과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함께하실 것이다( 눅 1-2장 ) 174) 예수는 지상 사역 중에 성령
을 한량없이 소유하신 것으로 나타나며( 요 3:34 ), 예수의 세례 때 성령이 강림하여 그 위에 머무는 것
으로 묘사된다.175) 미래에는 훨씬 중요한 성령론적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례 요한과 나중
에 예수 자신은 메시아가 단순히 물로만 세례를 베풀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 셨다.176) 미래에 있을 이 성령 수여( 요 7:38 ) 에서 예수와 아버지는 신자와 영원히 함께 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와 함께 집을 지으실 것이다.177)
예수의 약속은 승천 이후 오순절,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 위에”( 행 2:16-21 ) 성령을 부
어 주겠다는 요엘 2장의 약속이 성취되어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행 2:4 ) 실현되었다.178) 이
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뿐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었다. 곧 세례 요한의 예언( 행 11:15-17 ) 에 따라 예수를 믿는 이방인 신자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행 10:44-47 ).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성령은 초기 교회의 사명을 땅끝까지 감
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들
을 통한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신약의 편지들, 특히 바울의 글은 이제 모든 신자가 성령의 내주를 누린다는 개념을 강화한다.179)
바울은 신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을 “받았다”라고 쓴다( 롬 5:5; 8:15 ). 성령은 신자들 “안에” 거
하고( 참고. 고전 6:19 ), 그들 “안에” 거하려고 오셨다( 롬 8:9, 11; 고전 3:16 ). 그들은 “첫 열매”( 롬 8:23 ) 와 “보
증”( 고후 1:22; 5:5 ) 으로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 엡 5:18 ) 을 받아야 한다. 바울서신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하고, 생명을 주고, 진리를 계시하고, 거룩함이 자라게 하고, 힘을 공급 하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엡 4:1-5 참고 ). 바울서신 외의 편지에서 성령 은 히브리서의 세 가지 경고 구절에 등장한다.180)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하시 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무시하지 말고,
174) Allison and Köstenberger, HolySpirit, 53-79.
175) 마 3:16; 막 1:10; 눅 3:22; 요 1:32-33.
176) 마 3:11; 막 1:8; 눅 3:16; 요 1:33; 행 1:5.
177) 요 14:16-17, 21; 참고. 요 20:22; 눅 24:49.
178) Allison and Köstenberger, HolySpirit, 81-101.
179) Allison and Köstenberger, HolySpirit, 103-166.
180) Allison and Köstenberger, HolySpirit, 167-188.
하나님의 아들과 언약의 피를 무시하여 은혜의 영을 격노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히 2:4; 6:4; 10:29 ).
성령은 또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신성한 구약 성경의 저자로 등장한다( 히 3:7; 9:8; 10:15-16 ).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에서 성화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벧전 1:2 ). 베드로는 독자에 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복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벧전 4:14 ). 베
드로는 또한 구약 선지자와 신약 사도의 사역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벧전 1:10-12; 벧후 1:21 ), 성령
을 그리스도의 부활 행위자로 묘사한다. 요한은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신자가 “거룩하신 자에게
서 기름부음”, 즉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다( 요일 2:20, 27 ). 또한 요한은 성령을 하나님의 “씨”이자 중생
의 행위자( 요일 3:9 ), 예수의 세례 및 십자가와 함께 예수를 증언하는 세 증인 중 하나( 요일 5:6-8 ), 신자
에게 내적으로 증언하는 분( 요일 5:10 ) 으로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은 요한이 본 네 환상과 연관되어 있다. “성령으로”라는 문구는 각 환상의 시작 부분이나 그 근처에서 발견된다.181) 성령은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 계 1:4; 3:1; 4:5; 5:6 ) 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며, 2-3장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일관된 반복구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 로, 성령은 박해에서도 교회의 증언과 선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령과 교회가 모두 예수께 빨리 재림해 달라고 간구한다( 계 22:17 )
요약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하나님의 영은 성경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182)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하고, 진리를 계시하며, 거룩함을 키우고, 연 합을 이루며, 생명을 주고, 삶에 힘을 주고, 삶을 변화시킨다. 성령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으면서도 구원사의 연속선상에서 별개의 인격으로 활동한다. 성경은 신구약 모두 성령에 대한 성경 신학의 윤곽을 스케치하는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매혹적이고 흥미로운 조각의 집합체를 제공한다.
D. A. 카슨은 모든 성경신학적 제안의 척도는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라고 바 르게 말했다.183) 성경적 성령신학에 대해서는 통일성과 다양성,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척도를 모
두 감지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동일한 성령이 성경의 전체 궤도와 배경에서 활동한다. 반면에 오순
절은 모든 신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분수령이 되는 날이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역할과 사 역을 다각적으로 묘사한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인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영적인 은사를 주권적으로 분배하고, 교회와 신자 개개인의 삶에서 다른 많은 중요 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성부 하나님 및 성자 하나님 과 친밀하고 필수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181) 계 1:10; 4:2; 17:3; 21:10(Allison and Köstenberger, HolySpirit, 188-194).
182) Allison and Köstenberger, Holy Spirit, 201. “A Biblical-Theological Synthesis of the Holy Spirit in Scripture,” in Allison and Köstenberger, HolySpirit, 201-219를 보라.
183) Carson, “New Testament Theology,” 810: “이런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명백한 다양성을 공정하게 다루면 서도……신약신학의 통일성을 얼마나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참고. Hah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s, 1.xvii: “신약신학은……초기 기독교 증거의 다양성뿐 아니라 통일성도 다루어야 한다.”
두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성경 저자들이 가진 신학을 분별하기 위해 성경신학에 참여하는 방 법을 설명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경신학에 참여하려면 본문을 주의 깊게 듣는 것과 주로 역사적이 고 기술적인 귀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성경신학에 참여하는 두 가지 예
를 살펴봤는데, (1) 성경의 특정 문서 묶음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신학을 연구하는 것과
(2) 성경 전체의 특정 주제, 즉 성령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신학에 참여함으로써 이런 주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성경의 권위에 복
종할 준비를 하고 성경을 대한다면, 비록 그것이 반문화적인 경우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
한 하나님의 뜻( 윤리적 요소 ) 에 맞춰 삶을 변화시키도록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견해와
우리 문화의 견해를 성경에 강요하는 대신 “살아 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히 4:12 ) 에 의해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은 우리가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큰 가능성이 있다.
1.2.4 성경의 줄거리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이 책에서 우리는 성경 정경 66권 각 권의 주요 주제와 윤리적 강조점과 관련하여 각 권을 면밀 히 연구하지만, 동시에 각 권을 성경의 전체 이야기 안에 위치시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처음에 우 리가 다루는 글의 종류와 성경에 담긴 문학의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안내할 몇 가지 중요한 관찰 사 항을 제시하되, 우리가 설명 및 옹호하는 다음과 같은 열두 가지 확언의 형태로 그렇게 할 것이다.
성경은 어떤 문서인가?
(1) 성경은 “지금까지 전해진 이야기 중 가장 위대한 이야기”다. 성경은 다른 어떤 이야기와도 다
르다. 성경과 예를 들어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같은 다작 작가의 작품집 사이에는 유사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다음 확언에서 전개할 것처럼 성경의 성격과 메시지에는 중요한 차이점도 있다.
(2) 성경은 참된 이야기다. 즉 이것은 역사다. 독일어에서 ‘게쉬히테’( Geschichte ) 라는 단어는 “이
야기”와 “역사” 모두 의미할 수 있다. 영어에서 ‘스토리’( story ) 라는 단어는 실제 역사에 근거하지 않
은 이야기라는 의미를 전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쉽게 혼동할 수 있다. 성경은 여러 장르를 포함하
고 있지만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기반으로 한다. 에리히 아우어바흐, 한스 프라이 등이 주장하는 것 처럼 단순히 “사실적”이거나 “역사 같은” 것이 아니다.184) 독일을 비롯하여 영국, 미국 등의 많은 역 사비평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은 역사와 모순되지 않는다.185)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적 창조, 이 스라엘 백성과의 역사적 관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동정녀 탄생, 십자가, 장사, 부활을 통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184) Erich Auerbach, Mimesis: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Hans W. Frei, The Eclipse of Narrative: A Study in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Hermeneutic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4).
185) Harris, TübingenSchool 참고; 또한 Yarbrough, Salvation-HistoricalFallacy; idem, Clash of Visions도 참고.
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위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186)
(3) 성경은 일련의 명제로 환원할 수 없다.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 즉 장대한 내러티브라는 사실은 성경을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선언으로 환원할 수 없 음을 의미한다. 이야기를 전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온전하게 보존해야 할 의미의 잉여가 있다. 이것
은 성경에 대한 다양한 내러티브와 문학적 접근법의 큰 장점이다. 비록 슬프게도 많은 접근 방식이 환원주의적이고 자료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187)
(4) 성경은 여러 장르를 포함한다. 각 장르마다 해석에 대한 고유한 기본 규칙이 정해져 있다. 케빈
밴후저가 설명했듯이, 성경의 무오성이나 영감 같은 교리도 모든 장르에 걸쳐 일률적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정확하고 유의미하려면 특정 장르 범주에 맞게 공식화해야 한다.188) 마찬가지로, 성경의 다
양한 장르는 성경신학에 큰 도전이자 기회며 상당한 뉘앙스, 해석학적 기술, 해석학적 정교함을 요 구한다.
(5) 성경은 권위 있는 책의 모음인 정경이다. 각 책은 자체로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고유한 강론
을 담고 있지만, 성경의 책들은 공통의 주제와 공통의 메타내러티브( 공통의 신성한 저자는 말할 것도 없고 ) 를 통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성경 각 권의 완전성을 존중하고 각 권이 정경에 기여 할 수 있는 고유한 공헌이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는 먼저 성경의 전체 줄거리에 특정 책을 배치하기
전에 개별 주제와 특징적인 윤리적 가르침을 식별하기 위해 책별 연구에 착수할 것이다.
(6) 성경은 영감 받은 책이다. 성경은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189) 성경은 이를 명시적으로 가르친다.190) 또한 예수가 하신 말씀( 예를 들어, “성경 은 폐하지 못하리니”, 요 10:35 ) 이나 신약의 여러 기자의 많은 진술에도 암시되어 있다.191)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주어진 구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이르시되”( 히 3:7; 10:15 ) 라는 말로 해당 인용구를 소개 한다. 성경의 영감과 계시적 성격에 대한 믿음은 해석자에게 경외심을 심어 통회하고 겸손하며 하나
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사 66:2 ).
(7) 성경은 권위가 있다. 성경은 영감 받았을 뿐 아니라 권위도 있다. 성경은 인간의 행동( 윤리 ) 을
요구하는 신성한 언어 행위를 담고 있다.192)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복종하는
186) 이런 통찰은 해석학 트라이어드의 중요한 부분이다(Kö stenberger with Patterson, Invitation to Biblical Interpretation 참고).
187) 이전 항목을 참고하라.
188) Vanhoozer, “Semantics of Biblical Literature”; idem, “A Lamp in the Labyrinth: The Hermeneutics of ‘Aesthetic’ Theology,” TrinJ 8 (1987): 25–56; idem, “Lost in Interpretation? Truth, Scripture, and Hermeneutics,” JETS 48 (2005): 89–114 참고.
189) 예를 들어, Kenton L. Sparks, God’s Word in Human Words: An Evangelical Appropriation of Critical Biblical Scholarship (Grand Rapids, MI: Baker, 2008); Peter Enns, Inspiration and Incarnation: Evangelicals and the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2nd ed. (Grand Rapids, MI: Baker, 2015). 참고. G. K. Beale, The Erosion of Inerrancy in Evangelicalism: Responding to New Challenges to Biblical Authority (Wheaton, IL: Crossway, 2008) 의 입장과 다르다.
190) 딤후 3:16-17; 벧후 1:19-21; 참고. 시 19편; 119편.
191) John Wenham, Christ and the Bible, 3rd ed. (1972; repr., Eugene, OR: Wipf & Stock, 2009) 참고.
192) 우리는 “윤리”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단순히 학자나 학생으로서 정보를 구하거나 성경의 내용에 대한 지식을 늘
리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알기 위해 성경을 찾아온다( 약 1:22-25; 참고. 마 7:21-29 ). “언어 행위 이론”에서 말에는 발화 요소( 언 사 ), 발화 수반 요소( 의도적이다 ), 발화 효과 요소(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 가 있음을 지적한 것은 유용 하다.193)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 “믿음의 순종”( 롬 1:5; 16:26 ) 으로 부르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 (8) 성경은 사랑 이야기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16a ) 라는 구속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메시아의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이것이 성경 메타내러티브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사실, 우리는 예수는 말
할 것도 없고 모세, 요한, 바울, 베드로 등 많은 성경 저자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하나님 사랑
과 사람 사랑을 요구하는 사랑의 윤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사랑
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인류를 창조했는지,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한 성
경의 줄거리와 성경 계시의 핵심으로 등장할 것이다.
(9) 성경은 구원 이야기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라”( 요 3:16b ).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사랑이다( 물론 사람이 원한다면 그 사랑을 거
부할 자유는 있다 ). 따라서 성경의 전체 메타내러티브를 관통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실이다.
(10) 성경은 우여곡절이 많은 이야기다. 성경은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이며, 일부는 주
연이고 일부는 조연이다. 따라서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모두 반영한다. 중심 주제 접근 방식의
약점이 여기에 있다. 즉 성경의 메타내러티브의 기초를 하나님과 성경의 통일성에 두려는 노력은 칭
찬할 만하지만, 이런 모델은 성경의 “이야기”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훌륭 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언제나 선형적이지는 않으며 많은 우여 곡절을 포함하는 줄거리가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읽기, 창의적인 상상력, 해석학적, 해석적, 문학적 정교함이 필요하다. (11) 성경은 하나님이 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이야기다. 성경의 핵심은 단순히 개인 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을 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 나중에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부르는 것과 연결한다. 이것 역시 중요한 주제적, 윤리적, 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지만, 이 책 전체에서 귀납적으로 성경 윤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다양한 성경 저자의 개별적인 기여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다.
193) 언어 행위 이론에 대해서는 J. 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John R. Searle,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을 참고하라. 또한 Anthony C. Thiselton, The Two Horizons: New Testament Hermeneutics and Philosophical Descrip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Heidegger, Bultmann, Gadamer, and Wittgenstein (Grand Rapids, MI: Eerdmans, 1980); Kevin J.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The Bible, the Reader, and the Morality of Literary Knowledge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8)도 참고하라.
해석적 함의를 담고 있다.194)
(12) 성경은 극적 이야기, 즉 하나님과 사탄의 우주적 전투 이야기다.195)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뿐
아니라 천사도 창조했고,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처럼 가장 높은 천사( 사탄 ) 와 다른 많은 천사( 마 귀 ) 도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성경 전체 내러티브의 배경은 하나님과 악의 세력 사
이에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싸움이며, 악의 세력은 죄 많은 인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에
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 따라서 예수의 사명은 죄 많은 인류를 영적으로 구하는 작업이며, 사탄
은 성경이라는 신극( 神劇, theo-drama ) 의 주요 대적이다. 이것은 성경 내러티브 전반에 걸쳐 엄청난 긴
장감과 드라마를 빚어내고,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는 재림에서 정점에 이른다. 그러나
최종 결과에 대한 긴장은 거의 없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에서 정경으로 긜고
성경신학에서 정경 형식의 성경이 갖는 중요성으로 넘어간다.
1.3 성경신학을 위해 정경 형식(들)이 갖는 의의
현재 성경의 신학적 차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한 측면은 최근의
성경신학 저술 노력이다.196) 이 책은 이런 노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책이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묘사하고 설명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본문을 그 내용에 따라 신학적으로 읽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 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계시된 대로라면 인간은 어
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 신자는 하나님의 본성, 행동, 동기를 이해하고 이것이 자신이 누
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 이런 목적에
따라 성경 정경은 교리와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교회를 위해 섭리에 따라 보존된 신성한 모음집으로 서 새로운 신학적 진지함으로 취급되고 있으며,197) 성경의 책 순서는 성경 자료의 정경 제시에서 분 명하고 중요한 측면이다.
194) 아래 13.3.2.4의 논의를 참고하라.
195) Köstenberger, Theology of John’s Gospel and Letters, 281-282를 보라. 중대한 저작인 Hans Urs von Balthasar, Theo-drama:TheologicalDramaticTheory, 5 vols. (San Francisco: Ignatius, 1988-1998)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Kevin J. Vanhoozer,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Doctrin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교리의 드라마』, 부흥과개혁사 역간, 2017); Craig G. Bartholomew and Michael W. Goheen, The Drama of Scripture: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ical Story, 2nd ed. (Grand Rapids, MI: Baker, 2014)도 보라.
196) 1.3의 이전 판 자료는 Gregory Goswell, “The Ordering of the Books of the Canon and the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JTI 13 (2019): 1-20에 수록되었다.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PA, 2019. 허가를 받아 사용함.
197) 예를 들어, Dempster, “Canon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Ron Haydon, “A Survey and Analysis of Recent ‘Canonical’ Methods (2000–2015),” JTI 10 (2016): 145-155.
1.3.1 성경의 책 순서와 해석학
더 진행하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책 순서의 배치 현상에 어떤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지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역사적 정경( 히브리어와 헬라어 ) 의 윤곽에 따라 책을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것은 성경의 파라
텍스트( paratext ) 의 구성 요소 중 하나다. “파라텍스트”라는 용어는 텍스트에 인접해 있지만 텍스트
자체의 일부가 아닌 요소를 말한다.198) 성경의 파라텍스트에는 책 제목과 책의 내부 구분( 예. 단락 나
누기 ) 도 포함된다. 성경 책들의 순서는 성경 저자 자체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고대 독자의 산물이기 때
문에 본문 자체와 같은 차원에 놓을 수 없는 파라텍스트 현상이다. 이것은 성경 본문에 대한 저자 이
후의 해석적 프레임으로, 초기 독자들이 다양한 성경 책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함께 묶은 책들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고 서로를 조명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후대 사용자들
에게 해석학적 지침으로서 적절한 정경적 배경이라고 생각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생성된 틀이다. 정
해진 책 순서는 사실상 본문에 대한 해석이다.199) 이런 이유로 우리는 책 순서 문제를 성경 해석 역
사의 일부로 접근해야 한다. 성경의 책 순서에 대한 연구는 성경의 수용사( Rezeptionsgeschichte ) 의 초
기 단계를 밝혀내고, 고대 독자의 통찰과 신념을 후손을 위해 보존하는 것이다. 이 하위 단원에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정경에서 룻기에 부여된 위치를 시험 사례로 살펴보고, 이 정경의 편집자들이 이
책의 신학적 의미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신성한 성경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와 응답
에 정보를 제공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앞 단락의 요점을 다시 말하자면, 성경 책의 순서는 저자가 아닌 독자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
에 본문 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00) 저자는 성경 본문을 생성하
고 의미를 만드는 사람으로 작품의 정확한 구성 역사( 예를 들어, 여러 저자와 판본, 편집 단계의 가능성 등 ) 와는
무관한 반면, 독자는 책을 특정한 정경 순서대로 배치함으로써 본문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여
본문의 파라텍스트적 틀을 제공한다. 책을 특정한 순서로 배치하는 것은 성경 본문에 외부적인 제약
을 가하는 것이지만, 이는 다양한 출처의 본문을 하나의 문학 모음집으로 수집할 때 피할 수 없는 것 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텍스트가 없는 본문은 존재할 수 없고,201)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 는 것이 그 기원과 기능이 불분명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학자가 본문과 파라텍스트의 구분이
198) 파라텍스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Gérard Genette,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 Jane E. Lew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을 보라. 참고. Martin Wallraff and Patrick Andrist, “Paratexts of the Bible: A New Research Project on Greek Textual Transmission,” Early Christianity 6 (2015): 239: “성경 본문 자체를 제외한 성경 사본의 모든 내용은 선험적인 파라텍스트다.”
199) 참고. Robert W. Wall, “Canonical Context and Canonical Conversations,” in Between Two Horizons: Spanning New Testament Studies and Systematic Theology, ed. Joel B. Green and Max Turner (Grand Rapids, MI: Eerdmans, 2000), 175-176: “정경의 최종 배열과 제목과 같은 정경 과정의 문학적 관습은 성경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 Graham A. Cole, “Why a Book? Why This Book? Why the Particular Order within This Book? Some Theological Reflections on the Canon,” in Carson, ed., EnduringAuthorityoftheChristianScriptures, 473, 475-476 참고. 201) 그러나 성경에서 제목으로만 알려진 잃어버린 작품(예. “유다 왕 역대지략”, 왕하 20:20; “다윗왕의 역대지략”, 대상 27:24)과 같이 본문이 없는 파라텍스트도 있는데, 제목은 비록 거의 일반적인 것이지만 선택적인 파라텍스트의 요소 이기 때문이다. Gérard Genette, “Introduction to the Paratext,” New Literary History 22 (1991): 263을 보라.
우리가 제안하는 것처럼 절대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202) 그러나 우리는 둘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다고 주장한다.203)
종교개혁 이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경에 대해서는 일종의 타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널리 퍼
졌고, 결과적으로 개신교 성경에서 구약 번역의 기초는 히브리어 본문이 되었지만 책의 순서는 ( 라틴
어 불가타 역본을 통해 전수된 ) 헬라어 정경 전통의 순서를 따르게 되었다. 이상한 말이지만, 이것은 불만스
럽지 않은 상황이다. 기독교 독자에게 그들이 두 정경 전통 모두에 빚을 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이점도 있고 어느 한 전통이 다른 전통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책의 순서를 정하는 특정한 방식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예. 게오르크 슈
타인스, 스티븐 뎀프스터 ). 다른 이들은 성경 책의 순서를 해석학적 결과를 거의 또는 절대 낳지 않는 기계
적 현상으로 간주한다( 예. 존 바턴, 존 C. 포리에이 ). 이 두 극단은 모두 피해야 한다. 슈타인스는 역대기가
구약 정경의 마지막 책으로 기록되었으며,204) 따라서 그 책을 다른 위치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가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증거는 없다.205) 또한 뎀프스터처럼
정경 책들의 특정한 한 가지 순서( 예를 들어 바바 바트라에서 발견되는 히브리어 성경 순서 ) 를 구약신학의 배타적
기초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206) 존 바턴은 “이론적으로는 정경 목록이 중요한 해석학적 원칙을 보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책을 한데 모으는 것은 잠재적으로 해석학적 과정이다”라고 말한다.207)
그러나 바턴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설득력 있게 입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마찬가지로 포리에이도 바울서신의 순서가 편지의 분량이 작아지는 것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보면
서( 결과적으로 로마서가 머리 책이 됨 ), 이는 책의 순서가 독자에게 아무런 의미를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
명한다고 본다.208) 그러나 포리에이의 주요 비판 대상은 브레바드 차일즈가 ( 책 순서라는 경험적 사실인 )
서술( description ) 에서 ( 책 순서에 근거한 구체적인 해석이 후대의 독자에게 구속력을 갖도록 요구하는 ) 규정( prescription ) 으
로 옮겨 간 것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209) 우리는 이런 파라텍스트적 특징이 항상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거나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경 안에서 한 책이 어디 에 배치되느냐의 문제를 우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경우는 설사 있다 해도 극히 드물다. 그 위치는 일
202) 예를 들어, Hendrik J. Koorevaar, “The Torah Model as Original Macrostructure of the Hebrew Canon: A Critical Evaluation,” ZAW 122 (2010): 64-66은 이 견해를 구체적으로 비판한다.
203) 이런 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regory Goswell, “Should the Church Be Committed to a Particular Order of the Old Testament Canon?,” HBT 40 (2018): 28-34를 참고하라.
204) Georg Steins, DieChronikalskanonischesAbschlussphänomen:StudienzurEntstehungundTheologievon1/2 Chronik, BBB 93 (Weinheim, Germany: Beltz Athenäum, 1995).
205) 슈타인스의 접근 방식에 대한 반론은 Edmon L. Gallagher, “The End of the Bible? The Position of Chronicles in the Canon,” TynBul 65 (2014): 181-199; Gregory Goswell, “Putting the Book of Chronicles in Its Place,” JETS 60 (2017): 283-299를 참고하라.
206) Stephen G. Dempster, Dominion and Dynasty: A Biblical Theology of the Hebrew Bible, NSBT 15 (Leicester, UK: Apollos, 2003, 『NSBT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구약신학』, 부흥과개혁사 역간, 2012)
207) John Barton, Holy Writings, Sacred Text: The Canon in Early Christianit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7), 34.
208) John C. Poirier, “Order and Essence of Canon in Brevard Childs’s Book on Paul,” BBR 20 (2010): 503-516.
209) Brevard S. Childs, The Church’s Guide for Reading Paul: The Canonical Shaping of the Pauline Corpu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8) 참고.
반적으로 책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책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해석적 평가를 나
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책 순서의 해석학적 중요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체드 스펠먼 은 “개별 저술이 모음집의 다른 저술과의 관계 안에서 ( 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 위치하는 것은 해석학적
파급력이 크다”라고 말한다.210)
우리는 정경의 순서가 다양한 것을 경쟁 전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신학적 변수를 분
별하고자 하는 현대 독자가 고려해야 할 성경의 의미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가운데 서로 풍요롭게
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3.2 신학적 해석을 위한 최근의 시도에서
성경신학을 필수적인 첫 단계와 기초로 삼는 신학적 성경 해석의 실천가들은 학문적 엄격성과 비
평 도구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임무를 주로 학계보다는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여긴다.211)
스티븐 파울에 따르면, 성경 읽기에 필요한 것은 “기독교적 신념, 실천, 관심사가 성경 해석에 영
향을 미치고 또한 그 해석의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성경 해석과 관련을 맺는 복잡한 상호작용”
이다.212) 고대 성경 사본이 이스라엘 집회, 회당 예배 또는 초기 기독교 모임에서 전례적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성경 해석의 교회적 맥락을 우선시하는 해석적 접근과 부합한다.213) 이런 용
법을 고려할 때, 구약 정경과 그 후의 신약 정경의 결과물은 신앙 공동체의 독서 습관과 이들 집단이 이해한 근본적인 신학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정경이 다양한 역사적 형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하
나 이상의 독서 공동체( communio lectorum, ‘콤무니오 렉토룸’ ) 가 관여했음은 분명하다.214) 정경의 결과적 형 태를 무시하는 성경신학은 초기 독자의 통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로저 벡위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라는 예수의 부활 후 말씀에 구약 정경의 삼중 구조가 반영 되어 있다고 보는 여러 학자 중 한 사람이다.215) 그러나 “시편”은 그 특정 책만을 가리킬 수 있다. 그
210) Ched Spellman, Toward a Canon-Conscious Reading of the Bible: Exploring the History and Hermeneutics of the Canon, New Testament Monographs 34 (Sheffield, UK: Sheffield Phoenix, 2014), 109-110.
211) Daniel J. Treier, Introducing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Scripture: Recovering Christian Practice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79-100.
212) Stephen E. Fowl, Engaging Scripture: A Model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Challenges in Contemporary Theology (Oxford: Blackwell, 1998), 8.
213) 예. 수 8:30-35; 왕하 23:1-3; 느 8:1-8; 눅 4:16-30; 행 13:13-16; 골 4:16; 살전 1:16; 살전 5:27; 딤전 4:13; Justin Martyr, Apologia i 67. G. J. Venema, Reading Scripture in the Old Testament: Deuteronomy 9–10; 31; 2 Kings 22–23;Jeremiah36;Nehemiah8, OtSt 48 (Leiden: Brill, 2004); Michael J. Kruger, ChristianityattheCrossroads: HowtheSecondCenturyShapedtheFutureoftheChurch (London: SPCK, 2017), 99-102.
214) 이것은 Stefan Schorch, “Which Bible, Whose Text? Biblical Theologies in Light of the Textual History of the Hebrew Bible,” in Beyond Biblical Theologies, ed. Heinrich Assel, Stefan Beyerle, and Christfried Böttrich, WUNT 1/295 (Tübingen: Mohr Siebeck, 2012), 359-374에서 강조된다.
215) Roger T. Beckwith, The Old Testament Canon of the New Testament Church and Its Background in Early Judaism (London: SPCK, 1985).
렇다면 예수가 예언이라는 넓은 범주에서 다른 책과 구별하여 시편만을 택한 유일한 이유는 시편이
자신에게 특별히 중요한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이 일반적으로 “율법과 선지자” 같은
이분법적 표현으로 지칭되는 것을 볼 때( 예. 마 5:17 ), 216)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문구는 “특히 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217) 또한 쿰란 사본 11QPsa ( column 27, line 11 ) 는 시편이 다
윗이 “예언을 통해” 말한 것이므로 선지서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참고. 마카베오4서
18:10-19; 행 2:30 ) 218) “시편”을 세 번째 정경 구분을 가리키는 제유법으로 읽는 것은 사실 탈무드의 후
기 증거를 부적절하게 거꾸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이는 벡위드의 논증에 나타난 전반적인 방법론적
결함이기도 하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정경을 세 부분으로 나열하지만, 요세푸스의 목록에서 오경만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전형적인 삼분법적 책 배열의 한 부분과 일치한다( Contra Apionem 1.37–42 ). 따라서
예수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었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배열한 것은 오래된 일일 수 있지만, 선지서와 성문서를 공식적으로 구
분한 최초의 결정적인 증거는 2세기 전통을 이런 취지로 기록한 탈무드에서 찾을 수 있다( Baba Bathra 14b ). 219) 존 바턴은 회당에서 선지서는 정기적으로 읽었지만 성문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관행이 그 구분의 근거라고 제안한다.220) 다시 말해서, 탈무드에 명시된 성경 책의 배열은 전례를 위한 것이 며 고대 유대인 신자 공동체의 신학적 헌신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프타롯은 안식일, 축제, 특 정 금식일에 회당에서 토라의 정해진 부분( 파라샤 ) 을 낭송한 후 공개적으로 낭송하는 선지서 선집 이다.221) 유대교에서 정경 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전기 선지서 ) 와 기독교인이 선지 서로 간주하는 책( 후기 선지서 ), 즉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열두 선지서( =소선지서 ) 를 포함하므로 히브
리어 성경에서 선지서는 8권의 정경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고대 유대교 예배
공동체의 독서 관행이 구약 성경의 책 순서와 집성에 담겨 있으며, 이런 문학적 배열이 해당 공동체
의 신학적 확신을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전 학계에서는 마르틴 노트의 “신명기사가 역사 이론”처럼 신명기를 오경에서 떼어내어 그 뒤
216) Stephen B. Chapman, TheLawandtheProphets:AStudyinOldTestamentCanonFormation, FAT 27 (Tübingen: Mohr Siebeck, 2000), 276-279에서 제공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라.
217) 참고. Konrad Schmid, “The Canon and the Cult: The Emergence of Book Religion in Ancient Israel and the Gradual Sublimation of the Temple Cult,” JBL 131 (2012): 300: “4QMMT나 눅 24:44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산발 적인 언급은 율법과 선지서와 함께 시편을 특별히 강조하지만, 드문 일이며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선지서 와 시편 사이의 ‘그리고’(and)는 부가적인 의미 대신에 설명적[=명확하게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18) 히브리어 본문과 번역은 J. A. Sanders, The Psalms Scroll of Qumrân Cave 11 (11QPsa), DJD 4 (Oxford: Clarendon, 1965), 92를 참고하라. 선지자 다윗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Benjamin Sargent, David Being a Prophet: The Contingency of Scripture upon History in the New Testament, BZNW 207 (Berlin: de Gruyter, 2014), 78을 참고하라.
219) Andrew E. Steinmann, The Oracles of God: The Old Testament Canon (Saint Louis: Concordia Academic Press, 1999), 136-144.
220) John Barton, Oracles of God: Perceptions of Ancient Prophecy in Israel after the Exile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86), 75-82.
221) 토라의 공개적 낭송의 기원에 대해서는 Michael Fishbane, Haftarot,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JPS, 2002), xx-xxiii을 참고하라.
에 나오는 책과 함께 묶는 등 성경의 역사적 구성을 가볍게 무시하고 “학자의 정경”을 선호했다.222)
노트의 이론에 따르면 신명기 1-3장은 신명기–열왕기하를 아우르는 문학 작품의 서론이다. 여호
수아와 신명기 사이의 강력한 주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223) 모든 고대 정경 목록과 성경에서 정경
단위는 오경( Pentateuch, 처음 다섯 두루마리 ) 이지 사경( Tetrateuch, 네 두루마리 ) 이 아니다.224) 또한 그것은 다
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경과 여호수아가 결합하여 형성된 육경( Hexateuch, 여섯 두루마리 ) 도 아
니다. 이것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진입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단위로 보일지라도( 신 6:20-24;
26:5b-9에서처럼 ), 225) 또는 족장들에서 땅 소유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단위로 보일지라도( 수 24:2-13의
연설에서 볼 수 있듯 ), 226) 고대 독자는 이런 식으로 책들을 묶지 않았다. 이런 성경 자료의 재구성과 달
리, 신명기는 오경의 마지막에 있는 전통적인 위치에서 오경의 가르침을 모든 미래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통해 요약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열두 선지서의 비평적 취급을 들 수 있는데, 그 한 예는 북왕국 선지자 호세아가
유다에 대해 언급한 것( 예. 호 1:7, 11; 4:15; 5:5, 10, 12, 13, 14 ) 을 이차적인 자료로 치부하는 것이다. 크리스토
퍼 자이츠는 소선지서에 대한 간략한 연구사를 소개하며, 열두 선지서 사이의 문학적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열두 선지서를 서로 비추어 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227) 호세아의 예언은
대부분 북왕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때때로 남왕국을 언급하기도 한다.228) 호세아 1장 1절의 표제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뿐 아니라 네 명의 남왕국 왕의 이름(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 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지서의 최종 형태에서 통일 왕국의 입장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
니다. 게다가 표제에는 유다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 앞에 나열되어 있어( 이는 암 1:1에서도 마찬가지다 ), 229) 호세아 예언의 내용이 처음부터 유다의 상황과 어느 정도 관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이 호세아( 이스라엘 ), 요엘( 유다 ), 아모스( 이스라엘 ), 오바댜( 유다 ),
222) Martin Noth, TheDeuteronomisticHistory, JSOTSup 15 (Sheffield, UK: JSOT, 1981).
223) 이런 내용은 Gordon J. Wenham, “The Deuteronomic Theology of the Book of Joshua,” JBL 90 (1971): 140-148 에서 검토되고 있다.
224) 노트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부분적으로 창세기-민수기에서 신명기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Martin Noth,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trans. Bernhard W. Anderson, Scholars Press Reprints and Translations 5 (Chico, CA: Scholars Press, 1981)를 보라.
225) 후자의 신명기 구절에 나오는 “짧은 역사적 신조”(short historical creed)는 게르하르트 폰라트가 육경 이론에 찬 성하는 주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trans. E. W. Trueman Dicken (Edinburgh: Oliver & Boyd, 1966), 3-13을 보라.
226) 수 24장은 더 큰 작품을 요약하고 결론 내리기 위해 육경 편집자가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Thomas C. Römer and Marc Z. Brettler, “Deuteronomy 34 and the Case for a Persian Hexateuch,” JBL 119 (2000): 401-419를 보라.
227) Christopher R. Seitz, The Goodly Fellowship of the Prophets: The Achievement of Association in Canon Formati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9); idem, Prophecy and Hermeneutics: Toward a New IntroductiontotheProphets, Studies in Theolog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7).
228) 이 주제에 대해서는 Grace I. Emmerson, Hosea:AnIsraeliteProphetinJudeanPerspective, JSOTSup 28 (Sheffield, UK: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56-116의 자세한 연구를 참고하라. 저자는 호세아가 북왕국 사람으로서 반유 대적 입장을 가졌을 것이라는 가정을 거부한다(Hosea, 95).
229) 유다 왕들에게 우선순위를 둔 것에 대해서는 James Nogalski, Literary Precursors to the Book of the Twelve, BZAW 217 (Berlin: de Gruyter, 1993), 85-87을 참고하라.
요나( 이스라엘 ), 미가( 유다 ) 로 번갈아 가며 등장하는 열두 선지서의 더 넓은 패턴이 뒷받침해 준다.230)
이런 도식적 배열은 예언의 위협과 약속을 두 왕국, 넓게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 백성 일
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읽는 해석학을 장려한다. 자이츠 자신은 열두 증인의 개성을 보존하는 것과
정경으로서 열두 권의 전체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것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차일즈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자이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정경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의
신학적 차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신약 성경의 예를 들자면, 현재 누가복음-사도행전에 대한 연구에서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이 누
가 모음집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두 책의 의미와 중요성을 밝히기 위한 자연스러운 단위로 간주하 며,231) 이 방법론은 많은 현대 전문가의 문법적-역사적 지향과 부합한다.232) 고대의 관행이 현대의
성경 읽기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전 세대가 성경을 읽고 해석한 방식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233)
중요한 점은 현존하는 어떤 고대 헬라어 사본에서도 누가복음이 사도행전 옆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234) 누가복음에 부여된 위치는 누가의 주요 정경적 대화 상대가 동반 책인 사도행전이 아니라 다
른 세 복음서라는 초기 독자들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상호 해석적 인 두 부분으로 구성된 논문의 한 단위로” 결합하는 대안은 고대에 채택되지 않았으며,235) 정경 배
열에서 물리적 연속성이 없다는 것은 각 권이 읽혀져야 하는 서로 다른 맥락에 대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다.236) 영어 성경의 관례적인 순서와 달리, 모든 헬라어 본문에서 사도행전은 공동서신 앞에
있으며, 이들은 고정되고 일관된 정경 단위( ‘프락사포스톨로스’ ) 로 취급된다.237) 로버트 월이 관찰한 것
처럼, 사본 전통은 “사도행전이 바울 이외 사도들의 증언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으로서 그 중요성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238)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을 결합하는 정착된 패턴은 사도행전이 비 바울파 형태의 기독교를 홍보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반면, 현대 학계는 사도행전을 다른 목적에 사용 했다( 예.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울의 초상과 바울 자신의 편지에서 사도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것의 관계 ).
230) Raymond C. Van Leeuwen, “Scribal Wisdom and Theodicy in the Book of the Twelve,” in In Search of Wisdom: Essays in Memory of John G. Gammie, ed. L. G. Perdue, B. Scott, and W. Wisema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3), 34. 이 아이디어는 C. F. Keil, The Minor Prophets, trans. J. Martin,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10 (1869; repr., Grand Rapids, MI: Eerdmans, 1980), 3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31)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는 소수의 목소리도 있다. 누가복음-사도행전의 통일성에 대한 최근 논쟁에 대한 검토는 Alan J. Bale, Genre and Narrative Coherence in the Acts of the Apostles, LNTS 514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5), 15-20을 참고하라.
232) 예. Robert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2 vols. (Philadelphia: Fortress, 1986); J. Verheyden, ed., TheUnityofLuke-Acts, BETL 142 (Leuven, Belgium: Peeters, 1999).
233) David Paul Parris, Reading the Bible with Giants: How 2000 Years of Biblical Interpretation Can Shed Light on Old Texts (Milton Keynes, Buckinghamshire, UK: Paternoster, 2006)를 보라.
234) Metzger, Canon of the New Testament, 230, 231, 296, 297.
235) Michael F. Bird, “The Unity of Luke-Acts in Recent Discussion,” JSNT 29 (2007): 440.
236) Andrew Gregory, The Reception of Luke and Acts in the Period before Irenaeus: Looking for Luke in the SecondCentury, WUNT 2/169 (Tübingen: Mohr Siebeck, 2003), 2-5, 352.
237) David C. Parker,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Manuscripts and Their Tex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283-286. ‘프락사포스톨로스’(Praxapostolos)는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을 이 순서대로 결합 한 것이다.
238) Robert W. Wall, “The Acts of the Apostles in Canonical Context,” BTB 18 (1988): 20.
현대 학계가 성경 책에 부여된 정경적 위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는 마지막 예는 룻
기를 다루는 방식이다. 룻기는 헬라어 전통에서는 사사기 다음에, 히브리어 마소라 전통에서는 잠언
다음에, 탈무드 전통에서는 시편 앞에 배치되어 있다. 현대 학계에서는 룻기의 저작 연대를 포로기
이후로 보고 통혼 결혼 금지에 대한 논쟁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방
인 아내와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 10장; 느 13:23-27 ). 이렇게 재
구성된 맥락에서 룻기는 그들의 배타주의적 입장에 저항하는 것으로 읽혀진다.239) 사실, 에스라-느
헤미야에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언급에서 은근하지만 보다 포용적인 전망의 암시를
발견할 수 있다.240) 토라를 따르겠다는 공동체 서약( 느 10:28 ) 에서도 포용적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약을 하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백성과 갈라선 모든 자”가 포함되었
기 때문이다.241) 또한 룻기는 초기 회복기의 구체적인 문제, 예를 들어 어머니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자녀 문제( 느 13:23-24 ) 나 룻과는 다른 외국인 아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모
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1:16-17; 2:12 ), 룻의 이야기가 “에
스라-느헤미야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42)
대니얼 호크는 룻기를 에스라-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 반대를 기록한 것으로 보지만, 그 개혁은 룻 과 같은 이방 여성, 즉 이방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신앙을 받아들인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
았다.243) 호크는 다른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에스라 6장과 느헤미야 10장에서 회심자를 받아들 였다는 언급을 주목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룻기와 에스라-느헤미야는 학자들이 해석할 때 정경 적 위치를 고려했다면 의심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룻기의 정경적
위치를 진지하게 고려하면 독자들이 룻기 이야기의 성경신학적 차원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경 배열을 경시하는 것은 계몽주의 이후 전개된 더 큰 지적 운동의 한 표현일 뿐이다.244) 반대 로, 신학적 해석의 실행은 이전 세대의 신자들이 물려준 성경 정경의 형태( 책의 순서와 병치를 포함 ) 를 진
239) 이 견해는 최근의 주석에서 계속 인기를 끌고 있다. 예. André LaCocque, Ruth: A Continental Commentary, trans. K. C. Hanson (Minneapolis: Fortress, 2004); Tamara Cohn Eskenazi and Tikva Frymer-Kensky, Ruth,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JPS, 2011).
240) 스 6:21: “또한 그들과 합류하여 그 땅 백성들의 부정한 것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든 사람.”
241) Peter H. W. Lau, “Gentile Incorporation into Israel in Ezra-Nehemiah?,” Biblica 90 (2009): 356-373을 보라. “스 6:21은 이런 배타적 정책의 허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Eskenazi and Frymer-Kensky, Ruth, lxxi, 41)고 지적한다.
242) Eskenazi and Frymer-Kensky, Ruth, xxv.
243) L. Daniel Hawk, Ruth, ApOTC 7B (Nottingham, UK: Apollos, 2015). 이와 대조적으로, 보다 섬세한 논의는 Marvin A. Sweeney, Tanak: A Theological and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Jewish Bible (Minneapolis: Fortress, 2012), 429433을 보라.
244) 참고. Michael C. Legaspi, The Death of Scripture and the Rise of Biblical Studies, Oxford Studies in Historical The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viii: “학문적 성경은 [18세기, 특히 요한 다피트 미하엘리스 같 은] 학자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고백적 특수성을 그대로 담은 경전으로서의 성경이 계몽주의 대학이 자신들의 목적과 지원을 이끌어 낸 사회정치적 프로젝트에 해롭다고 보았다”(괄호 안은 나의 추가).
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해야 한다.245) 브레바드 차일즈, 크리스토퍼 자이츠, 프랜시스 왓슨, 마커스 복뮐과 같은 학자들이 이 분야에 주목할 만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
경을 신학적으로 읽으려는 사람들이 책 순서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246) 하지만
그들은 소수에 속한다.
1.3.3 성경의 책 순서는 얼마나 신학적인가?
성경의 책 순서를 고려하는 것의 잠재력을 보여 주기 위해, 우리는 룻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앙
공동체에서 정립한 정경 순서의 신학적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구약 성경 책들의 특정 순서( 히브리어
정경 대 헬라어 정경 ) 를 성경 본문의 신학적 연구와 사고의 배타적 기초로 정당화하거나 장려하려는 것
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각각의 순서가 나름대로 오늘날의 독자에게 타당하고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가지 책 순서를 선호하고 다른 순서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히브리어 정경과 헬라어 정경에서 룻기에 부여된 서로 다른 위치는 그 내용을 보는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247) 룻기는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 중 사사기 다음으로 나온다. 그
이유는 이 책이 다윗을 낳은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뒤이어
나오는 사무엘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248)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
입은 내레이터가 단 한 번 언급하지만( 룻이 잉태할 수 있게 하심; 4:13 ), 이야기 속 인물들은 하나님을 반복
적으로 언급한다.249) 이에 따라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섭리로 나타난다.250) 룻
기 1장 1절은 이 책의 활동 시기를 사사 시대에 두고 있으며, 룻기의 내러티브는 베들레헴 출신 레
위인의 이야기( 삿 17:8-9 ) 와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 19:1-2 ) 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사
사기 21장은 멸종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 의 아내를 확보하기 위해 취한 과감한 조치에
대한 것이며( 삿 21:6 ), 룻기는 결국 위대한 다윗왕을 낳은 베들레헴 출신 나오미 가족을 보존하신 하
나님의 섭리를 묘사한다( 룻 4:5, 10, 18-22 ). 저자는 다윗 가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기록을 통해 다윗
245) 어거스틴의 “표징”과 “사물”의 구별에 근거하여 성경신학의 배타성을 주장하는 모든 구원사 모델에 대한 비판은
Darian Lockett, “Limitations of a Purely Salvation-Historical Approach to Biblical Theology,” HBT 39 (2017): 211-231을 참고하라. 로킷이 주장하듯이, “결국 여기서 논지는 구원사적 접근은 성경신학을 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불충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213). 로킷은 “역사적으로 재구성된 구원사가 사실 성경 자체의 가장 중요한 패턴과 형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다른 장르를 통해 신학적으로 말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연대기적 순서로는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신학적 특성(예. 하나님의 초월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다”(220) 라고 덧붙인다.
246) Childs, Church’s Guide; Seitz, Goodly Fellowship; Francis Watson, Paul and the Hermeneutics of Faith (London: T&T Clark, 2004); Bockmuehl, SeeingtheWord
247) Murray D. Gow, “Ruth, Book of,” in Dictionary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ed. Vanhoozer et al., 706은 룻기 를 다른 정경적 위치에서 읽을 때의 해석적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Andrea Beyer, Hoffnung in Bethlehem: Innerbiblische Querbezüge als Deutungshorizonte im Ruthbuch, BZAW 463 (Berlin: de Gruyter, 2010), 141-145를 참고하라.
248) Gregory Goswell, “The Book of Ruth and the House of David,” EvQ 86 (2014): 116-129.
249) 룻 1:6, 9, 16-17, 20-21; 2:12, 20; 3:10, 13; 4:11, 12, 14. Ronald M. Hals,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uth, Facet Books Biblical Series 23 (Philadelphia: Fortress, 1969).
250) 삼상 16:13, 18; 18:12, 28; 삼하 5:2.
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조상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며, 결국 메시아를 배출할
가문인 다윗 가문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한다. 룻기의 구원사적 읽기의 타당성은 예수의 족보에
여주인공 룻이 포함됨으로써( 마 1:5 ) 기독교 독자에게 확증된다.
룻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지혜의 관점에서 읽혀진 것으로 보이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룻기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에셰트-하일’ ) 에 대한 초상 바로 뒤에 나온다.251) “현숙한 여인”이라는 문
구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단 한 번, 즉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니” ) 에만 등장
한다. 잠언 31장 31절에 나오는 묘사(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 는 룻에 딱 들어맞고,
룻기 3장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면서 “네가 현숙한 여자[‘에셰트-하일’]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직역. ‘내 민족의 모든 문’]이 다 아느니라”라고 말하고 있고, 성문에서 만난 사람들과 장로들
이 룻을 칭찬하는 것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4:11-12 ). 룻기가 잠언 바로 뒤에 정경으로 배치된 것은
모압 여인 룻이 잠언에서 가르치고 잠언 31장의 모범적인 여성에서 구현된 경건의 살아 있는 사례
로 간주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룻기는 일반적으로 지혜서로 생각되지 않으며, 확실히 내러티브 등장
인물( dramatis personae, ‘드라마티스 페르소나이’ ) 중 누구도 “지혜로운” 인물로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이 이
야기에는 지혜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이 내러티브는 룻이라는 인
물을 통해 윤리적 패러다임,252) 즉, 독자가 본받을 만한 행동 패턴을 제공한다.253)
바바 바트라의 책 목록에서 룻기는 시편 앞에 나와서 시편의 주요 저자인 다윗의 전 역사로 읽을 수 있는데,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피하는”( 어근 ‘하사’ ) 사람으로
나타난다( 예. 시 2:12; 7:1; 11:1; 16:1 ) 254) 이것은 이렇게 정경 순서를 정한 고대 독자들이 여주인공 룻을 시
편에 내재된 윤리의 구체화로 보고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다윗은 시편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향한다.255) 룻기와 시편의 결합은 “피난처”, “날개”, “인자”라는 핵심 용어가 포함된 두 책 사이의
주제적 연관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책 배열은 룻과 시편 기자 다윗의 연관성을 강 조하며, 룻은 시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라는 내재된 윤리를 의인화한다. 룻이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 256) 를 구현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기름부음 받은 자, 다
251) Gregory Goswell, “Is Ruth also among the Wise?,” in Exploring Old Testament Wisdom: Literature and Themes, ed. David G. Firth and Lindsay Wilson (London: Apollos, 2016), 115-133 참고.
252) R. B. Y. Scott, TheWayofWisdomintheOldTestament (New York: Macmillan, 1971), 85-87.
253) 예. 근면에 대한 윤리(룻 2:7, 17; 참고. 잠 6:6-11; 10:26; 13:4). 또한 이 책은 잘 알려진 지혜서에서 볼 수 있는 주제 들(예. 적합한 아내와의 결혼, 신정론, 섭리, 보상,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이 포함되어 있다. Katharine Dell, “Didactic Intertextuality: Proverbial Wisdom as Illustrated in Ruth,” in Reading Proverbs Intertextually, ed. Katharine Dell and Will Kynes, LHBOTS 629 (London: T&T Clark, 2019), 103-114 참고.
254) 룻 2:12: “네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하러 왔도다.” Jerome F. D. Creach, Yahweh as Refuge and the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JSOTSup 217 (Sheffield, UK: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255) Peter H. W. Lau and Gregory Goswell, Unceasing Kindness: A Biblical Theology of Ruth, NSBT 41 (London: Apollos, 2016), 53-70.
256) 제공된 번역인 “인자”(kindness)은 Francis I. Andersen, “Yahweh, the Kind and Sensitive God,” in God Who Is Rich in Mercy: Essays Presented to Dr. D. B. Knox, ed. Peter T. O’Brien and David G. Peterson (Homebush West, NSW, Australia: Lancer, 1986), 41-88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히브리어 용어가 하나님의 비의무적인 관대한 행 동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앤더슨은 pp. 59-60에서 룻기에 나타난 이 용어의 세 가지 용례를 살펴본다
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인자를] 베푸시는 분”( 시 18:50 ) 으로 찬양한다.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
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보호하는 “날개”( ‘카나프’ ) 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설명
이 필요 없는 은유로서 그 의미가 즉시 이해되며 실제로 이 모티프는 시편에서 여러 번 발견된다.257)
이런 식으로, 위대한 시편 기자의 조상이 된 룻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께 간구하는 다윗의 경건을 예고한다.258) 주목할 만한 주제의 연결 고리들은 모압 여인 룻을 시편의
경건 모델로 제시한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잠언 31장 다음에 룻기, 시편 앞에 룻기 등 서로 다른 정경 순서에는 각각 논
리가 있으며, 어느 한 순서가 다른 두 순서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구약 성경의 책 순서를
구성하는 데는 한 가지 이상의 가능한 원칙이 있으며, 어떤 근거가 작용하는지 추측하는 것은 독자
의 몫이다. 성경의 모든 책은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을 다루고 있어서 강조점과 관심사가 다를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책을 똑같은 신학의 틀에 억지로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경 정 경의 구성 부분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다양성은 하나
님의 백성이 처했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상기하고 활용해야 한다.
고대 독자들은 룻기를 헬라어 정경 전통에서 역사서에 포함시켰고, 히브리어 정경에서는 잠언
31장과 나란히 배치했다. 이런 상이한 배치는 지혜 이상( 룻이라는 인물로 예시 ) 과 룻기라는 내러티브 책 의 구원사적 초점( 다윗과의 연관성을 고려함 ) 이 양립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정경 해
석에 있어 타협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것은 윤리와 성경신학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 를 확인시켜 주며, 성경의 신학적 이해에는 기독교 형성을 위한 자원으로서 구약 내러티브의 윤리
적 함의에 대한 탐구가 포함된다.259) 실제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윤리 연구는 신학의 우산 아래 놓여 있다.
성경 정경은 정경의 범위에서 본문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며, 후대의 독자가 특정 책을 정경의 대
화 상대( 예. 룻기와 시편 ) 로 나란히 배치하면서 이런 역동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 성경책을 다른 성경
책과 연관 지어 읽으면 가능한 의미의 범위가 좁아지고, 한 정경의 내용이 다른 정경의 내용을 밝혀
줌으로써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 열린다. 내러티브와 시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중요성은 룻기와 시편
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확인되는데,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룬 역사( 룻의 이야기 ) 와
신학( 시편의 탄원, 송영, 기도로 표현됨 ) 이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고찰은 하나님의 성품, 방식, 목적에 대한 이해, 즉 신학을 낳고 예배로 이어진다. 또한
257) 시 17:8; 36:7; 57:1; 61:4; 63:7; 91:4. Alec Basson, Divine Metaphors in Selected Hebrew Psalms of Lamentation, FAT 2/15 (Tübingen: Mohr Siebeck, 2006), 99-100.
258) 이 시편들과 룻 2:12의 유사성은 Gert Kwakkel, “Under Yahweh’s Wings,” in Metaphors in the Psalms, ed. Antje Labahn and Pierre Van Hecke, BETL 231 (Leuven, Belgium: Peeters, 2010), 143에서 지적되었다.
259) 예. Bruce C. Birch, “Old Testament Narrative and Moral Address,” in Canon, Theology, and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in Honor of Brevard S. Childs, ed. Gene M. Tucker, David L. Petersen, and Robert R. Wilson (Philadelphia: Fortress, 1988), 75–91; Douglas S. Earl, Reading Old Testament Narrative as Christian Scripture, JTISup 17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7), 7장.
룻기-시편 대조로 시편의 경건한 표현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인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 예. 룻의 이야기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듯 ) 에서 도출된 유효한 결론
으로 볼 수 있음이 드러난다. 성경의 책 순서가 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이
제 성경신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1.4 성경신학과 윤리
바울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는 데 유익하다고 말한다( 딤후 3:16 ). 문맥상 이 언급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지만, 물론 이 본문은 디모데후서가 포함된 신약 성경 전체에 파생적으로 적용
된다.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 단순히 가정하고 반드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윤리적 가르침이
담겨 있다. 실제로 바울은 구약이 신자의 도덕적 무장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260) 이 본문에서 “가
르침”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라는 표현을 보면 바울이 주
로 신자를 위한 도덕적 자료로서 구약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261) 신학( 하나
님과 그의 방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 과 윤리(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를 구분하는 것은 옳지만, 성경 계시의 이 두 측면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 책에서 성경의 줄거리에 나타난 성경신학적 주제
와 윤리적 가르침을 모두 탐구하는 것은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바에 부응하려는 바로 이
런 이유 때문이다.
1.4.1 성경신학과 윤리의 관계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신약 성경이 분명히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마
19:18-19; 롬 13:8-10; 딤전 1:8-11 ) 십계명( 출 20:1-17; 신 5:1-21 ) 뿐 아니라, 안식일 명령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반 적인 휴식의 원칙을 지지할 수 있지만 ), 구약의 더 광범위한 교훈 부분( 예. 출 20-23장; 신 5-26장 ) 도 생각해 보아 야 한다. 지혜 문학( 예. 잠언 ) 은 예수와 신약 성경 저자들이 산상수훈( 마 5-7장 ),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야고보서 등의 부분에서 인용하는 도덕적 교훈의 또 다른 원천이다. 선지자들의 사회적 양심( 예. 암 2:6-7; 4:1; 8:4-6 ) 은 수 세기에 걸쳐 교회에 대한 지침과 책망의 원천이 되어 왔다. 구약 성경 내러티
브의 윤리적 적용 역시 구속력을 갖는다( 예. 마 12:41-42; 막 2:25-26 ). 또한 바울의 신학과 윤리학에서 구
약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쉽게 알 수 있다.262) 리처드 헤이스가 지적했듯이, 로마서 4장 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모든 신자의 신앙 모범으로 보고,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타난 믿음과 행위의
260) 딤후 3: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261) 이런 목적을 위해 구약 성경을 사용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Walter C. Kaiser Jr., Toward Old Testament Ethics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3); Bruce C. Birch, Let Justice Roll Down: The Old Testament, Ethics, and Christian Lif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1); Christopher J. H. Wright, Old Testament Ethics for thePeopleofGod (Leicester, UK: IVP, 2004)을 참고하라.
262) 예를 들어, 고전 10:1-11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Gordon J. Wenham, Story as Torah: ReadingtheOldTestamentEthically, OTS [Edinburgh: T&T Clark, 2000], 129-134).
원칙을 그리스도의 오심 전후 하나님 백성의 행동에 적용한다. 사도는 로마와 고린도 독자들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그 권위와 타당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한다.263)
다른 신약 성경 저자들은 독자들에게도 비슷한 것을 기대한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지도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이야기를 활용하고( 히 3:7-19 ),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삶에서 선행의 예를 찾고( 약 2:21-25 ), 선지자들과 욥은 고난 속에서 굳건함의 모범으로( 5:10-11 ), 엘리
야는 끈기 있는 기도의 모범으로 인용한다( 5:17 ). 신약 성경 내러티브 부분의 윤리적 사용에도 동일
한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로버트 태너힐은 사도행전이 사람들이 선한 또는 나쁜 행동의 모델
이 되는 장면을 서술함으로써 윤리적 지침을 제공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증언, 리더십, 사명
과 통치 권위, 소유의 윤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64)
구약 성경의 윤리가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 데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몇 가지
공통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첫째,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만큼 윤리적 요구를 제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265)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1-48절
의 여섯 가지 반제( “너희는……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라고 이르노라” ) 는 제대로 해석하면 구약 성경
자체를 부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실천하고 가르치는 명령을 비튼 것
이다( 참고. 마 5:17-20 ). 또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두 가지 큰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의 윤리( 마 22:36-40 ) 뿐 아니라 신약의 윤리도 요약한다.266)
둘째, 윤리적 가르침을 위해 구약 성경을 사용하면 율법주의, 즉 복음의 기초와 분리된 윤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이것이 그레이엄 골즈워디의 저서 『성경 전체를 기독교 성경으로 설교하 기』가 겨냥한 목표로 보이는데, 그는 이 책에서 구약의 성품 연구로 회귀하는 일의 위험성을 경고 한다.267) 골즈워디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율법주의며, 그에 대한 해독제로 그가 옹호하는 성경신
학 방법이 나타난다. 그러나 십계명의 서문( 그리고 그 문맥 ) 이 보여 주듯( 출 20:2 ) 구약 자체에는 율법주 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금지의 전제가 ( 대부분 ) 출애굽 구원이므로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268) 또한 할례( 수 5:2-7 ) 와 유월절( 대하
30:26 ) 같은 구약 시대의 많은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언급도 없고, 선지자 시대까지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구약 성경은 모세 율법의 세부 사항을 엄격하게 이
263) Richard B. Hays, The Conversion of the Imagination: Paul as Interpreter of Israel’s Scripture (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147-162.
264) Robert C. Tannehill, “Acts of the Apostles and Ethics,” Interpretation 66 (2012): 270-282; 참고. Gert J. Steyn, “Driven by Conviction and Attitude! Ethics in the Acts of the Apostles,” in Identity, Ethics, and Ethos in the New Testament, ed. Jan Gabriel van der Watt, BZNW 141 (Berlin: de Gruyter, 2006), 136-162.
265) 참고. 예. 마 19:8a: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러나 예수가 마 19:5에서 창 2:24의 평생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적이고 영속적인 계획을 인용한 것에 주목하라.
266) 참고. 요 13:34-35; 14:15; 롬 12:9-10; 13:8; 히 13:1.
267) Graeme Goldsworthy,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The Application of Biblical Theology to ExpositoryPreaching (Grand Rapids, MI: Eerdmans, 1999), 99.
268) 롬 12:1의 “그러므로”라는 부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바울의 도덕적 교훈을 앞선 열한 장의 가르침과 연결하는 데 비슷하게 기능한다.
행하는 모습을 묘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
는”( 마 22:29 ) 바리새인의 눈으로 구약을 읽는 것은 잘못이다. 다시 말해, 구약의 윤리는 신약의 윤리
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역동성과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물론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롬 6:14 ).
셋째, 많은 사람은 구약의 윤리가 수 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유용한지, 또는 신약이 제정된 후 구약 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해 한다. 그러나 종종 그 이야기들은 믿음, 환대, 겸손, 기도, 인내와 같이 현재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미덕”을 장려하거나 성적 부도덕, 탐
욕, 우상숭배 같은 전형적인 죄에 대해 경고한다.269) 더욱이 오경과 지혜서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지
침 뒤에는 통용 기한 꼬리표가 없는 기본적인 도덕 원칙이 있다( 예. 하나님 경외: 신 6:2; 잠 1:7 ). 또한 새로
운 창조 세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신자들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도록 배웠 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여전히 죄와 이기심과 폭력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모든 세대의 신자
가 직면하는 도덕적 선택은 다르지 않다.
넷째, 가나안 족속의 멸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가족 해체, 시편에서 발견되는 원수에 대한 저주
등 이른바 “도덕적 어려움”에 대해 일부에서는 구약 성경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증거로 간주하지 만, 존 브라이트의 다음 대답이 적절할 것이다. “나는 구약 성경이 때때로 우리의 기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의 ‘기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흥미롭고 조 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270)
신약 성경의 경고와 명령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도덕적 지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석가가 신약 성경의 교리와 윤리 사이의 본질적인 연관성, 즉 전자가 후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 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산상
수훈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절정으로 삼는 마태복음에서 종종 분리되어 그 윤리가 열방의 순종을
주장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사회적 복음”으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 왔다.271)
마찬가지로, 여러 바울서신에서 두 부분( 교리와 윤리 ) 의 내용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언 스미스가 지적했듯,272) 골로새서에서 비정상적인 철학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대
부분의 학문적 시도는 주로 2장 8-23절에 초점을 맞추어 1-2장만을 다루고 있다. 스미스는 이 편 지의 파레네시스 ( 권면 ) 가 이단으로 대표되는 도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3장 1절에서의
장 구분은 3장 1-4절(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 이 2장 20-23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
269) Wenham, StoryasTorah, 130.
270) John Bright, The Authorit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 Baker, 1975), 77-78. 이런 개별 도덕 문제는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271) 참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72) Ian K. Smith, Heavenly Perspective: A Study of the Apostle Paul’s Response to a Jewish Mystical Movement at Colossae, LNTS 326 (London: T&T Clark, 2006).
께 죽었으면……” ) 과 연결되고 그것의 반대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3장 1절과 다 음 절은 비록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이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되며 그럼에도 이제 이단들 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273) 사실 골로새서 3장 1-4절은 편지의 권면 부분
으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이 있으며, 3장과 4장의 바울의 윤리는 그가 선포한 앞의 교리에서 발전한 것이다.
1.4.2 내러티브와 시의 윤리적 의의 파악
또 다른 문제는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 구약 내러티브에서 윤리적 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의 어려움
인데, 영웅과 악당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환원주의적이기 때문이다.274) 사무엘서( 특히 삼하 1020장 ) 에 나타나는 다윗은 그렇게 쉽게 분류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인물이지만, 후대의 왕들에게 예
배에서 정통 여호와 신앙의 도덕 기준을 제시하는 열왕기에서는 동일한 다윗이 아니다.275) 나오미
는 독자들이 바라는 만큼의 훌륭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지 않지만276) 룻은 한결같이 고귀한 모습으
로 그려지고 있다.277) 요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단지 아주 나쁜 선지자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 와 애증의 관계를 갖게 된다. 이런 목록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개신교 주석이 새로운 “성
인 상”을 세워 파괴된 석고상을 대체할 위험이 존재한다.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도덕주의적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 인물들의 모호함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므로 때때로 우리는 그들을 칭
찬해야 할지 비난해야 할지 모른다.278) 우리의 설교는 도덕적 적용을 제공해야 하지만, 조잡한 도덕
적 설교는 피해야 한다. 성경의 내레이터는 거의 설교하지 않으며, 교훈주의에 빠져 등장인물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비난
하지 않는다. 이런 부족함은 언제나 독자가 채울 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의 판단은 잘
못된 것이 되기 쉽다.279)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구약 성경은
예수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모델, 즉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같은 모델을 제공하지 않기 때
문에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고든 웬함은 윤리 지침을 위해 구약의 내러
티브를 사용할 때 독자가 다양한 내러티브 특징으로 암호화된 함축 독자를 위해 함축된 저자와 그 저자의 메시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80) 구약의 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단서
273) 골 3:1-4와 2:6-23의 관계에 대해서는 Smith, HeavenlyPerspective, 173-184를 참고하라.
274) 이는 신약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Sidney Greidanus,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Eugene, OR: Wipf & Stock, 2001)를 보라.
275) 예. 왕하 14:3; 18:3; 22:2. 그러나 열왕기의 저자는 다윗이 법궤를 위해 행한 일(삼하 6-7장)에서 다윗의 경건의 최 고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조가 너무 과장된 것은 아니다.
276) 예를 들어, 나오미는 룻이 밭에서 하루를 일한 후에야 룻의 안녕을 생각한다(룻 2:22).
277) D. N. Fewell and D. M. Gunn, Compromising Redemption: Relating Characters in the Book of Ruth, Literary Currents in Biblical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0).
278) 예를 들어, 수 2:4-5에서 라합이 말한 “거짓말”; 참고. 삼상 19:14; 삼하 17:20.
279) 예를 들어, 나오미 가족의 죽음을 약속의 땅을 떠난 죄 때문이라고 보는 것(룻 1:1-5).
280) Wenham, Story as Torah, 14-15; 참고. A. J. Culp, Puzzling Portraits: Seeing the Old Testament’s Confusing Characters as Ethical Models (Eugene, OR: Wipf & Stock, 2013).
를 제공한다. 즉 윤리적 판단을 인물의 입에 담아 두거나( 예. 삼하 13:13: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
나가 되리라” ), 행위가 묘사되는 방식으로( 예. 창 16:6: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니” ), 내레이터의 ( 드문 ) 도덕적 설명 으로( 예. 삼하 11:27: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 어떤 행동에 대한 다른 등장인물의 반응으
로( 예. 삼하 13:22 ), 어떤 행동의 해로운 결과로( 예. 창 16:4 ), 일련의 장면에서 동일한 특성을 보여 줌으로
써( 예. 외국인에 대한 족장들의 긍정적인 태도 ) 그렇게 한다. 우리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성경 책의
윤리적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많은 시편의 표제에 나타나는 전례적 지침들281) 을 고려할 때 시편과 제의282) 예배와의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경에 나타난 시편은 모세의 “다섯 책”을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
게( 참고. 수 1:8 ) 시편의 다섯 책에 담긴 거룩한 가르침( 1:2 ) 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는 것을 보여 준다.283) 웬함이 지적한 것처럼, 시편 사용자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
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정한 삶의 방식을 승인하는 축복( 예. 시 1:1; 2:12; 84:12 ), 사용자가 표현된 정서
와 동일시하도록 유도하는 일인칭 표현의 존재( 예. 시 34:1 ), 악인과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행동이 매력
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 시편 암송이 윤리적 정서에 대한 사용자들의 적극
적인 동의를 수반하여( 예. 시 7:8-9 ), 맹세에 가까운 방식( 시 119:106 ). 284) 다시 말해, 시편은 단순히 하나
님께 드린 진심 어린 생각과 감정을 말로 읽어내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거기에 나타난 종교
적 감정의 발산은 하나님 백성에게 그들이 마땅히 무엇을 느끼고 있어야 하고, 마땅히 무엇을 행하
고 있어야 하고, 기도에서 마땅히 무엇을 말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
1.5 비유: 성경신학은 사회자가 있는 가족 대화
우리는 성경신학이 사회자가 있는 가족 간의 대화와 같다는 비유로 이 서론 장을 마무리한다. 이 책에서 취한 접근 방식은 성경 66권 모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신념에 기초 한다. 책별 접근 방식은 성경의 장대한 메타내러티브에 비추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모든 성경
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을 사회자가 있는 가족 간의 대화라고 생각하자. 가정에도 부모가 있고, 더 많은 발언권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는 나이 든 자녀가 있고, 때 때로 발언권을 얻기 어려운 어린 자녀가 있다. 토론의 사회를 보는 사람은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경
청되고 모든 사람의 발언권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이 비유에서 사회자는 성경신학자이고, 다양한 가족 구성원은 성경의 저자와 그들이 쓴 개별 책에 해당한다. 사회자는 이런 각 저자와 책을 정경 대
281) 예를 들어, 시 4편의 표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제의적 희생과 예배에 시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Gordon J. Wenham, PsalmsasTorah:ReadingBiblicalSongEthically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2), 11-19를 참고하라.
282) 이 책에서 “제의”(cult)와 “제의적”(cultic)이라는 단어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체계와 관련 있다.
283) 시편은 암송되어 지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라는 증거는 Wenham, Psalms as Torah, 41-56을 참고 하라.
284) Wenham, Psalms as Torah, 65-76을 보라.
화에 적절히 참여시키려고 노력한다.
사회자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가족 대화 참가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며 이 는 “무엇이 있는지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경청하는 “인식의 해석학”이라는 아돌프 슐라터의 요구
와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다.285) 사회자는 또한 케빈 밴후저와 마찬가지로 성경 저자들의 윤리적 권
리를 존중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286) 사회자( 즉, 성경신학자, 우리의 경우 이 책의 저자들 ) 는 가끔 지금까지
의 결과를 요약할 때가 있다. 즉 사회자는 특정한 연관성을 도출하고, 공통점을 지적하고, 다양하게
제시된 개별 의견을 더 큰 주제로 엮어 성경의 장대한 메타내러티브에 연결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
자는 성경의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성경의 근본적인 통일성 맥락에서 성경의 다양성에 대한 헌
신을 바탕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이며, 압제적으로나 심지어 독재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원탁 토론의 그림( 케어드 ), 교향곡의 그림( 지휘자의 중요한 역할 ), 287) 연극 공
연의 그림( 극작가의 중요한 역할; 밴후저 ) 을 사용했다.288) 이 모든 비유의 공통점은 각 경우에 ( 성경 ) 신학자
는 성경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기술과 겸손으로 끌어내는 촉진자 역할을 행한다는 것이다.
좋은 가족 토론과 마찬가지로, 이 책이 끝날 때 우리의 목표는 말하자면 모든 성경 저자가 사
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평가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다. 그
런 시나리오에서는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 제시 속에서 가족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전체 가 부분보다 크며 다양성 속에서만 성경 계시의 온전한 진리가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 이 들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런 정경 대화를 벗어날 때,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를 바란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차가 주차장에서 출발할 때 “당신은 이제 당신의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친숙한 표지판을 볼 때처럼, 성경의 개인 윤리, 공동체 윤리, 선교 윤리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섬기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의 부르심을 느낄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경적 가족 대화를 진행할 때 여러분이 적극적인 경청자로서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285) Schlatter, HistoryoftheChrist, 18.
286) Vanhoozer, IsThereaMeaninginThisText? 287) 퀸 모지어(Quinn Mosier, 아버지인 커트 모지어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휘자)가 우리 중 한 명에게 지적했듯이 지휘 자는 교향곡의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특정 대사를 확실히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주 선율이 멜로디와 적 절하게 상호작용하고 오케스트라의 밸런스가 미세하게 조율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물론 무엇보다도 지휘 자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고립된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 동시에 연주하는 잡동사니에 불과할 것이다!
288) G. B. Caird,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completed and ed. by L. D. Hurst, rev. ed. (Oxford: Clarendon, 1995); Mark Strom, The Symphony of Scripture: Making Sense of the Bible’s Many Themes (Phillipsburg, NJ: P&R, 2001); Vanhoozer, Drama of Doct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