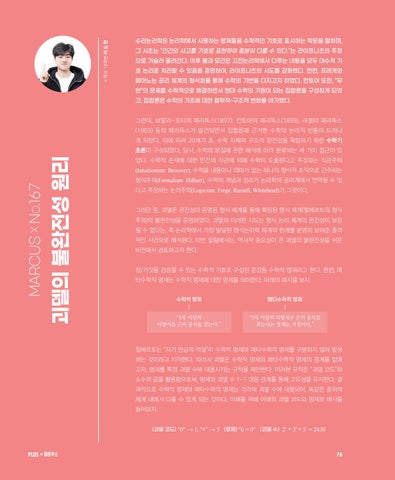수학과 18학번 이 도 현
수리논리학은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명제들을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하는 학문을 말하며, 그 시초는 “인간의 사고를 기호로 표현하여 충분히 다룰 수 있다. ”는 라이프니츠의 주장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불과 모간은 고전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모두 대수적 기 호 논리로 처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라이프니츠의 시도를 강화했다. 한편, 프레게와 페아노는 공리 체계의 형식화를 통해 수학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칸토어 또한, “무 한”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면서 현대 수학의 기원이 되는 집합론을 구성하게 되었 고, 집합론은 수학의 기초에 대한 철학적-구조적 변화를 야기했다. 그런데, 브랄리-포티의 패러독스(1897), 칸토어의 패러독스(1899), 러셀의 패러독스 (1903) 등의 패러독스가 발견되면서 집합론에 근거한 수학의 논리적 빈틈이 드러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 수학 자체의 구조적 완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수학기
괴델의 불완전성 원리
MARCUS x No.167
초론이 구성되었다. 당시, 수학의 본질에 관한 해석에 따라 분류되는 세 가지 접근이 있 었다. 수학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직관에 의해 수학이 도출된다고 주장하는 직관주의 (Intuitionism: Brouwer), 수학을 내용이나 의미가 없는 하나의 형식적 조작으로 간주하는 형식주의(Formalism: Hilbert), 수학의 개념과 정리가 논리학의 공리계에서 연역될 수 있 다고 주장하는 논리주의(Logicism: Frege, Russell, Whitehead)가 그것이다. 그러던 중, 괴델은 완전성이 증명된 형식 체계를 통해 확장된 형식 체계(힐베르트의 형식 주의)의 불완전성을 증명하였다. 괴델의 이러한 시도는 형식 논리 체계의 완전성이 보장 될 수 없다는, 즉 논리학에서 가장 발달된 형식논리학 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 충격 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역사적 중요성이 큰 괴델의 불완전성을 쉬운 버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참/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수학적 기호로 구성된 문장을 수학적 명제라고 한다. 한편, 메 타수학적 명제는 수학적 명제에 대한 명제를 의미한다. 아래의 예시를 보자. 수학적 명제
메타수학적 명제
“5차 이상의 다항식은 근의 공식을 갖는다.”
“5차 이상의 다항식은 근의 공식을 갖는다는 명제는 거짓이다.”
힐베르트는 “자기 언급의 역설”이 수학적 명제와 메타수학적 명제를 구분하지 않아 발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괴델은 수학적 명제와 메타수학적 명제의 경계를 없애 고자, 명제를 특정 괴델 수에 대응시키는 규칙을 제안한다. 이러한 규칙은 “괴델 코드”와 소수의 곱을 활용함으로써, 명제와 괴델 수 1-1 대응 관계를 통해 고유성을 유지한다. 결 과적으로 수학적 명제와 메타수학적 명제는 각각의 괴델 수에 대응되어, 똑같은 층위의 체계 내에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해를 위해 아래의 괴델 코드와 명제로 예시를 들어보자. (괴델 코드) "0" → 1, "=" → 5 (명제) "0 = 0" (괴델 수) 21 * 35 * 51 = 2430
PLUS • 마르쿠스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