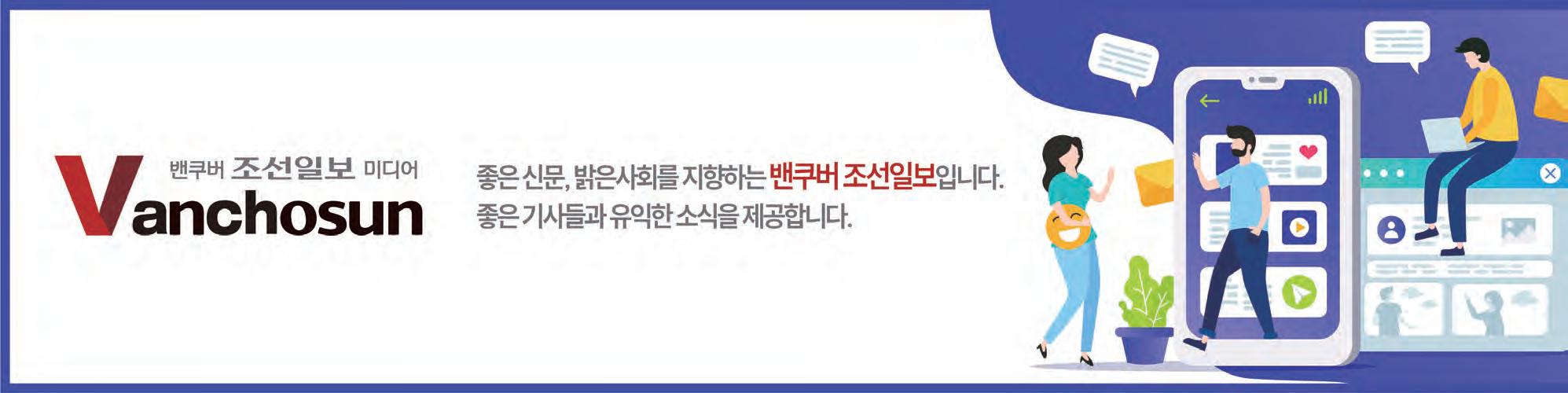THE BOTTOM DRAWER

내가 살던 낙동강 상류에는 유달리 풀꽃이 많았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그 풀꽃을 따서 강물에 띄워 보내며 들찔레
새순을 꺾어 먹던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내 이웃에
초등학교 선생 한 분이 계셨다. 어린 내 눈엔 그분이 늘 우
러러 보였다. 강마을, 농촌에서 태어나 비범한 재주도 없을
것 같아 소년 적 꿈이래야 고향 초등학교 훈장이 되어 풀
꽃처럼 사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어려서 나는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 때는
읽을 책도 많지 않았지만··· 집안 형들이 주는 어떤 책은
의미도 모르면서 그래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런
나에게 책에기록된 글을 쓴다는 것은 내 영역 밖의 일로
생각되었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
러러 보였다.
세월이 한참 지나 나에게도 드디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찾아왔다. 내 나이 칠순을 바라보던 어느 날 남은 세월을
좀 더 보람을 가지고 살고픈 마음에서 에버그린 아카데미
를 섬기면서 거기서 만나게 된 사람들의 추천으로 문인협
회에 수필로 등단하며 마침내 내 인생의 큰 나무 같은 분
을 만나게 되었다. 시인이자 소설가이신 늘샘 반병섭 목사
님이 바로 그분이셨다. 매주 토요일이면 습작한 글을 가지
고 목사님 댁에서 가까운 맥도날드에서 피쉬버거와 커피
를 시켜 놓고 몇몇 분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때로
는 자신 없어하는 나에게 목사님은 ‘수필은 나이 먹음의 문
학’이라시며 지금이 수필을 쓸 때라고 격려해 주셨다. 약
일 년을 목사님과 함께 했던 세월 속에서 나름 애쓴 가운
데 마침내 나의 수필이 ‘순수문학’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
었고 그 이듬해에 (사)한국문인협회에 등단하게 되었다. 한국문협 밴쿠버지부 회원으로 머물면서 또 다른 인연
중에 하나는 심정석 선생님을 만난 것이다. 내가 처음 심
선생님을 만난 것은 1982년 5월 이곳 한전지사(당시 석탄
과 우라늄 수입이 주 업무)로 발령을 받은 때였다. 같은 교 회에 출석하던 당시 심섬생님께서는 교회학교 6학년인 아
들의 담임을 맡아 봉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지금까지도 기
억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그해 추수감사절(Thanks giving day)을 맞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만을 초정
하여 맛있는 turkey 구이를 대접하셨던 것이다. 당시 심선
생님께서 UBC 대학 교수로 계셨고 사모님께서는 같은 대
학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다. 그 후 심선생님께서는
Alberta Edmonton 대학으로 옮기시고 나는 3년의 임기를
끝으로 다시 한전 본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 후 1987년 밴쿠버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심선생님과
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중
2006년 나의 장로 은퇴식을 하던 자리에서 21년 만에 심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심선생님께서는 연변과 기
대와 평양과 기대를 거치면서 나와 심선생님은 서로가 은
퇴 후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옛정을 다시 찾게 된 것이다.
연이란 참으로 끈끈한 것임을 실감하게 된다. 마침 심선생
님 께서도 밴쿠버 문협에 등단하시어 지금은 함께 수필을
쓰며 남은 세월을 보내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을 통해 심선
생님과 나는 지난 45년의 세월 속에서 3번의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이것이 어찌 보통의 인연이겠는가?
어느덧 내 나이 인생의 늦은 오후가 왔음을 의식하게 된
다. 약간은 아쉽고 초조해진다. 지나온 세월보다 남은 삶
이 더욱 짧아 보이는데도 풀릴지 않고 알쏭달쏭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어렸을 때엔 초연히 흘러가는 물 섶에 피어나던 들풀의
아름다움처럼 더 자유롭고 더 조용하고 그러나 깊은 사색 과 함께 살고 싶었다. 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글을 쓴다 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일 것만 같다. 글을 쓰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맑고 투명한 거울이기 때문이 다. 때로 한숨이 나오거나, 그리움으로 사무칠 때나 외로
움이 깊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 나를 위로하는 것은 결 국 글이다.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 인생의 모습을 돌여다보는 성찰 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 이 문학의 본
연임을 강조하시던 영원한 스승 늘샘 반병섭 목사님이 오 늘 따라 더욱 그립기만 하다. 반목사님은 이미 안계시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남은 삶과 글의 인연을 이어 갈 심박사님이 나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다.
들풀 언덕에서 찔레를 껶으며 초등학교 선생을 꿈꾸던
어린 소년이, 노년이 되어 문향에 젖어 글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지난 20년의 세월이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된 시간이었음을 느끼게 된다.

Poem by Ahn
These days, I am arranging the bottom drawer in my closet more often.
In there, the shadows of my yesteryear that I did not let go gathered like cicada skins.
As the hinges rusted with time, most of them were gone, yet some remain and grow older together like a folk village.
A chill wind blows there, resembling a late-fall evening.
The stations I’ve passed through in my life journey unfold:
The innocent young stargazer’s green dreams; The settler’s sweaty midsummer days on gravel roads;
The thirst of an autumn-woman wandering the seashore looking for her long-lost poems; Now, all are but old clothes that fit me no longer. Many things are thrown away, but some are buried deep in the bottom drawer of my heart.
Gently, I smooth them out one by one and lay them down.
Together with them, my unsung love poem too. I close the drawer again, slowly… very slowly as if closing the door of my dear old native home. My heart hears the sound of the River of Time coming out of the closed bottom drawer.



































철저한 전략과 분석! Smart Buying & Selling
■ 경력: 15 years+
■ 실력: 실적 상위 0.1% (MLS FVREB)
메달리언 클럽멤버
■ 열정: 7am-11pm 7days a week (무료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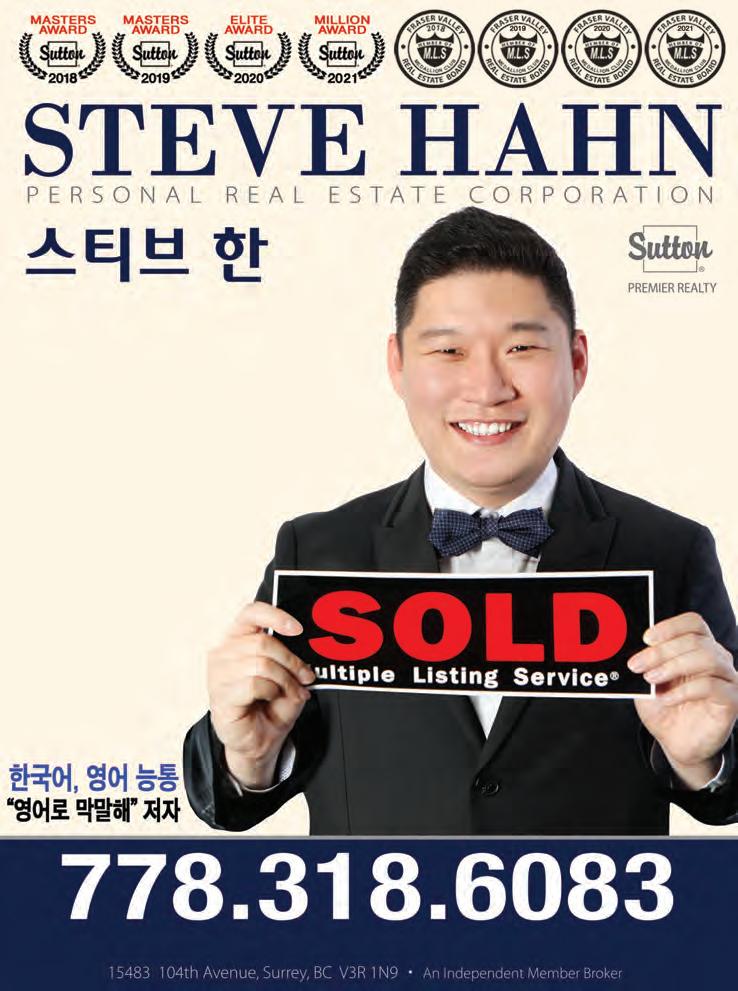
www. MrOpenHouse.ca


‘밥 한 끼’의 평범함과 위대함을 오늘도 나눈다 나 역시 노숙인이었기에
【아무튼, 주말】

아산상
말을 쓰지 않는다. 그저 ‘밥집’이고, ‘ 손님’일 뿐. 컵라면 5개에서 시작한 밥 집은 이제 일주일에 400명의 밥 한 끼 를 책임지는 곳이 됐다. 성북천 인근에 서 직접 나눠주는 도시락이 300인분, 서울역 인근 노숙인 센터로 보내는 도
시락이 100인분이다.
김 대표는 “아내가 없었으면 하지
못했을 일”이라고 했다. 남편이 노숙
인 밥 주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중소
무역 회사에 다니던 아내 김옥란(53)
씨는 잔소리 대신 스테인리스 식판 30
개를 내밀었다. 플라스틱 식기는 애들
장난감 같지 않냐면서. 2019년 남편이
공황장애를 겪자, 직장을 그만두고 은
둔·고립 청년들 회복을 돕는 ‘푸른고
래 리커버리 센터’를 설립한 것도 아내
였다. 밥집을 찾는 청년이 많아지는 것
을 보고, 20·30대 청년에게 집중하는 것이 노숙을 예방하는 ‘골든타임’임을
확신하면서다.
지난 25일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 장 정몽준)은 노숙인과 고립·은둔 청 년들의 회복과 자립에 힘쓴 공로로 이
식사 대접
봉사 덕분에 가능

부부에게 아산상 사회봉사상(상금 2억 원)을 수여했다. 아산상 관계자는 “이
부문에서 부부 수상자가 나온 건 2012 년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나도 용산역 노숙인이었다 1997년 12월 31일, 김현일은 서울 명
동성당 앞 무료 배식소에 줄을 서 있었 다. 한국인이라면 1997년은 잊기 어려
운 해. 빚을 내 경기도 신도시 일대에 서 신문 보급소를 운영하던 그도 마찬 가지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 기가 터지자 신문 구독이 끊겼다. 사무 실 겸 살림집이었던 보급소가 문을 닫 자 당장 세 식구 갈 곳이 없었다. 갓 돌 지난 첫째 아이와 둘째를 임신 중인 아 내는 처가로, 그는 돈 벌어 오겠다며 거 리로 나섰다.

-노숙을 얼마나 한 건가요. 김현일(이하 일): “저는 제가 생활력 강한 사람이라, 금세 일어설 줄 알았어 요. 몸으로 하는 일은 거의 안 해 본 게 없거든요. 그런데 IMF 때는 어딜 가 든 일이 없더군요. 결국 서울역, 용산 역, 을지로 일대에서 5개월간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거리마다 그렇게 쏟아 진 가장들이 넘쳐났어요.” 아내는 “수 년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노숙인 무료 급식소도 그때 가 본 건 가요. 일: “연말이라 성당 앞에서 한 자선 단체가 김밥 한 줄과 두유를 나눠줬습 니다. 알량한 자존심에 잠깐 망설이다
늦게 줄 섰더니, 바로 제 앞에서 음식 이 떨어지더군요. 주린 배를 쥐고 그 긴 밤을 또 지새울 생각을 하니, 잠깐
망설인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너무 서
럽고 막막한 찰나, 한 노숙인이 자신이 받은 김밥 반 줄을 나눠줬습니다.”
이때 기억으로 김 대표는 ‘바하밥집
에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밥을 준다’ 는 원칙을 세웠다. 햇반·컵라면 등을 늘 갖춰 놓고, 그마저 여의치 않을 땐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사서 제공한다.